정책 학습 기능 어떻게 계승할지 논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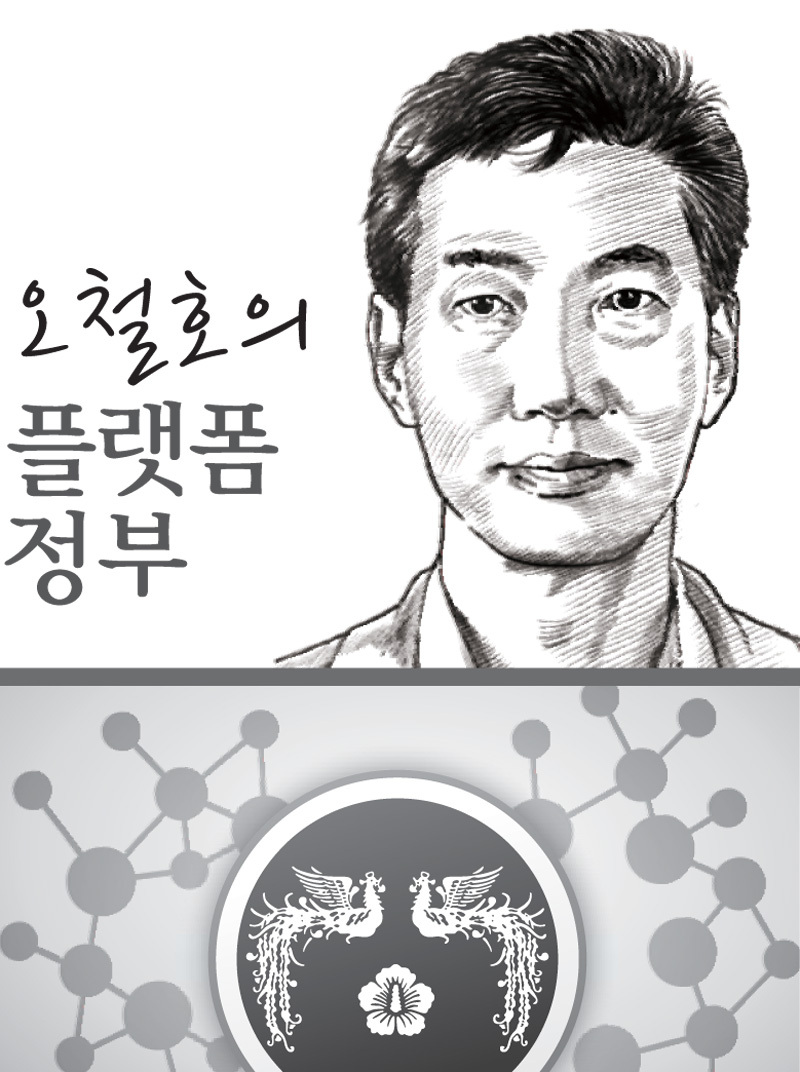
불현듯 노무현정부 시절, 대대적인 정부 혁신 드라이브를 걸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당시 전자정부의 본격 추진과 지방분권 강화가 시도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감사원이 정부 정책을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초기 논의는 순탄치 않았다. 체계적인 정책 평가의 법제화 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기존 평가 제도와의 차별성, 감사원의 정책 평가 역량 문제 등이 얽혀 생산적인 진전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2003년 정책감사라는 기능이 도입되면서 감사원은 굵직한 정부 정책을 평가·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최근 정책감사 폐지를 둘러싼 논의에서 표면적으로 제시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정치적 오남용 가능성, 다른 하나는 공무원의 적극적 행정에 방해가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었는지, 혹시 놓친 것은 없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 역시 빗나가기 마련이다.
정치적 오남용의 경우, 정책감사 제도 자체보다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더 본질적이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보다 정치적 고려와 판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이는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로 귀결된다. 정권 교체 후 전임 정부의 핵심 사업이 감사 대상이 되면서 그 결과가 의심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감사 대상과 방식이 정치적 고려에 좌우될 때, 정책감사는 정치 심판으로 변질되기 쉽고 그 중심에는 제도를 다른 의도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제도의 폐지와 함께 그 취지까지 사라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데 주목해야 한다. 정책감사의 목적, 즉 정책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 학습으로 연결하려는 기능을 어느 기관에서든 이어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차제에 국가 주요 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입안, 집행, 평가, 전 과정에 참여하여 점검하는 심층 평가를 도입한다면, 현행 지표 중심 평가와 달리 정책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질적 분석까지 수행할 수 있다. 한두 정책이라도 시범적으로 도입해 운영 경험을 축적한다면 사후적 평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 역시 단순히 정책감사라는 제도 탓으로 돌리기 어렵다. 책임 회피와 보신주의는 근대 관료제가 형성된 이후 대부분 국가가 경험한 관료제적 병리 현상이다. 다만 정책감사를 통해 전임 정부의 정책 참여자가 불이익을 겪게 된다면 복지부동이 더욱 굳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제도 폐지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근본적이지 않다. 상명하복과 수동적·폐쇄적 관료 문화를 그대로 둔 채, 개별 공무원에게 혁신과 적극적 행정을 기대하는 것은 희망 고문과 다름없다. 정책감사 제도의 축소·조정과 동시에 관료 조직 문화 전반을 혁신하고 정책 실패에서 학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도는 시대 변화에 따라 폐지와 진화가 반복된다. 정책감사 폐지는 단순히 하나의 제도를 없애는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판단으로 정책감사를 폐지하더라도 제도의 근본 취지는 살려야 한다. 정책 전 과정을 깊이 있게 파고드는 심층 평가와 같은 장치를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가치 있는 정책 정보로 활용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정책감사 폐지 논의가 단순히 폐지냐 존치냐의 눈에 보이는 이분법적 논쟁을 넘어서, 정책 학습 능력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계승·발전시킬 것인가라는 본질적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행정학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호류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4/128/20260114518582.jpg
)
![[세계타워] 견제와 균형이라는 이름의 공백](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9/128/20251119518380.jpg
)
![[세계포럼] 국방비 펑크와 무인기 ‘호들갑’](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0/128/20250910520139.jpg
)
![[오철호의플랫폼정부] 누가 사회를 지배하는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4/128/2026011451851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