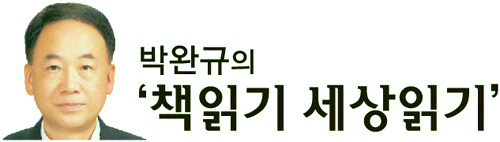
‘논어’ 양화(陽貨) 편에서 공자가 제자들에게 한 말이다. 시를 배우면 세상을 잘 살펴볼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사람을 감동시키고 모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어서 공자는 아들 백어에게 “너는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을 공부하였느냐? 사람으로서 주남과 소남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담벽을 마주하고 서 있는 것과 같다”고 했다. 주남과 소남은 ‘시경(詩經)’의 편명이다. ‘시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학업이 더 나아갈 수 없다고 엄중히 말한 것이다. ‘논어’ 위정(爲政)편에서는 공자가 “‘시경’에 있는 300편의 시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생각에 거짓됨이 없다(思無邪·사무사)’는 것”이라고 했다. 시를 배우면 순수한 감정이 일어나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 시를 공부하는 일이 학문의 첫 관문이 되는 것이다.
‘논어’ 자로(子路)편에는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시경’에 있는 시 300편을 외우더라도 정치를 맡겼을 때 잘 해내지 못하고, 사방의 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혼자서 대처하지 못한다면, 비록 많이 외운다고 하더라도 또한 무엇을 하겠는가?” 공자는 시야 말로 사람과 만물의 실정을 담고 있으므로, 시를 잘 알면 자연과 인간의 이치를 알 수 있다고 여겼다. 시를 무조건 외울 게 아니라, 시를 통해 세상과 만물의 이치를 깨우쳐 현실에 적용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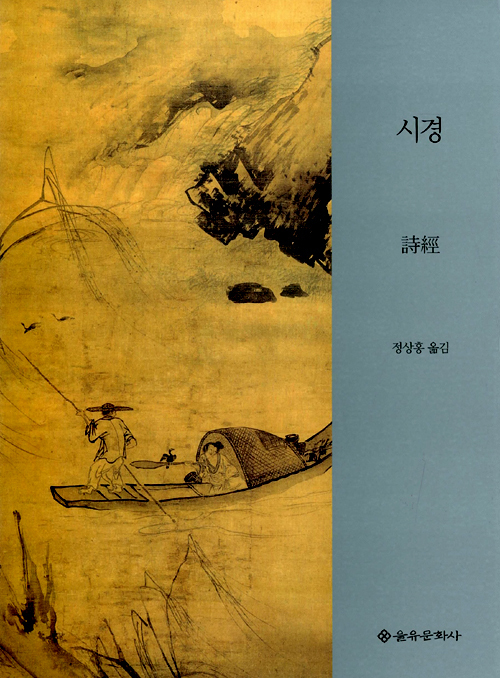
‘시경’은 2500∼3000여 년 전 중국 주나라와 춘추시대에 불리던 노래의 가사를 모아 엮은 것이다. 당시 조정은 지역마다 채시관(採詩官)을 파견해 거리에 나도는 노래를 모았다고 한다. 백성들 사이에 유행하는 노래를 알면 민심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마천은 ‘사기’의 ‘공자세가’에서 “옛날에는 ‘시’가 3000여 편이었으나 공자에 이르러 그 중복된 것을 추려내고 예의에 쓸 수 있는 것을 선택했다”며 “예와 악이 이로부터 회복되어 서술되었으며, 이로써 왕도가 갖추어지고 육예(六藝)가 완비됐다”고 했다. 공자에 의해 305편으로 간추려진 ‘시경’은 훗날 유학을 배우는 이들의 학업 필수과목으로 자리잡았다. 4서 3경의 하나다.
‘시경’ 305편은 풍(風)·아(雅)·송(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풍은 국풍(國風)이라고도 하는데 주남과 소남 등 여러 지역에서 채집된 민요다. 아는 궁중 의식에서 연주되던 곡에 붙인 가사다. 송은 제사를 지낼 때 신이나 조상을 송축하는 노래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이른 시기부터 ‘시경’은 지식인의 필독서였다. 신라의 청년들이 충성을 맹세하고 학업 정진을 약속한 내용을 새긴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에는 ‘상서’, ‘예기’ 등과 함께 ‘시경’을 익히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다. 오늘날 학계에서는 ‘시경’을 유교 문명에서 감성의 역사적 기원이자 문화적 상상력의 원천이라고 한다.
“나를 아는 자라면 내 마음의 근심을 말하겠지만, 나를 알지 못하는 자라면 날더러 왜 그러느냐고 말하리라. 아득한 저 푸른 하늘이여, 이것이 도대체 누구 탓이란 말인가.”
‘시경’에 왕풍(王風)으로 분류된 시 ‘서리(黍離, 기장이 고개 숙였네)’의 한 구절이다. 이민족의 침략으로 주나라 평왕이 도읍을 옮긴 뒤 부역하러 옛 도읍에 간 이가 폐허로 변한 종묘와 궁궐을 보고 참담한 심정을 노래했다. 나라를 걱정하는 시 가운데 최고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사랑에 관한 시도 많다.
“갈대가 푸르더니 흰 이슬이 서리 되었네. 저 사람은 물가 저쪽에 산다네. 거슬러올라가 만나려 하니 길은 험하고 멀기만 하네. 물결따라 내려가 보려고 하니 여전히 물 가운데 있는 듯 하네.”
진풍(秦風) 가운데 ‘겸가(蒹葭, 갈대)’라는 시의 첫 구절이다. 사랑하는 이에게 가까이 가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안타까움을 노래했다. 시인 허수경은 산문집 ‘그대는 할말을 어디에 두고 왔는가’에서 이 구절을 인용한 뒤에 이렇게 썼다. “어디를 가려고 길을 나섰던가. 어디 그 사무친 것이 있다고 믿었기에 길을 나서서는 오래 집으로 가지 않는가. 그리고 여전히 물 한가운데에 있는가.” ‘시경’은 지금도 시인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영감을 준다.
박완규 논설실장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전업자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1/128/20260111509892.jpg
)
![[특파원리포트] 21세기 ‘흑선’ 함대에 마주선 한·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1/128/20260111509858.jpg
)
![[박영준 칼럼] 美 국방전략 변화와 한·미 동맹 과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1/128/20260111509810.jpg
)
![[심호섭의전쟁이야기] 과감한 결단이 얻어낸 ‘전장의 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1/128/2026011150981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