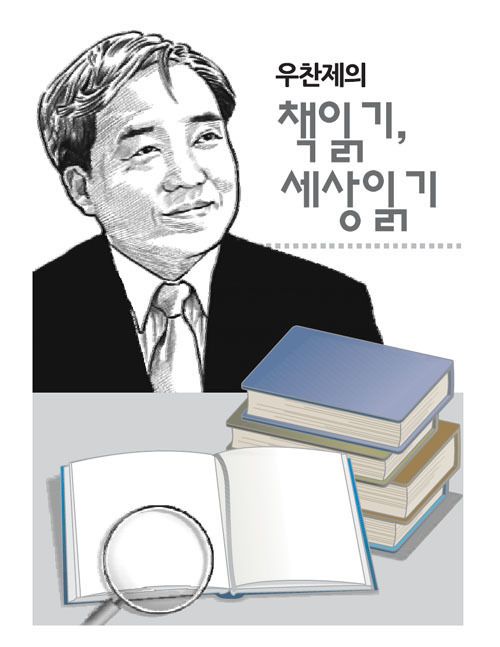
실낙원의 증후는 여러 스펙트럼을 형성하지만, 그중 ‘소리’들이 ‘소란’으로 변했다는 대목에 눈길이 오래 머문다. “말(언어)들은 그 광란의 무용을 다시 시작했다. 말들은 서로 얽히고 덧붙여지고 분할되고 하는 것이다.” 말은 인간의 정신을 넘어서고 정신은 말을 따라가지 못한다. 소란한 소리로부터 인간의 소외 양상은 깊은 그림자를 드리운다.
말은 “계속 이어지고 거대해지는데, 정신은 그만 십분의 일 초가 부족하여 정신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게 되어 버리고 이윽고 그 말은 수많은 불균형이 폭발한 후에 무(無)의 심연으로 빠져들어가 광란과 밤과 소리가 울려 퍼지는 야수 같은 선풍 속으로 곤두박질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층 더 은밀하고 더 굉장한 말들’은 존재의 리듬을 일그러뜨린다. 소리의 소란과 언어학대로 인해 주인공은 마침내 말을 잃게 된다. 실어증은 인간관계에 대한 작가의 부정적 인식을 극적으로 표상한다.
그 실어증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작가 김중혁은 그런 고민을 했던 작가 중 하나다. 가령 ‘엇박자 D’라는 소설도 그런 경우다. ‘엇박자 D’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아이가 있었다. 음치에 가까워 박자를 제대로 맞출 수 없었던 그 때문에 학창시절 합창공연은 엉망이 되고 만다. 그 사건으로 엄청난 상처를 지니게 된 인물이다. 무성영화 전문가로 성장한 그는 공연기획자인 ‘나’와 함께 무성영화와 음악을 리믹스한 공연을 한다. 공연의 끝에 그는 회심의 리믹스 작품을 관객들에게, 특히 학창시절 합창을 같이했던 옛 친구들에게 선사한다. “22명의 음치들이 부르는 20년 전 바로 그 노래”라고 ‘엇박자 D’가 말하고 있거니와, 한 사람의 소리가 둘, 셋, 넷, 다섯 사람의 소리로 바뀌면서 합창이 되는데, 합창이라고 하기에는 서로 음도 박자도 맞지 않지만 잘못 부르고 있다는 느낌도 들지 않는 그런 노래였다.
‘나’는 그 노래가 매우 아름답고 절묘하게 어우러졌다고 느낀다. “아마도 엇박자 D의 리믹스 덕분일 것이다. 22명의 노랫소리를 절묘하게 배치했다. 목소리가 겹치지만 절대 서로의 소리를 해치지 않았다. 노래를 망치지 않았다.” 각각의 소리가 어느 한 곳으로 귀속되거나 구속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른 소리를 해쳐 어설픈 혼돈의 도가니를 만들지도 않은 절묘한 상태가 아닐 수 없다. 치유는 그렇게 이뤄진다. 각각의 소리가 주인이면서 동시에 손님이었다. 서로 환대하고 호응하면서 새로운 융합의 생명을 길어올렸다.
안타깝게도 도처에서 실어증의 증후가 넘실댄다. 어처구니없는 ‘갑’질로 속수무책인 수많은 ‘을’들의 이야기가 낙엽처럼 뒹군다. 큰 목소리의 광란이 줄어들고, 실어증에 가깝게 말 못하던 이들이 제 목소리를 내며, 새로운 리믹스의 지평을 열 수 있을까. ‘따로-더불어’ 새로운 리듬을 리믹스해 나갈 수 있다면 상징적 실어증의 치유 가능성은 제법 높아지겠다.
우찬제 서강대 교수·문학비평가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트럼프와 파월의 악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3/128/20260113517780.jpg
)
![[데스크의 눈] 염치불고 시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3/128/20260113517775.jpg
)
![[오늘의 시선] 저성장 탈출구는 혁신에 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3/128/20260113517746.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돌 선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3/128/2026011351776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