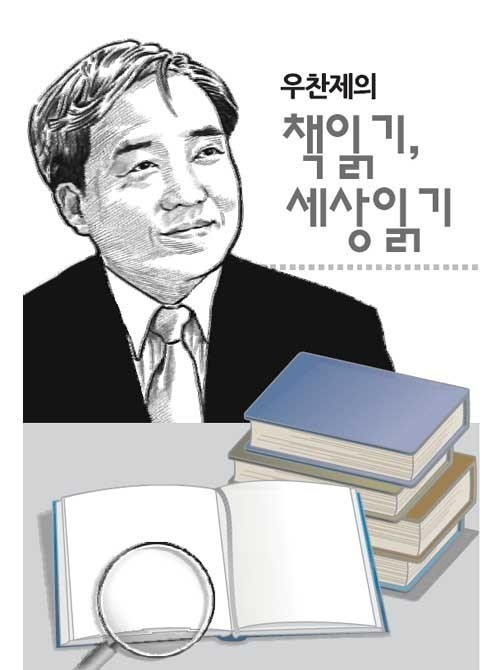
김이 땅을 파고 퇴근해 다음 날 출근하면 영락없이 메워져 있었다. 경악해 담당자인 박에게 전화하지만 연결되지 않는다. 대학 졸업 후 2년 동안 취준생으로 고생했던 윤은 야간 작업자로 땅을 메우는 일을 계속한다. 그도 담당자와 소통하려 하지만 불통된다. 이유도 모르는 채 파기와 메우기를 반복하는 이 악순환의 결말은 가혹하다. 퇴근하던 김이 술을 마시고 다시 복귀해 작업하던 윤을 삽으로 타살해 구덩이에 묻는다.
소설 ‘삽의 이력’(서유미 작) 이야기다. 소외된 노동과 소통 단절의 비극을 가정한 서사다. 만약 소통과 대화가 원활했더라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주지하듯 질문하고 대화하기를 즐겼던 소크라테스가 죽음에 이른 것도 대화와 소통의 단절과 관련된다. 30인 참주 정치와 소통하기 어려웠고, 배심원을 상대로 한 변론도 대화의 지평을 형성하기 곤란했다.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요청했지만 배심원이 귀를 닫음으로써 대화가 아닌 독백으로 머물 수밖에 없었다.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에서 존재의 의미를 확인한 이 중에 미하일 바흐친이 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삶은 본질적으로 대화적이다. “의식의 대화적 본성. 인간 삶 그 자체의 대화적 본성. 진정한 인간 삶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때 유일하게 적합한 형식이 있다면 그것은 끝없는 대화다. 삶은 본성상 대화적이다. 산다는 것은 대화에 참여한다는 것을 뜻한다. 질문을 던지고, 주의를 기울이고, 응답하고, 동의하는 등 개인은 전 생애에 걸쳐 대화에 참여한다. 눈, 입술, 손, 영혼, 정신을 사용하고 온몸으로 행하면서 그는 전 자아를 담론 속에 던져 넣고, 담론은 인간 삶의 대화적 짜임, 즉 세계 향연에 진입한다.”(도스토옙스키 ‘시학의 문제들’)
기성의 진리에 붙들린 독백주의를 넘어서기 위해 정신의 상호관계와 상호작용에 입각한 대화의 지평을 열어야 한다. 바흐친에 따르면, 언어도 진리도 상호 작용을 통해 살아난다. “진리는 개별 인간의 머릿속에서 잉태되지도 않고 발견될 수도 없다. 그것은 진리를 집단적으로 추구하는 사람 사이에서, 그들의 대화적 상호작용으로 과정 내에서 잉태된다.” 애초부터 홀로 완전할 수 없고, 타자의 차이를 인정하며 대화에 참여할 때 세계 향연에 동참할 수 있다.
대화로 세계 향연을 열 것인가, 독백화로 퇴행할 것인가, 요즘 한반도와 세계는 기로에 서 있다. 대화 성사와 중단, 재협상과 대화 재개 합의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인간의 대화적 본성을 새삼 절감한다. 대화 중단에 의한 세계 독백화를 우려하는 안타까움이나, 대화 재개로 인한 세계 향연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모두 그런 본성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크고 작은 현안이 독백을 넘어서 대화적으로 잘 풀릴 수 있기를 바란다.
우찬제 서강대 교수·문학비평가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호류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4/128/20260114518582.jpg
)
![[세계타워] 견제와 균형이라는 이름의 공백](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9/128/20251119518380.jpg
)
![[세계포럼] 국방비 펑크와 무인기 ‘호들갑’](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0/128/20250910520139.jpg
)
![[오철호의플랫폼정부] 누가 사회를 지배하는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4/128/2026011451851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