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부터 자극적인 ‘종말의 밥상’은 식탁과 식품 안전에 관해 천착해온 저자 박중곤 바른건강연구소장이 현대인의 건강을 해치는 밥상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담은 인문서다.
현대인의 밥상은 먹음직스러운 음식들로 넘쳐난다. 흰 쌀밥은 윤기가 자르르 흘러 맛깔나 보이고, 각종 빵은 다양한 색깔과 향미로 입맛을 자극한다. 기름에 노릇노릇 튀겨진 치킨과 색깔 화려한 피자, 햄버거, 떡 등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군침을 돌게 한다. 현대 식탁의 풍요는 인류 시작 이래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밥상의 먹거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롭고 화려해 보여도 실상은 고장 난 것들이 부지기수다. 농수산물 생산자와 가공업자들의 교묘한 위장술로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잘못된 밥상으로 갖가지 비전염성 질환에 노출돼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저자는 “현대의 아담과 이브들은 선악과나 다름없는 먹거리, 이른바 ‘혼돈의 밥상’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한다.
책은 구체적 실태를 제시한다. 요즘은 계절을 거슬러 생산한 농산물들이 마트의 진열대를 가득 메우고 있다. 딸기는 이전에는 6월은 돼야 맛볼 수 있었지만 발달한 비닐하우스 재배 기술 덕택에 12월부터 시장에 나오기 시작한다. 풋고추, 오이, 애호박, 토마토 등은 과거와 달리 사계절 내내 출하된다. 제철 농산물은 그 계절에 채취해 우리 생명을 기르고 건강을 도모하라고 대지가 밀어내 주는 것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인간이 신의 뜻을 외면하고 수확 시기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 결과 공산품 같은 농산품이 양산되는 시대가 됐다. 과일은 당도가 극도로 향상돼 설탕 덩어리나 다름없다. 의학계는 당도 높은 과일이 비만과 만성염증, 중성지방 등을 초래하고 이차적으로 각종 심뇌혈관질환과 당뇨병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식물 재배방법은 또 어떤가. 식물은 뿌리를 통해 흙의 자양분과 수분을 흡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하며 열매도 맺는다. 요즘 유행하는 양액재배는 과학농법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식물 성장의 근본 이치를 부정하는 특이한 농사법이다. 이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링거주사를 놓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하지만 상당수 양액재배 농산물들은 당도가 높아도 천연 미네랄 부족으로 맛이 떨어지고 수확 후 유통기한이 길지 못한 단점을 지닌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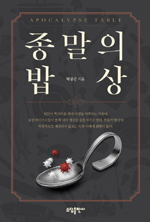
저자는 ‘생명 안테나’가 꺾인 동물들 실태도 파헤친다. 닭은 고기를 불리는 ‘육계’와 알을 낳는 ‘산란계’로 구분된다. 닭은 자연 상태에서 10년 이상 살지만 육계는 인간의 고기 불리는 프로그램에 따라 한 달 정도만 생존하다가 도축장으로 실려 간다. 산란계는 배합사료를 달걀로 전환시키는 효율적인 동물 기계다. 산란계가 낳은 무정란은 인장력이 약해 프라이할 때 노른자가 힘없이 퍼진다.
소 사육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수소가 거세당해 ‘내시 소’가 된다. ‘내시 소’는 더는 수컷 호르몬을 지니지 못하며 중성이나 암컷처럼 변한다. ‘내시 소’는 사료 먹고 배설하는 일만 되풀이하며 고기와 지방을 부풀리다가 팔려 나간다. 암소는 음양의 교묘한 합일 없이 인공수정으로 새끼를 배고, 새끼는 얼떨결에 세상에 나와 부모와 같은 비운의 길을 간다. 돼지는 주둥이로 땅을 파 미량 광물질 등을 흡수하는 굴토성(掘土性)을 지녔지만, 시멘트 바닥이나 철판 위에서 생활해야 해 그런 천성을 거부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상대의 꼬리나 유방을 물어뜯는다. 이렇게 되면 손해가 막심해지므로 주인은 새끼일 때 송곳니와 꼬리를 잘라 화근을 없앤다. 수컷돼지는 수소처럼 거세를 당한다. 돼지는 이런 과정을 거쳐 근육과 비계만 부풀리는 수상한 생명체로 살아가게 된다.
저자는 고장 난 밥상으로 생기는 비전염성 질환 발생 양상도 예사롭지 않다고 경고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통계를 토대로 잘못된 밥상으로 인해 암, 심혈관계질환, 당뇨병, 아토피 피부염 등의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현대인 건강의 시한폭탄이 돼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밖에도 식탁의 불편한 진실들은 무수히 많다. 화학적 식품첨가물, 트랜스지방, 육류와 물고기의 항생제, 농약, 염산, 환경호르몬 등이 소비자를 늘 불안케 하는 식탁의 복병임임을 경고한다.

책은 비판에 그치지 않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가 먹거리 안전을 위한 ‘질서의 밥상’이다. 생산비가 다소 더 들더라도 가능한 한 자연 친화적 방법으로 농축수산물을 생산하고, 이를 소비자가 제값 받고 사다 먹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얼굴 있는 농수산물’ 생산을 강조한다. ‘얼굴 있는 농수산물’이란 안전한 농수산 식품, 진실성이 담보된 먹거리를 말한다. 소비자가 건강한 밥상을 차리는 데 부족함이 없어 어디 내놔도 떳떳한 1차 상품을 의미한다. 이는 반자연적 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최대한 자연의 이치에 맞게 생산한 것이다. 생산자는 이름과 사진 등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농수산 식품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또 일상생활에서 면역에 효과적인 것을 찾아 먹는 것을 촉구한다. 이는 신체면역보험을 드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저자는 특히 국민의 안전한 밥상 실현을 위해 식품안전지수(Food Safety Index·FSI)를 개발해 실용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FSI는 글자 그대로 식품의 안전한 정도를 나타낸 지수이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 혹은 학교들끼리 서로 안전성 경쟁을 벌이도록 해 학교 급식 등 식탁의 안전성을 크게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한다.
박태해 선임기자 pth1228@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담배 소송](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5/128/20260115518642.jpg
)
![[기자가만난세상] 이 배는 여전히 테세우스 배입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5/128/20260115518568.jpg
)
![[세계와우리] 관세 너머의 리스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5/128/20260115518628.jpg
)
![[기후의 미래] 트럼프를 해석하는 우리의 자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5/128/20260115518573.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