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언창 천문硏 소백산천문대장 1977년 한 고교생은 저녁 무렵 머리 위에서 주황색으로 밝게 빛나는 천체(天體)에 온통 마음을 빼앗겼다. 천문학을 공부하겠다고 작정했던 소년은 당장 중학교 과학책의 별자리 그림을 뒤적였지만 어떤 천체인지 알 길이 없었다. 고교(대전고)에 입학해 지구과학 교사에게 물었지만, 천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선생도 고개를 저었다. 대신 과학실에 비치된 큰 성도(星圖)와 천체 망원경을 빌려줬다. 망원경에 잡힌 천체의 모습은 경이로웠고, 얼마 안 가 그 빛나는 행성이 목성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한국천문연구원 소백산천문대를 17년 동안 지켜온 성언창(54) 대장은 지난 5일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천체 관측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때의 열정과 감흥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 성언창 한국천문연구원 소백산천문대장이 1974년 당시 국내 최초로 도입된 지름 61㎝짜리 반사망원경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충북 단양 소백산 연화봉에 세워진 소백산천문대는 국내에서 현대 광학 천문학의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백산천문대 제공 |
성 대장이 소백산 ‘별밤지기’를 자처한 것은 이때부터다. 먼저 계약직으로 와 있던 대학 후배 경재만 박사와 의기투합해 1주간 맞교대로 밤샘 관측을 이어갔다. 성 대장은 “밤하늘이 맑은 날 국민 혈세로 사들인 망원경을 놀리는 일은 죄악이라는 생각에 관측에 매달렸다”며 “망원경이 고장나 관측할 수 없을 때는 죄스런 마음마저 들었을 정도”라고 당시를 회고했다. 맞교대 상대가 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20일 가까이 쉼없이 낮밤이 바뀐 채 ‘나홀로 관측’을 벌였고, 그런 끝에 그는 89년 소백산천문대에서 관측한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의 공동저자로 처음 등재됐다.
이때부터 쌓인 관측자료는 1990년대 들어 학계에 파급력이 큰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논문으로 이어졌고, 2000년대 들어 국내외 학술지를 대거 장식했다. 올해 6월 현재 천문대 자료를 활용한 석사는 32명, 박사는 5명에 이르고, SCI 논문은 64편, 비 SCI 및 연구논문집은 140편에 각각 달한다. 이 같은 실적에 힘입어 소백산천문대는 한국 근대 천문학의 ‘요람’으로 불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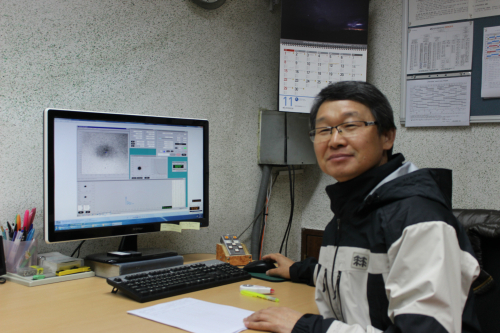
과학고 학생이 천문대를 찾아 관측하고 그 데이터를 처리해 논문으로 발표하는 실습을 가장 먼저 시작했는데, 처음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이제는 어엿한 대학원생으로 성장했다. 이후 교육 프로그램은 대학(원)생과 문화예술 인사, 아마추어 천문가와 초·중·고교생 등 일반 대중까지 대상을 넓혀가며 오늘날에 이르렀다. 성 대장은 “과학기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절반이 우주를 비롯한 천문학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처럼 천문학은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해 과학문화가 스며들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 소백산천문대가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담배 소송](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5/128/20260115518642.jpg
)
![[기자가만난세상] 이 배는 여전히 테세우스 배입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5/128/20260115518568.jpg
)
![[세계와우리] 관세 너머의 리스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5/128/20260115518628.jpg
)
![[기후의 미래] 트럼프를 해석하는 우리의 자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5/128/20260115518573.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