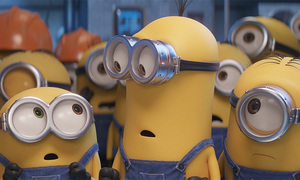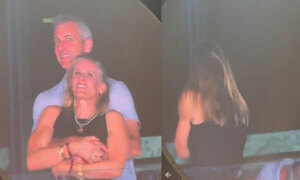한옥 모양 철근콘크리트 건물
창의성 유독 요구되는 시대에
한국 문화 담겼다고 할 수 있나
정부가 바뀌니 청와대가 다시 본래의 역할을 되찾을 모양이다.
지난 정부가 느닷없이 옮겨간 용산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머물기에는 역사적이나 문화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다. 또한 주변에 미군 부대가 있고 여러 민간 시설물과 가까워 그 위치가 보안상 대단히 취약한 곳이다. 대통령이 있는 곳은 보안이 매우 중요한데 거리가 가까우면 도청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예나 지금이나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거처하는 곳은 안전해야 하며 대내외적으로 보기에 민망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내세울 만한 상징적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끊임없이 우리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만나는 공간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곳일 수밖에 없다.
보안을 떠올리면, 청와대는 서울에서 천혜의 장소에 자리 잡고 있다. 서울에서 청와대만큼 주변과 자연스럽게 차단된 곳은 없다. 청와대 뒤는 북악산이 버티고 있고 앞은 경복궁이 넓게 자리하고 있다. 청와대 양옆도 상당한 거리를 두고 주택가가 형성되어 청와대를 내려다볼 만한 높은 건물이 없다.
대통령이 일을 보며 외국 정상을 만나는 곳이라면 우리나라를 대표할 역사적 깊이와 문화적 상징성이 있어야 한다. 영국을 비롯해 왕이 있는 유럽 여러 나라와 일본의 궁궐은 물론이고 미국의 백악관, 프랑스의 엘리제궁, 러시아의 크레믈궁 등 각국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는 대부분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건축물이다. 역사적 깊이로 따지면 청와대는 일찍이 고려 숙종 때 고려의 남경(南京)으로 이궁(離宮·유사시에 사용하는 궁궐) 터였으며 조선에 와서는 경복궁의 후원이었으니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녔다. 2022년 ‘한국건축역사학회’가 수행한 ‘청와대 권역 기초조사 연구’에 따르면, 이곳에서 조선은 물론 고려 시대의 기와와 토기 등이 다수 발견되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하나 아쉬운 것은 청와대를 구성하는 건축물이다. 청와대에 있는 건축물을 살펴보면 1990∼1991년 완공된 대통령 관저와 업무 공간인 본관을 비롯해 외빈 접견을 위한 상춘재, 언론인을 위한 춘추관, 대통령이 참석하는 공연이나 만찬을 위해 1978년 세워진 영빈관, 청와대 직원 사무실이 등이 있다. 전통 목구조를 가진 상춘재를 제외하면, 관저, 본관, 영빈관, 춘추관 등 대부분의 건축물은 한옥 모양을 한 철근콘크리트 건물이다.
본관은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설명에 의하면, “…이 건물은 1989년 22명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한 뒤 1991년 9월4일 신축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국가를 대표하는 우리의 얼굴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전통 목구조와 궁궐 건축양식을 기본으로 하여 내부 구조는 현대적인 감각과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현재 청와대를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마련한 영빈관 안내문에는 “… 견고한 돌기둥이 건물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웅장한 건물로서, 기둥의 원석은 국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익산시 황동면에서 채석한 암석입니다. 특히 전면에 있는 이음새 없는 4개의 돌기둥은 하나의 돌로 만들어졌으며 1개의 중량이 60t에 달하고 높이 13m에 둘레가 3m에 이릅니다. 또한 건물의 내부 벽에는 무궁화, 월계수, 태극 문양을 형상화한 전통 디자인으로 형상화하여 전통적인 디자인으로 장식되었습니다. …”
안내문 어디에도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가에 대한 말은 없다. 본관의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궁궐 지붕 모양을 본떴다는 것을, 영빈관의 경우 기둥의 규모와 재료, 내부 벽 문양에 대한 극히 지엽적인 사실만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성한 안내문이 맞나 싶다. 청와대에 있는 대부분의 건축물이 1970년대 후반 이후에 지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시대의 건축물로서 과연 대한민국에서 내세울 만한 것인지 의문이다. 한옥 지붕을 흉내 낸 지붕을 얹은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이 20세기 후반 이후 대한민국 문화와 정신을 담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창의성이 요구되는 시대다. 앞선 시대나 남의 것을 적당히 흉내 내서는 감동을 줄 수 없다.
사실 현재 청와대에 있는 대부분의 건축물은 1930년대 이후 일본에서 의도적으로 유행시킨, 이른바 ‘제관양식(帝冠樣式·데이칸요시키)’과 맥을 같이 한다. 관공서, 박물관, 도서관, 우체국 등 공공건물 중심으로 확산한 제관양식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돌을 붙이고 신사, 절, 성 등 일본 전통 건축의 지붕을 덧붙인 형태로 제국주의 팽창에 몰입한 일본의 권위와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상징물이었다. 제관양식은 조선총독부 청사, 옛 서울역 역사, 경성제국대학 본관, 동양척식회사 본관 등 일제강점기 서울에서도 많이 지어졌다. 일제는 제관양식 건축물을 조선과 만주에 건설해 식민지 지배의 상징으로 활용했다. 그런데 청와대 건축물 대다수가 제관양식의 아류이니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1989년 당시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을 22명이나 되는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단 말인가.
건축은 단순히 물리적인 건물에 머무르지 않는다. 특히 한 나라의 대통령이 사용하는 건축물은 그 나라의 모든 것을 함축하는 얼굴이다. 국제적으로 K컬처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지금, 한국 건축가가 설계한 이 시대의 건축물이 청와대에 세워지고 그 건축물이 세계인의 입에 오르내릴 때도 되지 않았는가.
최종덕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주고엔고짓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24/128/20250724519863.jpg
)
![[기자가만난세상] 인터넷 예약과 키오스크 주문 시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11/23/128/20201123522014.jpg
)
![[삶과문화] 그해 여름 우리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24/128/20250724519568.jpg
)
![[박일호의미술여행] 생각의 차이가 만든 큰 변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24/128/2025072451953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