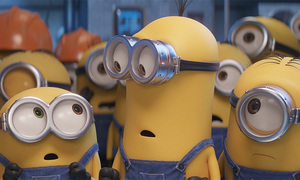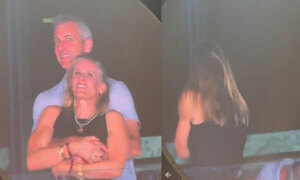“땡 하고 들어갔는데도 대기인원이 2000명이 넘는다니까….”
인기 공연이나 관심 많은 스포츠 경기 티켓을 인터넷으로 예매해 본 사람이라면 이런 반응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요즘 웬만한 문화생활은 인터넷 예매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인기와 관심 많은 프로그램은 예매 시작 몇 초 만에 매진되기 일쑤다.

표면적으로는 인터넷 예매 시스템이 공정해 보인다. 누구나 어디서든 예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표를 구입하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예매를 원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 티켓팅(예매)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초고속 인터넷과 고성능 기기, 빠른 손놀림은 물론 수차례 티켓팅에 실패하면서 얻은 비법을 장착해야 예매 성공 확률이 높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누구나 예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 예매에 성공하는 사람은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당장 ‘누구나’라는 전제 앞에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이 생략돼 있다. 그래서 누구는 매번 성공하지만 누구는 예매 시도조차 포기한다. 온라인 예매가 공정하다는 인식은 예매 성공 조건을 갖춘 사람들의 시선일 수 있다. ‘성공한 자’와 ‘탈락한 자’의 간극은 점점 커지고 있다. 예매 성공은 아무래도 젊은 세대에 집중된다. 노년층이나 모바일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들은 참여 자체가 어렵다. ‘공정한 시스템’이지만 접근 자체가 제한적인 셈이다.
이 문제는 단지 티켓팅에만 국한되는 것 같지는 않다. 요즘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영화관, 병원, 심지어 무인 주차장까지도 키오스크가 대세다. 하지만 키오스크 앞에 서면 누구나 ‘자유롭게’ 주문할 수 있을까. 특히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키오스크만 보면 지레 겁을 먹는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중 53.6%가 키오스크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비단 이들뿐 아니라 “기계 앞에만 서면 땀이 난다”는 사람이 꽤 많다. 뒤에 사람들이 줄 서 있으면 마음이 조급해져 그냥 익숙한 메뉴만 선택한 적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디지털화는 인건비 절감, 오류 감소,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장점이 많다. 하지만 그 효율성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디지털 소외 계층을 만들어내고 있다. ‘공정한 시스템’이라는 말은 좋지만 그 시스템을 수월하게 활용할 수 없게 하는 문턱이 존재한다. 무인 시스템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사람에게 직접 말하는 게 더 편하다”는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 “불편하면 알아서 적응하라”는 사회 분위기 역시 그들을 더욱 고립시키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디지털화가 정말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누군가에겐 쉽고 빠른 것이 누군가에겐 높은 벽이 된다면 그 시스템은 다시 점검받아야 한다. 진짜 공정한 사회란 모두 같은 속도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속도를 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사회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주고엔고짓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24/128/20250724519863.jpg
)
![[기자가만난세상] 인터넷 예약과 키오스크 주문 시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11/23/128/20201123522014.jpg
)
![[삶과문화] 그해 여름 우리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24/128/20250724519568.jpg
)
![[박일호의미술여행] 생각의 차이가 만든 큰 변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24/128/2025072451953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