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 거짓말/ 문관식/ 헤르몬하우스/ 1만7000원
“이렇게 해도 어차피 다 재활용 안 된다던데.” 언젠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한참 페트병, 캔 등을 골라내고 있을 때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들고 있던 박스 안에서 아내로 보이는 여성이 유리병을 꺼내 마대자루에 집어넣고 있었다. 별다른 대꾸 없이 쓰레기를 뒤적거리기만 하는 걸 보니 남자의 말을 그저 밤늦게 끌려 나온 데 대한 넋두리 정도로 여기는 듯했다.
우리나라는 분리배출에서 모범 국가로 꼽힌다. 그 반발인지 최근 ‘분리배출 무용론’도 일상에 광범하게 퍼진 모습이다. 한밤 분리수거장에서 새어 나온 남자의 말도 비록 진지하진 않더라도 그 무용론의 일단이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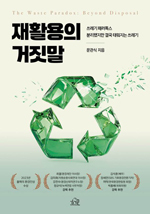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보좌관으로 재직하며 환경 분야 정책 설계와 법률 개정에 참여해 온 저자는 분리배출 무용론의 ‘거름’이 된 우리네 자원순환의 실태를 들여다본다. 온 국민이 분리배출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도 재활용되지 않고 태워지는 현실을 짚는데, 특히 자원순환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법과 제도 내 모순을 드러내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예를 들어 자원순환 관련 현행법인 순환경제사회법은 이름 그대로 ‘원료·제품 전 주기에 걸친 자원순환’을 지향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그 하위법 성격인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단 걸 지적한다. 쉽게 말해 하나는 ‘오래 쓰기’, 다른 하나는 ‘빨리 버리기’를 독려하는 꼴이란 것이다. 저자는 “제도가 하나의 흐름을 설계하지 못한 채, 각각의 목표만을 향해 따로 움직인다”고 평한다.
책을 읽고 나면 분리배출 무용론 ‘너머’를 잠깐 상상해볼 수 있을 듯하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 쓰레기를 재질별로 분리하는 우리네 모습을, 저자는 ‘성실함으로 만든, 잘 버리는 사회’라 이름 붙이고 있다. 여기서 수거∼선별∼처리∼재생산까지 이어나가야 제대로 된 순환사회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제도·정책 개선과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잘 이어지는 사회’로 옮겨갈 차례란 게 저자의 제언이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외교협회장의 작심 비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0/128/20251020518405.jpg
)
![[주춘렬 칼럼] 위기와 기회가 상존하는 중국 몽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0/128/20251020518406.jpg
)
![[기자가만난세상]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0/128/20251020517908.jpg
)
![[조홍식의세계속으로] 伊 멜로니는 유럽 극우의 미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0/128/2025102051783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