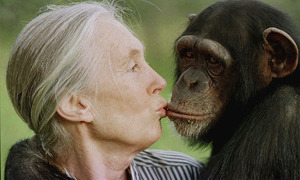한국의 청소년(만 13~18세) 중 “우울할 때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3.7%까지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10명 중 8명 정도만 힘든 시기에 의지할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 대비 이야기 상대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4.5%포인트 낮았다. 친구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건 스마트폰이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률은 41%대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중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9년 90.1%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 84.2%, 2023년 83.7%를 감소 추세다. 성별로 보면 이야기할 상대가 있는 여자 청소년은 86.0%로 남자 청소년(81.5%)보다 4.5%포인트 높았다.
이야기 상대가 있는 사람들 중 평균 이야기 상대 인원도 줄고 있다. 이야기 상대의 평균 인원은 2013년 4.6명에서 2019년 4.4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 4.0명으로 감소한 이후 2023년에는 3.8명을 나타내며 최저치를 기록했다. 청소년들이 힘든 순간에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건강한 또래관계가 점차 약해지고 있는 셈이다. 국가통계연구원은 “청소년 시기의 또래관계는 단순히 놀이를 위한 관계라기보다는 다양한 활동과 생각을 공유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연령으로 청소년이 정서적으로 힘들 때 주변에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친구관계 만족도(만 9~18세)도 줄고 있다. 2023년 기준 아동·청소년의 친구관계 만족도는 10점 중 7.68점으로 나타나 2020년 7.89점 대비 감소했다. 특히 만 9~12세 친구관계 만족도는 7.82점이었던 반면 청소년(만 13~18세)의 친구관계 만족도는 7.5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청소년들에게 ‘친구’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건 스마트폰이었다. 청소년 10명 중 4명 정도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됐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스마트폰이 다른 활동보다 과도하게 중요해지고,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문제가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률은 2019년 29.4%에 그쳤지만 2020년 35.0%, 2021년 36.4%로 높아지다 2022년 40.0%를 찍었다. 이후 2023년 36.0%로 낮아졌지만 2024년 41.4%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학생의 경우 2022년 44.5%를 정점을 찍은 이후 2023년 42.1%, 2024년 41.7%로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일반 이용자 대비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보면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으로 우울하다’고 답한 비율은 일반사용자군은 2.9%에 그쳤지만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27.2%에 달했고,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으로 불안하다’는 응답자도 일반사용자군(2.4%) 대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29.4%)이 월등히 높았다.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이용 시간 증가는 사이버폭력 경험률도 증가시켰다. 인터넷 이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인 학생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률은 약 20%인 반면 5시간 이상 이용하는 학생의 피해율은 43%로 2배가 넘었다.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도 이용시간이 늘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기준 1시간 미만 이용군은 가해 경험이 약 12%인 반면 5시간 이용군은 29%에 달했다. 국가통계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는 단순히 디지털 미디어 이용 시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디지털 환경에 더 오래 노출될수록 상호작용 경험이 누적되고, 그 과정에서 사이버폭력을 접하거나 가해에 연루될 가능성 또한 자연스럽게 증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노벨상 강국 일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9/128/20251009511774.jpg
)
![[기자가만난세상] 숙의 민주주의도 곳간서 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4/128/20250814518001.jpg
)
![[삶과문화] 가득 찬 컵에서 흘러내린 물로 베풀어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9/128/20251009511351.jpg
)
![K드라마가 흔든 ‘엄마’ [이지영의K컬처여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9/128/202510095082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