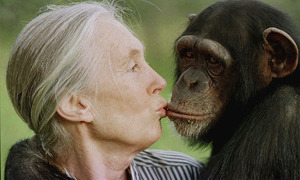“바다의 지도가 바뀐다”…살오징어는 서해로, 명태는 사라졌다
기후 변화가 한반도 바다의 어종 지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수온 상승과 조업 환경 변화가 맞물리면서 불과 수십년 사이 동해의 주력 어종이던 명태와 임연수어는 자취를 감췄다. 살오징어는 동해에서 서해로 이동했다.

방어·삼치 같은 난류성 어종은 점점 북상하며 새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단순한 어획량 변화가 아닌 우리 해양 산업과 식탁 풍경, 더 나아가 식량 안보까지 흔들 수 있는 거대한 전환이다.
◆동해의 주인 바뀐 살오징어…북상하는 난류성 어종, 사라진 명태
24일 수산업계에 따르면 동해에서 잡히는 살오징어는 2000년대 연평균 10만8504t에 달했지만 2010년대 6만531t, 2020년대 들어서는 1만6735t으로 급감했다.
1990년대까지 서해권에서 거의 잡히지 않던 살오징어는 2000년대 5381t, 2020년대 4470t을 기록하며 주요 어종 상위권에 올랐다.
방어·삼치·전갱이 같은 난류성 어종도 북상하고 있다. 2000년대까지 동해권역에서 주요 어종이 아니던 방어는 2010년대 연평균 4118t 잡히며 7위에 올랐고, 2020년대에는 8479t으로 5위까지 상승했다.
동해의 상징이던 명태는 1980년대 연평균 7만6299t을 기록하며 어획량 1위였으나, 1990년대 1만t 수준으로 줄더니 이제 국내에서 거의 잡히지 않는다. 임연수어 역시 1980년대 3418t에서 현재는 사실상 ‘0’이다.
동해의 어종 지도가 통째로 뒤바뀌고 있는 셈이다.
◆어민 생계, 산업 구조도 ‘흔들’…“기후 위기, 바다와 식탁을 흔들다”
어종의 변화는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된다.
서해 어민들은 전통적으로 참조기를 주로 잡았지만, 손이 많이 가는 참조기보다 가격이 높고 잡기 쉬운 살오징어로 조업을 전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민들의 빠른 적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특정 어종 쏠림 현상으로 인한 남획 위험을 경고한다. 아울러 어류 분포 이동을 기후 변화의 직접적 증거로 해석한다.

수산업계 한 관계자는 “기후 변화로 인한 해양 수온 상승은 어류의 서식지 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오징어와 같은 종은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서해로의 이동은 생존 전략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최근 40년간의 어종 분포 북상과 서진 현상은 단순한 생태 변화가 아니다”라며 “우리 해양산업과 식량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살오징어 이동과 명태 소멸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바다 생태계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
전문가들은 △실시간 자원 모니터링 강화 △어업 지도체계 개편 △남획 방지와 자원 관리 △새로운 어종에 맞춘 어업 기술 및 유통 구조 혁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해류는 여전히 흐르지만, 그 위를 유영하는 생명들은 더 이상 같은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 수온이 올라가자 바다는 침묵 없이 움직였다.
어종의 지도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다시 그려지고 있다. 기후 변화는 이제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다가 달라지면, 우리의 삶도 바뀐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주한 美 7공군 사령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2/128/20251002516817.jpg
)
![[기자가만난세상] 슬기로운 명절 에티켓](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2/128/20251002516599.jpg
)
![[세계와우리] 경주 에이펙과 실용외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2/128/20251002516808.jpg
)
![[조경란의얇은소설] 달을 보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2/128/202510025165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