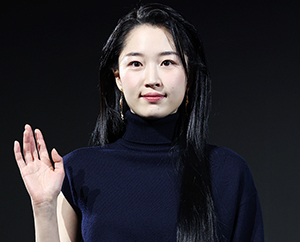“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선덕여왕 시절쯤부터 중천을 떠돌던 내가/ 어느 날 발 크고 소리 잘하던 정선 사람/ 내 어머니 자궁에 전광석화처럼 뛰어들어/ 늙은 시인이 될 줄은 몰랐어/ 그래도 그게 어디냐/ 벌레도 아니고 마소도 아니고/ 그것도 노래하는 사람이라니,”(「끝과 시작」 부문)
자연주의적 세계관과 리얼리즘 정신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시세계를 구축해온 이상국 시인이 「끝과 시작」처럼 자전적 내용과 전통적 서정을 담은 신작 시집 『저물어도 돌아갈 줄 모르는 사람』(창비)을 상재했다. 정갈한 언어로 부드러운 서정을 그린 『달은 아직 그 달이다』 이후 5년 만에 여덟 번째 시집이다.
1976년 등단한 시력(詩歷) 46년의 시인은 이번 시집에 삶의 근원을 되새기는 시적 성찰과 불교적 사유가 융숭 깊은 자전적 시편을 다수 담았다. 어느 가을 밤 논의 물꼬에 쭈그리고 앉아 논물을 바라보던 아버지, 그 모습이 무심해서 오히려 더 그립다.
“벼가 패면 가을이 오고/ 가을에는 가난한 아버지가 온다// 논밭이 없는 사람들도/ 가을이 오는 걸 뭐라 하지는 않는다.// 가을은 사심이 없다// 공터에 버려진 거울에도/ 하늘이 얼굴을 비춰보듯/ 가을이 오면// 물꼬에 쭈그리고 앉아 밤을 새우던 아버지도/ 조용히 논물에 얼굴을 비춰보았다.”(「논물」 전문)
오래 전 형과 함께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조카를 어느 솔밭에 묻고 온 서늘한 기억을 오랫동안 가슴 한켠에 담고 있다가 무정하게 꺼내 보이기도 한다.
“아주 오래전 일이다.//세상에 온 지 얼마 안 돼 숨을 놓은 조카를// 형님이 안고 나는 삽을 들고 따라갔다.// 아직 이름도 얻지 못한 그 애를 새벽 솔밭에 묻고// 여우들이 못 덤비게 돌멩이를 얹어놓고 온 적이 있었다.// 내가 사람으로 살며 한 일 중// 가장 안 잊히는 일이다.”(「오래된 일」 전문)
자신의 등과 제사 때 절하는 아버지 모습을 잔잔하게 대비하는 등 시인이 보여주는 나나 우리네 모습은 마치 단아한 한 폭의 수묵담채화를 보는 듯하다. 이는 독자에 친절하고 친근한 것으로, 시의 본향을 지향하는 시인의 정신일 것이다.
“나는 나의 뒷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그래도 거기까지가 나의 밖이다.// 나의 등에는 은유가 없다.// 손으로 악수를 꺼낸다든가// 안면을 집어넣거나 하는 그늘이나// 은신처도 없지만// 나의 등은 나의 오래된 배후다.// 제삿날 저하는 아버지처럼// 구부정하고 쓸쓸한 힘이다.”(「배후에 대하여」 전문)

그렇다고 마냥 내면의 기억이나 자연친화적인 세계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부조리한 현실에는 과감하게 펜을 들었고, 비루한 삶에는 따뜻한 시선을 보낸다. “비부들이 판을 치”(「동갑의 노래」)는 살풍경을 꼬집고, 제 잇속만 챙기는 “장사꾼들 세상”(「복날 생각 혹은 다리 밑」)을 조롱하며, “길은 사람을 기다”(「동해북부선」)린다며 남북 철도연결을 소망한다. 오늘도 산업재해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우리 현실을 규탄하는 다음 대목은 또 어떤가.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죽은 노동자의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이 평균 450만원이라고 한다. 영국은 최소액이 약 8억 원으로 한국 노동자 177명이 죽어야 나오는 액수이다. 2010년 미 연방교통국이 산정한 시민 1명의 가치는 약 610만 달러라고 한다.//우리나라에서는 매일 일곱 명 정도가 산업재해로 죽는다고 한다./ 떨어져 죽고 깔려 죽고 불타 죽고 끼여 죽고 치여 죽고 부딪혀 죽고 터져 죽는다고 한다.”(「...라고 한다」 전문)
시인 안도현은 추천사에서 “그의 화폭을 들여다보면 기승전결이 단정한 선비의 한시를 읽는 것 같다”며 “때로는 간결한 정신주의자의 면모가 엿보인다”고 평했다.
1946년 양양에서 태어난 이상국은 1976년 『심상』에 시 「겨울 추상화」 등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동해별곡』, 『내일로 가는 소』, 『우리는 읍으로 간다』, 『집은 아직 따뜻하다』, 『어느 농사꾼의 별에서』, 『뿔을 적시며』 등이 있다. 백석문학상, 정지용문학상, 박재삼문학상 등을 받았다.
요즘 코로나19로 “거의 자가격리 수준의 생활을 보내고 있다”는 시인은 ‘시인의 말’에서 “어쩌다보니 생이 바람 든 무처럼 허술해지고 가까스로 시만 남았다”며 “그래도 아직 가보지 못한 미지의 나라가 있고 그곳에서 나를 만나려고 줄을 서 기다리고 있는 말들을 생각하면 웃음이 난다”고 고백했다. 그의 말처럼, 그는 오늘도 미소를 머금고 미시령 동쪽 속초 바닷가의 ‘시공방’에서 티브이를 보거나 시의 세계를 참구하고 있을 지도.
“오, 생 하나가 고작 이런 것뿐이라니,/ 그렇다고 그런 나를 어떻게 피해 가겠어/ 미시령 동쪽 바닷가에 이층 방 한 칸 세놓고/ 늙어가는 아내와 티브이 드라마를 볼 줄은 몰랐어/ 나도 내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 그래도 실없는 나의 노래가/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줄 어떻게 알았겠어”(「끝과 시작」 부문)
김용출 선임기자 kimgija@segye.com 사진=창비 제공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치매 머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5/128/20251215517423.JPG
)
![[주춘렬 칼럼] ‘AI 3대·반도체 2대 강국’의 현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0/128/20251020518406.jpg
)
![‘주사 이모’가 사람 잡아요 [서아람의 변호사 외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3/128/20251103514866.jpg
)
![[박소란의시읽는마음] 어제와 비에 대한 인터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5/128/202512155174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