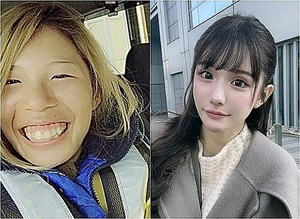중상해 여부 가릴 전문시스템 마련 급선무
검찰이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중상해 판정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다수 운전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단 한 차례 교통사고로 기소돼 ‘전과자’가 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아 보인다. 다만 형사처벌을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부 ‘악성’ 피해자에겐 운전자 스스로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불구’는 신체 일부의 상실이나 중대한 변형, 시각·청각·언어·생식 등 중요 기능의 영구적 상실로 파악했다. ‘불치나 난치의 질병’은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으로 구체화됐다.
이 경우에도 무조건 처벌받는 건 아니다. 치료기간과 의학 전문가 의견,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규정된 노동력 상실률, 사회통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결국 중상해 판단은 검사 몫이지만, 아무래도 의사 진단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상해 진단은 병·의원이나 담당의사에 따라 차이가 크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이 중상해 여부를 가릴 게 아니라 공신력 있는 별도의 판단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탁제 적절히 활용해야”=검찰은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혔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만 이뤄지면 기소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탁제 적절히 활용해야”=검찰은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혔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만 이뤄지면 기소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만약 중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빌미로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면 운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조계에선 “공탁제도를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고 해서 피해자와 합의된 것으로 인정되진 않지만,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재판에서 양형의 참작사유가 된다.
공탁은 꼭 기소 이후만 하는 건 아니다. 수사 도중에도 가능하다. 박균택 대검 형사1과장은 “다양한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일반 운전자들이 너무 민감해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의협 회장 탄핵 위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0/31/128/20241031521267.jpg
)
![[기자가만난세상] 美 애틀랜타 교포가 기 펴는 이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0/31/128/20241031521213.jpg
)
![[세계와우리] 北의 우크라戰 참전, 방관할 수 없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0/31/128/20241031521263.jpg
)
![[조경란의얇은소설] 이게 다는 아닐 거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0/31/128/2024103152122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