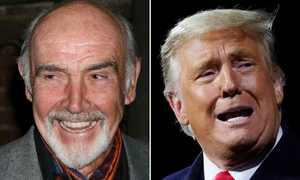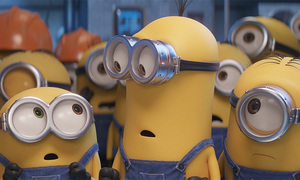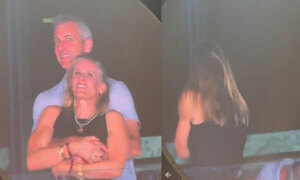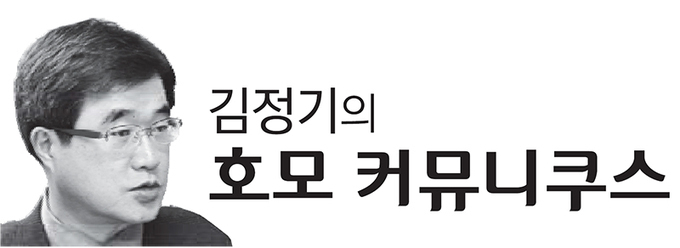
네 살 손자가 찡그린 표정으로 눈물을 머금은 채 무언가를 요구하며 떼를 쓴다. 아들 내외가 보내준 동영상에 나타난 모습이다. 누구의 아이를 막론하고 어린아이들의 행위는 귀엽다. 불만의 눈물마저 빛난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물리적·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타인과의 거리 영역은 상대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린아이는 예외다. 어린아이가 가까이 접근해 오고 또 신체를 터치(0cm)하거나 잡아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거나 경계하지 않는다. 문화나 공동체의 이질적인 관습에서도 마찬가지다.
눈물은 사연을 안고 있다. 지난 7월 1일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가 문을 닫는 날 직원들이 짐을 정리한 박스를 들고 워싱턴의 사무실을 나오며 흘리는 눈물도 그렇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퍼스트’ 방침에 따라 세계 각지의 가난한 이들을 돕는 대외원조사업을 담당해 온 프로그램의 83%가 중단되는 날이었다. 1961년 존 F 케네디 정부 때 설립되어 64년 동안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던 미국의 인도주의를 대변했다. 식수, 음식, 영양식, 의약품을 지원하고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등 질병의 확산을 막고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차관 등 많은 활동을 벌여왔다.
눈물은 커뮤니케이션학으로 설명하면 비언어 행위이다. 말이나 글과 같은 문자언어로 표현하는 언어 행위와 구별되는 행위이다. 언어 행위가 사람의 이성적인 차원의 의도를 전달하는 데 적합하다면, 비언어 행위는 인간의 감정적 차원을 표현하는 데 적합하다.
조선의 실학자 연암 박지원은 1780년 청나라 건륭 황제의 70회 생일을 축하하는 사절단에 끼어 압록강을 건너서 가다가 마주한 지평선만 있는 광활한 요동 벌판을 보고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호곡장’(好哭場)이라고 했다(박지원 지음, 김혈조 옮김, ‘열하일기’). “천지간에 시야가 툭 터진” 답답함이 사라지고 무한히 시원하게 펼쳐진 광야에서 웬 울음이냐는 질문에 연암은 이리 답변했다. 눈물은 슬플 때만 흘리는 게 아니다. 인간의 칠정(七情)인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喜怒哀樂愛惡慾)이 극에 달하면 모두 울음을 자아낸다.
이탈리아 북부 ‘돌로미티’, 제주도 면적의 약 75% 크기로 3000m 이상 봉우리 18개와 40여 개의 빙하로 이루어진 곳에서 연암의 심정이 되었다. 땅 위에 솟아있는 산이 자아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풍광과 매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 곳. 높디높은 돌산과 초원의 존재는 수천만 년 전에 바다에서 솟아 올라와 풍화작용을 거치며 명작이 되었다. 실타래에서 마구 풀린 실처럼 수없는 트레킹 길과 탁 트인 초록빛 산림을 아내와 걷고 보면서 울컥하는 눈물 때문에 애를 먹었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언론학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가짜 구급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27/128/20250727509461.jpg
)
![[특파원리포트] 과거와 화해 시작한 노근리 유족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27/128/20250727509453.jpg
)
![[이삼식칼럼] 인구주의와 인구적응주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27/128/20250727509435.jpg
)
![[김정기의호모커뮤니쿠스] 울기 좋은 곳](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27/128/2025072750944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