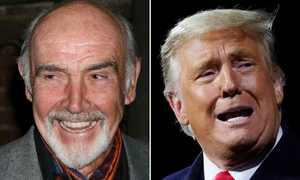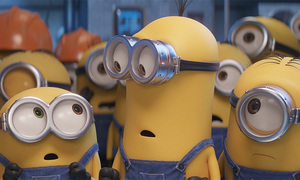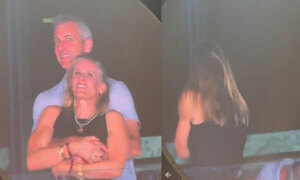기하학적 추상과 다른 방향의 추상미술은 바실리 칸딘스키에 의해서 시작됐다. 러시아 출신의 칸딘스키는 모스크바에서 본 인상주의 전시에 감명받고, 법학 교수직까지 버리면서 뮌헨으로 가 그림 작업을 시작했다. 청기사파라는 표현주의적 추상 운동을 이끌었고, 바우하우스의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다. 나치에 의해서 바우하우스가 문을 닫게 되자, 프랑스로 망명했으며, 유기적 형태의 표현주의적 추상을 본격적으로 펼쳐 나갔다.
그는 기하학적 형태나 정형화된 형식보다 선과 색채들이 자유롭고 활기찬 추상미술을 추구했다. 자연의 역동적 움직임이나 변화의 리듬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는데, 그것은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감정으로 느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면의 감정이나 느낌에 충실하게 색채와 선을 사용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점에서 자연의 역동성과 리듬에 공감하는 내적 충동이나 동요에 따르고, 그것을 다채로운 선과 색의 움직임으로 표현하려 했다. 이렇게 탄생한 칸딘스키의 추상미술은 감정이 따뜻한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따뜻한 추상’ 또는 ‘추상표현주의’라고 불린다.
다른 추상 화가들처럼 칸딘스키도 대상을 생략하고 축약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림 자체의 구성으로 향했다. 다소 서정적인 느낌을 주는 ‘전투’가 그 예이다. 화면 가운데 단순한 선과 색으로 산 능선을 나타냈고, 그 너머에 대포와 성곽의 흔적을 간략하게 표현했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서 성곽으로 뻗은 두 개의 직선은 군인들의 총에 칼을 꽂은 모습을 축약시켜 나타낸 것이다. 붉은색 사각형으로는 군인들의 모자를 나타냈고, 단순화한 모든 형태들을 모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전장의 한 장면을 연상케 했다.
그는 이런 초기의 추상미술을 ‘인상’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대상에서 받은 느낌이나 인상을 생략과 축약의 방법으로 나타내려 했다는 점에서다. 인간과 자연이 이루는 공감의 첫 단계가 인상이라는 뜻이다. 겨울이 물러가고 본격적인 봄이 시작된다. 자연과의 공감이 그리워지는 주말, 어떤 인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박일호 이화여대 교수·미학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정미칼럼] 뒤집힌 판에서 버티는 국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28/128/20250728517088.jpg
)
![[설왕설래] ‘마스가(MASGA)’](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28/128/20250728517097.jpg
)
![[기자가만난세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기준 재정립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5/26/128/20250526517480.jpg
)
![[박현모의 한국인 탈무드] 과학기술인들을 신명 나게 하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28/128/202507285170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