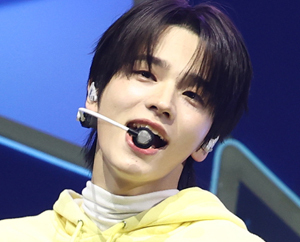느리더라도 오랫동안 더 멀리 달릴 것
트렌드를 좇아 달리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다. 러닝 광풍이 대한민국에 불어닥치기 한참 전부터 나는 꾸준히 뛰어왔다. 한 해, 두 해…. 되돌아보면 거의 15년 전부터 짧게는 10분, 길게는 한 시간씩 트레드밀에서 거의 매일 달렸다. 올해 들어서는 한강변을 뛰기 시작했다. 이렇게 바뀐 건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해 보고 싶다는 욕망 때문이다.
우울증을 치료 중인 여성 환자가 올해 2월 일본 교토 마라톤 대회에 나가 42.195㎞를 끝까지 뛰었다고 내게 말했다. “와, 대단하네요!”라고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의 성취를 추켜세우려고 한 말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그 환자가 너무 부러웠기 때문에 감탄사가 저절로 튀어나왔던 것이다. 그 순간 ‘나도 더 늙기 전에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해 보자!’라는 욕망이 솟아올랐다. 일 년에 한 번쯤은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이 50대50인 목표에 도전해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불가능할 거라 여겼던 일을 가능하게 만든다면 그 후의 삶은 전보다 충만해질 것이고, 비록 실패하더라도 목표를 이루려고 애쓰는 동안 나란 사람은 점점 강해질 테니까, 말이다.

내가 지금처럼 달리게 된 것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겪어야 했던 스트레스 덕택이다. 그땐 힘차게 달리지 않으면 퇴근해서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 상념이 머릿속을 헝클어 놓아 잠이 들지 않았고, 한밤에 깨기 일쑤였다. 어느덧 습관이 붙었는지 이제는 진료가 힘들었던 날도 저녁에 한 시간은 거뜬히 뛸 수 있다. 달리면 기분이 좋아지고 잠도 잘 온다.
의과대학 시절, 걱정이 많아지면 기숙사 주변 공터를 달렸다. 글을 쓰고 내 책을 내고 난 뒤부터는 더 열심히 달렸다.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 때문이다. 글쓰기와 달리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했던 그를, 나도 닮고 싶었던 것이다. 비록 열심히 뛰어도 내 글은 여전히 개발새발이지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쓰고자 하는 의욕이 차올랐다. 풀리지 않는 과제가 있어도 달리고, 직장 상사가 괴롭혀도 달리고, 컨디션이 안 좋아도 달렸다. 삶을 방해하는 것들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을 뛰면서 얻었다.
빨리 달리고 싶다는 욕망은 내게 없다. 느리더라도 꾸준히, 오랫동안, 더 멀리 달리고 싶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쓴다.
우선 달리기를 언제 어디서 할지 정해 두고 대체로 비슷한 시간에, 같은 장소를 뛴다. 평일에는 일을 끝낸 뒤 피트니스센터에서 뛰고, 주말 아침에는 잠수교 남단에서 북단으로 건너가 한강대교 혹은 당산철교까지 갔다가 되돌아온다. 영국건강심리학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 장소와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 놓으면 목표를 이룰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어떤 러닝복을 입을까 고민할 시간에 빨리 뛰러 나가기 위해 복장도 일관되게 정했다. 검은색 팬츠에 흰색 셔츠, 이마에 흐르는 땀을 잡아주는 헤어밴드까지 뛸 때마다 거의 똑같다.
혼자 뛰는 내게 음악은 러닝 크루다. 즐겁게 달리려고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다. ‘레드핫칠리페퍼스’와 ‘위켄드’의 리듬에 보폭을 맞추고, ‘9와 숫자들’의 가사를 곱씹고,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한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를 음미한다.
뛰기 싫을 땐 달려야 하는 내 나름의 은밀한 목표를 되새긴다. 아무리 힘들어도 목적의식이 선명하면 그것을 향해 한발 내딛기가 쉽다. 요즘은 내년 봄에 열리는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이미지를 마음속에서 떠올리고 또 떠올리고 있다.
김병수 정신건강전문의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세기의 이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16/128/20251016518117.jpg
)
![[기자가만난세상] ‘채택률 1위’ 대구 AI교과서 민낯](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16/128/20251016518066.jpg
)
![[삶과문화] 연락 차단하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7/128/20250807518461.jpg
)
![[박일호의미술여행] 자연의 위대함을 담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16/128/202510165180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