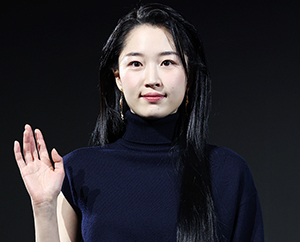전국 법정동 2만곳 중 80% 全無
소도시는 서울의 최대 4배 달해
무놀이터 전남 89%·충청 88%·경북 87%
서울은 22.5%… 지역별 접근성 편차 커
놀이터, 수도권 대단지 밀집지역 집중
화성시 오산동에만 464개 전국서 최다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엔 설치 의무
단독주택 많은 지방은 법률 적용 안 돼
‘모든 거주지에 놀이터’ 외국사례 주목

충남 당진에 사는 김지영(38·가명)씨는 요즘 오후만 되면 불안하다.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아들이 동네 골목에서 놀다 사고가 날까 걱정돼서다. 김씨가 사는 동네엔 놀이터가 하나도 없다. 차를 타고 도심으로 가야 비로소 그 흔한 미끄럼틀 하나 볼 수 있는 게 현실이다. 김씨는 “하교한 아들에게 어디서 놀고 있냐고 물어보면 대개 학교 근처 공터나 차들이 오가는 길가였다”며 “뛰어놀기엔 위험한 장소라 늘 노심초사한다”고 말했다.
최근엔 같은 동네 아이가 공터에서 놀다 도로로 튀어 나가 차에 치일 뻔한 사고도 있었다. 그날 이후 김씨는 아들에게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지만 불안한 건 그대로다. 그는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수도권이 아닌 놀이터 하나 없는 동네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사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며 “한참 뛰어놀아야 할 나이인 아들에겐 미안하지만, 차라리 안전한 학원으로 애를 돌려야 할지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김씨의 사례는 결코 드문 이야기가 아니다. 이러한 ‘무(無)놀이터 동네’는 전국 법정동 10곳 중 8곳꼴로 존재했다. 어린이날을 맞은 5일 행정안전부의 ‘전국어린이놀이시설정보서비스’에 이달 2일까지 등록된 놀이시설 8만9030곳을 전수 분석했다. 그 결과 전국 2만275개 법정동 가운데 1만6206곳(79.9%)에 어린이놀이시설이 한 개도 없었다. 또 이러한 무놀이터 동네는 지방 소도시에 몰려 있었다. 어린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인 놀이터조차 지역에 따라 불평등한 모습이었다.
놀이터의 불평등은 단순한 인프라 부족을 넘어 어린이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다. 놀이를 통해 또래와의 사회성을 기르고, 신체 활동으로 건강을 키워야 할 시기에 지역에 따라 놀이터 접근성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무놀이터’ 비율, 전남 가장 높아
전체 법정동 중 놀이터가 없는 법정동 비율은 지방이 서울보다 크게는 4배가량 높았다.
무놀이터 동네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이었다. 전남 전체 2974개 법정동 가운데 2645곳에 놀이터가 없는데 10곳 중 9곳꼴(88.9%)이다. 놀이터가 없는 나머지 동네에 사는 아동은 놀이터가 아닌 곳에서 놀거나, 놀이터를 이용하려면 다른 동네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법정동은 법으로 지정한 최소 행정구역 단위를 말한다.
서울은 전체 법정동 467곳 중 무놀이터 동네가 105곳으로 비율로는 22.5% 수준이었다. 전남에 사는 아동이 서울에 사는 아동보다 무놀이터 동네에 살 확률이 약 4배 높은 셈이다. 무놀이터 비율이 높은 건 충남(88.3%)과 충북(88.1%), 경북(87.1%) 등 다른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도 사정이 비슷했다. 반면 대전(24.3%), 광주(38.1%), 부산(43.7%) 등 광역시는 그 비율이 50% 미만이었다.
법정동별로 살펴보면 놀이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은 수도권 중에서도 아파트 대단지가 밀집한 지역에 집중됐다. 법정동 한 개에 100개 이상 놀이터가 모인 곳이 전국 134곳이었다. 가장 많이 밀집한 지역은 경기 화성시 오산동(464개), 인천 연수구 송도동(380개), 경기 시흥시 정왕동(347개), 서울 노원구 상계동(273개),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273개) 순이었다.

◆지역 불평등 원인은 현행법
지방에 놀이터가 적은 까닭은 무엇일까. 놀이터 설치 의무를 규정한 법령상 한계와 근본적으로 수도권에 인구가 과밀한 국내 상황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 역시 놀이터를 법정동마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이 없다면서 “행안부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를 맡고 있어 현황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어린이의 ‘놀 권리’ 측면에서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주택건설기준규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등이다. 이들 법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정원 50명 이상 어린이집’, ‘공공 도시공원’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가 의무다. 전체 어린이놀이시설 가운데 절반 이상인 4만3424개(54.2%)가 공동주택 내 설치돼 있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 부속 시설 내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도 2만1693곳(27.1%)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 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에 사는 아동은 놀이시설 접근성에서 근본적인 제약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경기(29.9%)와 서울(14.3%) 등이었다. 어린이집 내 어린이놀이시설 역시 경기(22.5%)와 서울(12%) 등 수도권에 편중돼 있었다.
게다가 의무로 규정된 공동주택과 어린이집 등 시설 내 설치된 놀이터는 모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놀이터’라고 보기도 어렵다. 공동주택이나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된 시설은 외부 아동의 접근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공간인 어린이공원에 설치된 시설은 전국 1만1893곳(14.8%)에 그쳤는데 그마저도 경기(26.9%)와 서울(14.2%)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농어촌 지역 등 지방 소도시의 경우 아파트 단지가 없어 놀이터 설치 의무도 비껴가고, 공공공간도 부족해 사실상 ‘놀이터 사각지대’로 방치된 것이다.
거주 형태와 지역에 따라 아동의 ‘놀 권리’ 불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선 국가들도 있다. “아동은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영국은 2007년부터 ‘국가 놀이전략’을 도입해 모든 거주지 내 무료 놀이터 설치를 법제화하고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도 도시계획에 놀이공간을 필수 공공 인프라로 포함하고 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한국 부자의 기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4/128/20251214508711.jpg
)
![[특파원리포트] 中 공룡 유통사들 유럽 공습](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4/128/20251214508707.jpg
)
![[김정식칼럼] 토지거래허가제의 득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4/128/20251214508692.jpg
)
![[심호섭의전쟁이야기] 북베트남은 어떻게 승리했을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4/128/2025121450869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