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키(로버트 패틴슨)가 신화 속 인물이었다면 그는 ‘익스펜더블(소모품)’이 아닌 영웅으로 불렸을지 모를 일이다. 비록 불사의 몸은 아닐지언정 그가 최초로 스캔되었던 시점으로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니 말이다.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는지 영화는 생략하지만 반복된 죽음에도 미키의 기억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 연속성을 가진다. 그러니 미키의 기억을 경험과 세월로 성숙해 가는 정신으로, 리프린트된 미키의 육신을 영속하는 젊음으로 본다면 그는 사실 인류가 오래도록 선망해 온 젊음과 지혜를 동시에 갖춘 존재에 누구보다 가깝다. SF에서 인간이 만든 기계가 자연발생적 의지를 갖게 되어 인류를 초월할지도 모른다는 상상에서 비롯된 서사는 많지만 미키의 경우는 이 반대 지점에 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 태어나, 복제를 멈출 권한을 가진 인간에 의해 미키의 ‘재탄생’은 얼마든지 종료될 수 있기에 그는 권력과 계급의 하부로 종속되어 그러므로 비천하다.
‘미키 17’이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와 ‘옥자’의 흐름에 있다는 데 일부 동의한다. 익히 알려졌듯 그의 영화세계의 뼈대는 계급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플란다스의 개’에서 ‘기생충’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영화 중심에서 계층의 피라미드 아래에 놓인 약자를 목격한다. 그의 영화가 충격을 안겨주는 이유는 약자로 보였던 이들이 어느새 상대적 약자를 착취하거나(‘마더’), 상대적 약자를 제거하여(‘기생충’) 자기 자리를 공고히 하는 데 이용하기 때문이다. 상부와 하부의 이분법으로 보였던 구조에서 더 깊은 아래층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그의 계급 딜레마는 독특하다. 이와 달리 ‘설국열차’와 ‘옥자’의 주인공은 상부의 권력자에 도전하기 위해 전진한다. 거대한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종국에 아주 작은 구원이 두 영화의 결말에 놓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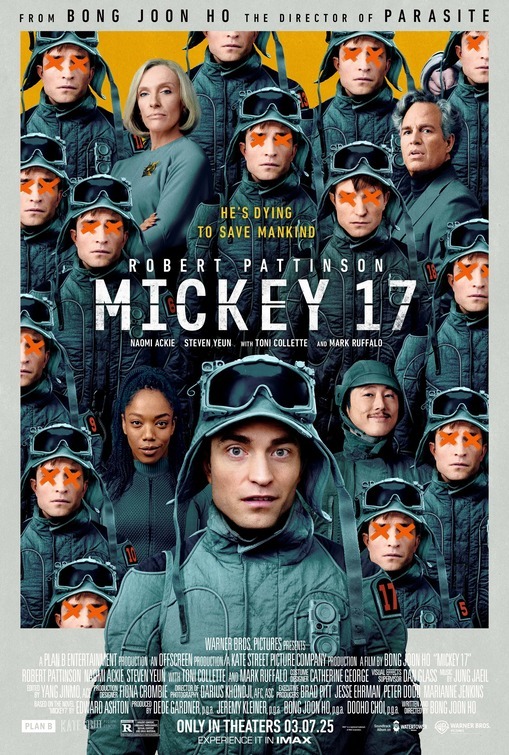
‘미키 17’이 봉준호의 필모그래피 중 가장 뜨거운 피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 끝에 거대한 구원과 허물어진 계층구조가 있어서다. 식민 지배의 알레고리를 담고 있기도 한 이 영화에서 피지배자가 될 위기에 처한 마마 크리퍼는 죽은 루코를 인간 하나의 목숨으로 대등히 하자고 요구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등가교환은 얼핏 순진한 계산처럼 보인다. 루코가 모든 크리퍼에게 소중했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죽음이 인류 전체에 비극이 되길 바라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인간 하나”를 외치며 두 사람의 죽음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다른 하나가 아닌 열여덟 번째 미키 반스의 목숨으로 인류는 구원되었음을 의심치 않는다. 이는 약자가 생존을 위해 또 다른 약자의 희생을 딛거나, 하나를 잃고 둘을 얻는 것에 그쳤던 혁명의 실패에서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순간과 같다. 착취의 대상이었던 미키가 또 다른 착취의 대상에 놓일 뻔한 크리퍼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수를 구원한 대목에서 ‘미키 17’은 그에 앞섰던 영화의 계급 딜레마와 실패를 넘어선다.
유선아 영화평론가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미·러 ‘뉴스타트’ 종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4/128/20260204518482.jpg
)
![[세계포럼] 참전용사 없는 6·25전쟁 기념식](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4/128/20260204518473.jpg
)
![[세계타워] 이민 ‘백년지대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4/128/20260204518438.jpg
)
![[열린마당] 쿠팡 때리기만이 능사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4/128/2026020451837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