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5년 9월15일 나치 독일이 뉘른베르크 전당대회에서 갈고리십자 문양을 국기로 채택했을 때 세계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보다는 바로 그 전당대회에서 유대인의 권리를 박탈하기로 한 법의 제정이 더 주목을 끌었다.
갈고리 십자가는 그 전부터 나치의 당기로 사용돼 왔었다. 스바스티카(Svastika)나 스와스티카(Swastika) 또는 하켄크로이츠(Hakenkreuz)라고도 불리는 그 문양은 1차대전 직후 독일에서 나치가 생겨나기 전부터 유행했던 것이다.
그 꺾어진 십자가 국기와 유태인 탄압법은 얼핏 서로 무관해 보였으나 갈수록 긴밀해지는 느낌이었다. 2차대전이 일어나자 연합국 측의 주민들에게는 하켄크로이츠가 그저 적국의 국기 정도로 비쳤으나 유대인들에게는 악몽이나 악마 그 자체였다.
나치와 하켄크로이츠의 만남을 보면 이 세상의 극히 보편적인 선의의 상징이 인간사회의 갈등에 따라 저주의 문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켄크로이츠의 바탕이 되는 스와스티카는 나치가 독창적으로 제정한 것이 아니라 5000년 전부터 동서양에서 두루 쓰인 문양이다.
중국의 한문에도 ‘만(卍)’이라는 글자로 자리 잡고 있다. 태양의 움직임을 직각 모양으로 나타낸 이 문양은 태양을 상징하듯 밝음과 선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부처를 상징하는 문양으로써 널리 쓰인다.
나치가 하켄크로이츠를 택한 동기도 저주보다는 축복의 의미에서였다. 스와스티카는 중앙아시아에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퍼져나간 인도아리안 족의 징표라는 이론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스와스티카가 인도아리안 족의 상징이라는 주장에는 어딘지 히틀러 식의 억지가 있다. 그들이 같은 하늘 아래 함께 살 수 없다고 본 유태인들의 유적에서도 스와스티카 식의 문양이 발굴됐으니 나치를 숭상한 이들은 어이가 없었고 유태인들은 치를 떨었으리라.
양평(언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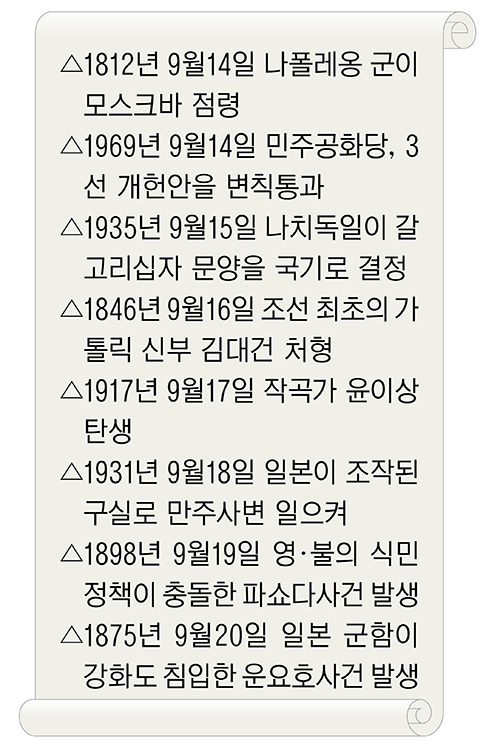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정미칼럼] 筆風解慍 <필풍해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9/128/20251229516821.jpg
)
![[설왕설래] 삼성의 독일 ZF ADAS 인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9/128/20251229516848.jpg
)
![[기자가만난세상] 낯선 피부색의 리더를 만난다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9/128/20251229516765.jpg
)
![[기고] 서울형 키즈카페가 찾아준 ‘놀 권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9/128/20251229516751.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