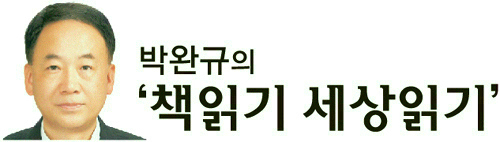
다산 정약용은 18년에 걸친 유배 기간에 학문을 더욱 연마해 ‘목민심서’, ‘흠흠신서’, ‘경세유표’ 등 500여편의 저술을 남겼다. 조선 후기 실학사상을 집대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배지에서 40대와 50대 대부분을 보내면서도 학문하는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고, 인간적인 면모도 잃지 않았다. 당시 두 아들과 형에게 보낸 편지에 잘 드러난다. 편지는 남도 끝자락 강진의 궁벽한 곳에 고립된 그가 세상과 만나는 유일한 통로였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서문에서 박석무는 다산의 편지를 번역해 펴낸 이유를 궁금증 때문이라고 했다. “다산이 자기의 분신인 두 아들과 혈육의 형과 지인들에게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했을까. 또 그가 자신의 인간적 아픔은 어떻게 이겨냈고, 그 시대의 아픔은 어떻게 표현했을까.”
다산은 두 아들 학연과 학유에게 보낸 편지에서 시종일관 독서를 권한다. 폐족(廢族·큰 죄를 져서 벼슬길이 막힌 집안)이 잘 처신하려면 독서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 너희들은 망한 집안의 자손이다. 그러므로 더욱 잘 처신하여 본래보다 훌륭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기특하고 좋은 일이 되지 않겠느냐? 폐족으로서 잘 처신하는 방법은 오직 독서하는 것 한 가지밖에 없다. 독서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깨끗한 일일 뿐만 아니라 호사스런 집안 자제들에게만 그 맛을 알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촌구석 수재들이 그 심오함을 넘겨다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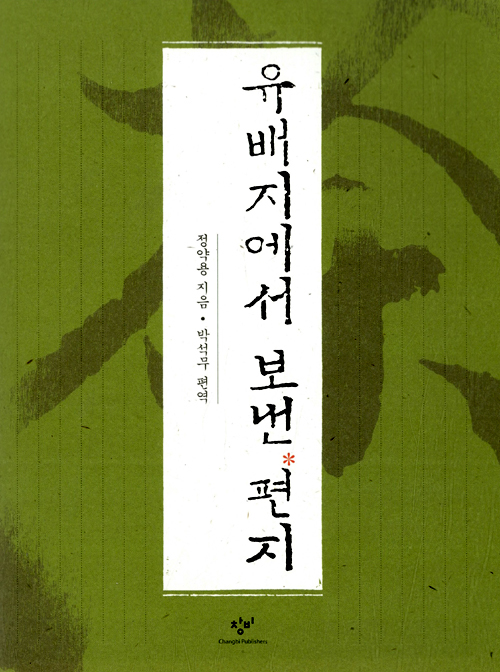
폐족이어서 오히려 공부에 도움이 되는 면도 있다고 했다.
“폐족에서 재주있는 걸출한 선비가 많이 나오는 것은, 하늘이 재주있는 사람을 폐족에서 태어나게 하여 그 집안에 보탬이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부귀영화를 얻으려는 마음이 근본정신을 가리지 않아 깨끗한 마음으로 독서하고 궁리하여 진면목과 바른 뼈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독서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라고 충고한다.
“반드시 처음에는 경학(經學) 공부를 하여 밑바탕을 다진 후에 옛날의 역사책을 섭렵하여 옛 정치의 득실과 잘 다스려진 이유와 어지러웠던 이유 등의 근원을 캐볼 뿐 아니라 또 모름지기 실용의 학문, 즉 실학(實學)에 마음을 두고 옛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구했던 글들을 즐겨 읽도록 해야 한다.”
주자학에서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들어 궁극에 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격물(格物)’을 권하기도 했다.
“오늘 한 가지 물건에 대하여 이치를 캐고 내일 또 한 가지 물건에 대하여 이치를 캐는 사람들도 이렇게 착수를 했다. 격(格)이라는 뜻은 가장 밑까지 완전히 다 알아낸다는 뜻이니 밑바닥까지 알아내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일본의 유학을 거론하면서 과거 제도의 폐해를 지적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일본에서는 요즈음 명유(名儒)가 배출되고 있다는데 물부쌍백(物部雙柏·오규 소라이의 별칭)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며 “글이 모두 정예하였다”고 했다.
“책도 책이려니와 과거를 보아 관리를 뽑는 그런 잘못된 제도가 없어 제대로 학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와서는 그 학문이 우리나라를 능가하게 되었으니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다산이 그처럼 공부를 하라고 일렀는데도 두 아들의 반응은 시원치 않았던 모양이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 공부에 대해서 글과 편지로 수없이 권했는데도 너희는 아직 경전(經傳)이나 예악(禮樂)에 관해 하나도 질문을 해오지 않고 역사책에 관한 논의도 보여주지 않고 있으니 어찌된 셈이냐?”
그래도 공부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는지 질타의 강도가 높아진다.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세상에서 얕잡아보는 것도 서글픈 일일진대 하물며 지금 너희들은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고 얕잡아보고 있으니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다.”
“어찌 글공부에는 그 아비의 버릇을 이을 줄 모르고 주량만 훨씬 아비를 넘어서는 거냐? 이거야말로 좋지 못한 소식이구나.”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버지의 꾸지람이다. 두 아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다산의 애틋한 마음이 느껴진다.
같은 시기에 흑산도에서 귀양살이하던 둘째 형 정약전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중풍으로 건강을 잃은 처지에도 많은 책을 쓰는 이유에 대해 이런 말을 한다.
“점차로 하던 일을 거둬들여 정리하고 이제는 마음공부에 힘쓰고 싶은데 더구나 풍병(風病)은 이미 뿌리가 깊어졌고 입가에는 항상 침이 흐르고 왼쪽 다리는 늘 마비증세를 느끼고 머리 위에는 언제나 두미협(斗尾峽·한강 상류의 강 이름) 얼음 위에서 잉어 낚는 늙은이의 솜털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 다만 고요히 앉아 마음을 맑게 하고자 하고 보면 세간의 잡념이 천갈래 만갈래로 어지럽게 일어나 무엇 하나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으니, 마음공부로는 저술보다 나은 게 없다는 것을 도로 느낍니다.”
다산의 편지를 보면 그가 가족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두 아들은 다산의 간절한 바람대로 독서에 힘썼다. 학연은 농업·축산에 관한 책 ‘종축회통‘을, 학유는 ‘농가월령가’를 남겼다.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번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다보니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도 늘었을 것이다.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기에 좋은 때다.
박완규 논설실장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대전차 방벽](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8/128/20251228508849.jpg
)
![[특파원리포트] 트럼프행정부 NSS를 대하는 자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8/128/20251228508622.jpg
)
![[이종호칼럼] AI 대전환 시대, 과감히 혁신하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8/128/20251228508590.jpg
)
![[심호섭의전쟁이야기] 이길 때 멈춘 핀란드의 계산된 생존 전략](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8/128/2025122850858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