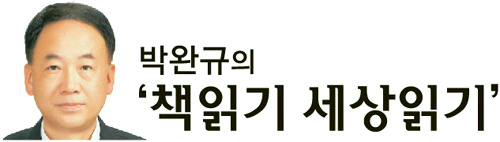
영국 역사가 에드워드 핼릿 카는 1961년 케임브리지대에서 일련의 강연을 한 뒤 그 내용을 책으로 펴냈다.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명저가 탄생했다. 이 책은 지난 수십년 간 우리나라 대학에서 역사학 기본 텍스트였다. 군사독재 시절에는 불온서적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대학에서 교과서로 읽힌 책이 권력에겐 수상하게 비쳤으니 그야말로 모순의 시대였다.
책에서 카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개념부터 규정한다.
“사실은 역사가가 허락할 때에만 이야기한다. 어떤 사실에 발언권을 줄 것이며 그 순서나 전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역사가이다.”
역사적 사실이란 과거에 있었던 그대로의 사실이 아니라 역사가에 의해 해석된 사실이다. 역사학자 김기봉이 “역사란 우리와 떨어져 있는 실재가 아니라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리는 풍경이다”(‘역사들이 속삭인다’)라고 한 말을 되새기게 된다.
 |
| 에드워드 핼릿 카. |
흔히 역사하면 옛사람들이 남긴 문서를 떠올린다. 19세기에는 역사가들이 사실을 숭배하면서 문서를 떠받들던 때도 있었다. 카는 이를 정면으로 비판한다. 문서는 있던 그대로의 사실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 어떤 문서도 고작 우리에게 그 문서의 작성자가 생각한 것을 말해줄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역사는 사유의 역사이며, 역사란 사유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역사가가 그 사유를 자신의 정신 속에 재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다음의 세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역사의 사실들은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존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코 순수한 것으로 다가서지 않는다.” 둘째, “역사가는 자신이 다루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위의 배후에 있는 생각을 상상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는 오로지 현재의 눈을 통해서만 과거를 조망할 수 있고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역사가의 역할을 한계지어야 한다. 카는 “역사가의 기능은 과거를 사랑하거나 과거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로서 과거를 지배하고 이해하는 데에 있다”고 한다.
“역사가는 사실의 잠정적 선택에서, 그리고 동시에 그 선택을 이끌어준 잠정적인 해석(그 해석이 그 자신의 것이건 다른 사람의 것이건 간에)에서 출발한다. 그가 연구하는 동안, 사실의 해석 그리고 사실의 선택 및 정돈, 이 두 가지는 이러저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미묘하고도 얼마간 무의식적일 수 있는 변화들을 겪는다. 그리고 이 상호작용에는 현재와 과거 사이의 상호관계도 포함되는데, 왜냐하면 역사가는 현재의 일부이고 사실은 과거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카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한다. 세상에 잘 알려진 말이다. “역사란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과정,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역사가와 그의 사실 사이의 상호작용의 과정, 즉 내가 현재와 과거 사이의 대화라고 불렀던 그 과정은 추상적이고 고립적인 개인들 사이의 대화가 아니라 오늘의 사회와 어제의 사회 사이의 대화이다. … 과거는 현재에 비추어질 때에만 이해될 수 있다. 또한 현재도 과거에 비추어질 때에만 완전히 이해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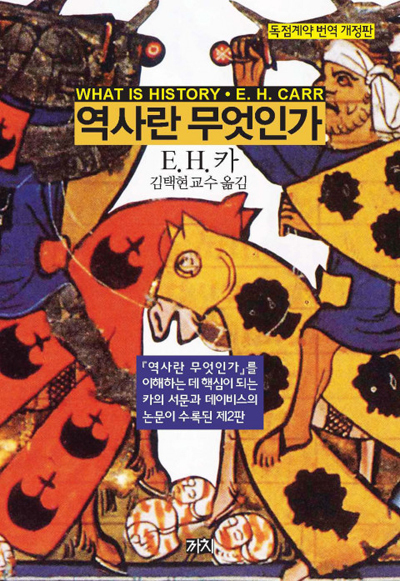
이러한 역사관은 “역사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일관된 연관성을 확립할 때에야만 의미와 객관성을 가지게 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카는 ‘진보로서의 역사’를 강조한다.
“진보에 대한 신념은 자동적이거나 필연적인 과정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의 부단한 발전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 진보는 추상적인 용어이다. 그리고 인류가 추구하는 그 구체적인 목적들은 그때그때마다 역사과정에서 생기는 것이지 역사의 외부에 있는 어떤 원천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올바른 방향감각을 지녀야 한다. 역사의 방향감각은 역사가뿐 아니라 정치가 등에게도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이러한 역사의 방향감각만이 우리가 과거의 사건을 정리하고 해석하는 것(이것은 역사가의 임무이다)을 가능하게 해주며, 미래의 전망을 가지고 현재에 인간의 에너지를 분출시키고 조직하는 것(이것은 정치가, 경제 전문가, 사회개혁가의 임무이다)을 가능하게 해준다. … 우리의 방향감각, 즉 과거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우리가 전진함에 따라 끊임없이 수정되고 발전할 수밖에 없다.”
카는 절망의 시대일수록 역사가가 현재에 대한 이해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미래에 대한 전망은 고된 현실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역사에 관심이 많은 어떤 이는 “인생의 고비마다 ‘역사란 무엇인가’를 읽었다”고 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있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전업자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1/128/20260111509892.jpg
)
![[특파원리포트] 21세기 ‘흑선’ 함대에 마주선 한·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1/128/20260111509858.jpg
)
![[박영준 칼럼] 美 국방전략 변화와 한·미 동맹 과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1/128/20260111509810.jpg
)
![[심호섭의전쟁이야기] 과감한 결단이 얻어낸 ‘전장의 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1/128/2026011150981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