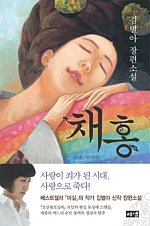 ‘화랑세기’에 등장하는 신라의 권력자 미실을 주인공으로 한 동명 장편 ‘미실’로 제1회 세계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김별아(42)씨가 다시 역사 속의 문제적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장편 ‘채홍(彩虹·무지개)’을 들고 돌아왔다.
‘화랑세기’에 등장하는 신라의 권력자 미실을 주인공으로 한 동명 장편 ‘미실’로 제1회 세계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김별아(42)씨가 다시 역사 속의 문제적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장편 ‘채홍(彩虹·무지개)’을 들고 돌아왔다.
‘논개’ ‘백범’ 등 실존 인물을 자신의 시각으로 해석해온 김씨는 이번에 ‘조선왕조실록’이 전하는 유일한 왕실 동성애 사건을 다뤘다. 열 번째 장편소설이자 일곱 번째 역사소설인 ‘채홍’(해냄 펴냄)의 주인공은 세종의 며느리이자 문종의 둘째 정비인 봉빈. ‘조선왕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요사이 듣건대, 봉씨가 궁궐의 여종 소쌍이란 사람을 사랑하여 항상 그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니, 궁인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빈께서 소쌍과 항상 잠자리와 거처를 같이 한다’고 하였다.”(‘세종실록’, 1436년 10월26일자)
김씨는 소설에서 세종이 폐서인하면서 내린 이 기록 때문에 그저 행실이 방정하지 못한 여성으로만 형해화된 봉빈을 사랑과 본능에 충실한 인간으로 되살려 놓으며 기록이 말하지 못한 행간의 진실찾기를 시도한다.
―“아무리 냉철하고 신중한 임금이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오해할 수밖에 없다”(313쪽)는 세종과 “그저 사랑하고 보니 사내가 아니었을 뿐입니다”(14쪽)라는 봉빈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다.
“길들여질 수 없는 본성, 욕망 등에 솔직하다 보면 시대와 불화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시대를 뛰어넘어 자기 운명을 사랑하는, 본능에 솔직한 사람을 좋아하죠. 개인이 시대를 이길 수 없으니 결국 패하겠지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지금 의미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요.”
소설에서 세자 향의 첫 번째 부인이던 휘빈 김씨가 폐해지고 3개월 만에 세자빈으로 책봉된 봉빈은 세자에게 사랑을 갈구하다 좌절을 거듭하고 결국 나인 소쌍을 상대로 금기의 사랑을 하면서 파국으로 치닫는다.
 |
| 역사 장편소설 ‘채홍’을 들고 돌아온 김별아씨는 “승자의 기록인 역사 속에서 희생된 여성과 약자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싶다”며 “사랑 때문에 죽은 조선시대 여인 두 명 정도를 더 발굴해 쓰려고 한다”고 말한다. 이재문 기자 |
“동성애자들에게 ‘왜, 어떻게’를 물을 수 있겠지만 본성에 충실하다 보면 이성애나 동성애 모두 할 수 있다고 봐요. 역사에서 계율이나 금기가 없던 곳에선 동성애자라고 더 가혹하게 처벌받진 않죠. 오히려 근대 이후 종교적 사회적인 금기가 강해지면서 동성애를 좀더 터부시한 것 같아요.”
소설 제목인 무지개(‘채홍’)는 태양의 반대편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즉 왕이라는 태양의 반대편에 있어 가려진 사람들의 욕망과 사랑, 갈등, 질투 등을 은유한다고 할 수 있겠다.
―사건의 진상을 캐던 환관 김태감은 결국 “과연 세상이 말하는 금기가 영원히 변함 없는 진실일까?”(290쪽)라고 의문을 제기하죠.
“김태감을 포함해 조선시대의 내시나 궁녀 등은 욕망이 거세된 사람들이죠. 욕망이 억제되거나 억눌려지면서 괴이한 형태의 삶을 삽니다. 권력 등으로 대체되기도 하지만 거세된 성을 회복될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존재들이죠.”
―미셸 푸코는 지식이 권력화하면서 이성과 사람을 경계짓는다고 지적했는데.
“근대국가 이후 시대나 특정한 경계에 어긋난 사람은 더욱 살아갈 수 없게 돼 버린 측면이 있어요. 조선시대는 근친상간 등 사회와 불화하면 산으로 도망가 화전민으로 살 수도 있었지만 현대는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소설에서 “역사는 사랑을 기억하지 않아요. 아니, 애초에 못하지요”라고 말했던 김씨가 ‘작가의 말’에서 “어리석은 본능을 옹호하고 덧없는 욕망을 지지하는, 오직 인간의 편인 문학만이 그 기억을 기록할 수 있다”고 말한 이유다.
그는 최근 정부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규제 움직임에 대해서도 “표현의 욕구라는 것은 시대를 관통하는 욕구인데, 막을 수 있겠느냐”며 “가만히 놔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용출 기자 kimgij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전업자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1/128/20260111509892.jpg
)
![[특파원리포트] 21세기 ‘흑선’ 함대에 마주선 한·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1/128/20260111509858.jpg
)
![[박영준 칼럼] 美 국방전략 변화와 한·미 동맹 과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1/128/20260111509810.jpg
)
![[심호섭의전쟁이야기] 과감한 결단이 얻어낸 ‘전장의 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1/128/2026011150981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