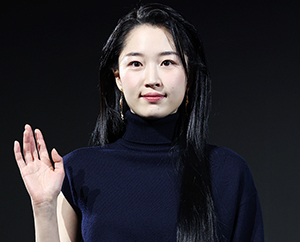‘쓸쓸한 생의 마감’ 유족에 전해
확진 후 격리 투병 끝 가족 못 보고 사망
마지막 순간 손 꼭 잡아주며 눈물 삼켜
코로나 중환자실, 25년차 베테랑도 ‘공포’
장례지도사 대신 전 과정 도맡아
3~4명 시신 닦고 옮기고 이중 소독·밀봉
두꺼운 방호복 입고 병실·복도까지 소독
“고인 바이러스 취급하는 듯해 더 괴로워”
코로나 전담병원 중환자실 김수진(가명·46) 간호사는 얼마전 머리를 가려워던 80대 환자 전여순(가명)씨 모습이 퇴근 후에도 내내 마음에 걸렸다. 전씨는 최근 기력이 급격히 쇠약해져 몸을 씻겨주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김 간호사는 다음날 꼭 그의 머리를 감겨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막상 출근하자 위중한 환자들을 돌보느라 짬을 낼 수 없었다. 이날 전씨의 심장이 멈췄다. 김 간호사는 전씨 딸에게 “어머니께서 제가 본 환자들 중 가장 예쁜 얼굴로, 편안하게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머리를 못 감겨드려서 너무 죄송해요”라고 털어놨다. 전씨의 딸은 “해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도 알고 계실 거예요. 저 대신 우리 어머니 마지막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김 간호사가 1년간 이렇게 떠나보낸 코로나19 환자만 20명이 넘는다. 인공호흡기,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기), CRRT(투석치료기) 같은 장치에 의존해야 하는 환자와 감염되지 않기 위해 고글과 방호복을 갑옷처럼 입고 있는 의료진이 매일 사투를 벌이는 이 곳, 중환자실은 ‘코로나 사선(死線)’이다.
세상은 코로나 확진자 숫자와 백신 접종률만 바라보지만, 이 곳에선 그들이 주목하지 않는 코로나 사망자 숫자를 줄이기 위해 오늘도 치열하게 싸운다.
김 간호사는 25년차 베테랑이지만 코로나19 중환자실에서 근무한 1년은 오랜 경험과 내공이 무색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전염성 강한 바이러스는 환자들을 철저하게 고립시켰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순간부터 격리돼 면회가 금지된 중환자실에 입원한 후 사망에 이르는 경우 환자와 보호자는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한채 준비안된 이별을 맞는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진은 환자와 보호자 모두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자 연결고리다.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의 임종을 대신 지키며 겹겹이 장갑 낀 손으로라도 꼭 잡아준다. 환자의 사망을 지켜보는 것이 낯설지 않은 그들이지만, 고립된 채 쓸쓸히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눈물을 참기 힘들었다.
전대미문의 바이러스가 가져온 공포는 견고했던 의료체계와 숙련된 의료진을 압도했다.


“알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와 싸워야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고 공포였어요. 정보도, 매뉴얼도 없는 상황에서 방호복 하나 덜렁 받아 사지에 몰리듯 일하러 갔죠. 유일하게 의지할 건 방호복인데 초기엔 그조차 부족해서 비닐로 발을 감싸고 테이프 붙여가면서 환자 보러 갔죠. 굉장히, 많이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환자들한테 내색할 수는 없었어요.”
감염을 최대한 막기 위해 코로나19 병동은 철저하게 접근이 제한됐다. 의료진을 제외하고 환자와 접촉하던 모든 사람의 출입을 막았고, 그들이 하던 일은 모두 간호사의 몫이 됐다. 환자 이송부터 배식, 보호자와 간병인 역할은 물론 장례지도사를 대신해 시신 염습(殮襲)을 하고, 병실 소독 및 폐기물 처리까지 간호사들이 도맡고 있다.
가장 힘든 것은 사망한 환자 시신을 수습하는 일이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사망한 환자의 몸을 닦아주긴 했지만,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그 과정이 더 복잡하다. 먼저 고인의 몸 전체를 소독약으로 닦고, 시신을 들어올려 방수포를 씌운다. 그리고 방수포 위를 다시 소독약으로 닦는다. 포로 감싼 시신을 들어 바디백에 넣고 한번 더 소독한다.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신을 이중으로 소독하고 밀봉하는 것이다. 3∼4명의 간호사가 힘을 합쳐도, 바람도 잘 통하지 않는 두꺼운 레벨D 방호복을 입고 두 겹의 장갑을 낀 채 수십㎏에 달하는 시신을 옮기고 닦기를 반복하다 보면 온 몸의 구멍이 모두 열린 듯 땀으로 흠뻑 젖는다.

바디백을 밖으로 옮겨 놓고 간호사들은 다시 병실로 돌아가야 한다. 환자 몸에 연결돼 있던 의료기기들과 환자가 누워있던 병상 등 바이러스가 조금이라도 묻어있을법한 모든 것을 소독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신을 화장터로 운반할 직원들에게 인계하기까지 시신이 이동한 통로까지 간호사들이 모두 소독한다.
이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간호사들이 적지 않다. 코로나 대응 매뉴얼이 없던 사태 초기 일부 병원에서는 시신 소독제로 락스를 사용했다.
“1대 50 비율로 물에 희석시키긴 했지만, 바닥을 닦는 데 사용하던 것을 사람 몸에 뿌리는 건 아무리 여러번 해도 절대 익숙해질 수 없었어요. 말하는 이 순간도 괴롭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가족처럼 돌보며 임종까지 지킨 환자였는데, 사망했다고 한순간에 ‘바이러스’로 취급하는 것 같은 죄책감이 그들을 괴롭혔다.
지난해엔 퇴근 후에도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행여 자신이 가족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기거나, 가족으로부터 감염돼 환자에게 옮길까봐 병원 근처 숙소에서 지냈다. 집에서 통근하기 시작한 후에도 가족들과 한 지붕 아래 철저하게 격리된 생활을 하거나, 자녀를 친지에게 맡기는 간호사들도 있다.

상처만 남은 건 아니다. 총성 없는 전쟁터 같은 코로나19 중환자실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들은 가족에게도 말 못할 고통을 나누고 위로하는 ‘전우’가 됐다.
“저희 집(코로나 중환자실) 식구들은 지나가다 만나면 서로 얼싸 안아요. 어제 보고 또 보는데 뭐 그렇게 반갑냐고들 하시는데, 저희는 너무 애틋한 거에요. 서로 힘이 되어주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으니까.”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한국 부자의 기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4/128/20251214508711.jpg
)
![[특파원리포트] 中 공룡 유통사들 유럽 공습](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4/128/20251214508707.jpg
)
![[김정식칼럼] 토지거래허가제의 득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4/128/20251214508692.jpg
)
![[심호섭의전쟁이야기] 북베트남은 어떻게 승리했을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4/128/2025121450869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