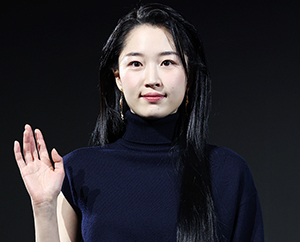며칠 전 강윤성 감독의 신작 ‘중간계’의 언론 시사회는 인공지능(AI)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이 영화는 국내 최초로 AI로 만들어진 상업장편영화였기 때문이다. 아직은 어색한 장면들에도 불구하고 해결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존 VFX로 4∼5일 걸리는 광화문 폭파신을 AI로 한 시간이면 만들 수 있다는 감독에 의하면 AI는 제작비 절감에 대단히 효율적인 도구임이 틀림없다. 제작비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미국에서 공개된 AI 합성배우 ‘틸리 노우드’ 제작사의 발언, “틸리를 활용할 경우 제작비의 90%를 절감할 수 있다”는 말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그 경제적 효율성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간담회가 끝난 뒤에 사람들 사이에서 “‘쉬리’ 빌딩 폭파 신보다 낫다” “다들 실업자 되겠네”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분명히 AI는 빠른 속도로 영화 제작 현장을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AI를 둘러싼 논의들은 어떤 면에서 20여년 전 디지털 매체가 등장하던 때와 유사한 면이 있는데 2000년대 초반 디지털카메라가 본격적으로 등장할 무렵 국내의 영화제들은 디지털이라는 신기술을 소개하는 데 앞장섰다. 그러나 디지털이 디폴트가 된 지금 누구도 디지털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마시는 공기와 같은 환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AI도 같은 길을 걸을 것이다.
AI의 학습 능력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고 누군가의 푸념처럼 실업자를 양산할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과거 신기술이 도입될 때와는 또 다른 복잡한 사회적, 철학적, 윤리적 논쟁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논쟁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배우들이다. ‘틸리 노우드’가 공개되었을 때 미국배우조합(SAG-AFTRA)은 틸리는 배우가 아니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미 인스타 계정을 갖고 있고 앞으로 영화, TV, 광고,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활동을 예고한 틸리 같은 AI 가상배우들이 배우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AI 기반 제작사들은 AI 배우가 인간의 대체물이 아닌 보완자일 뿐이라 말하지만 그러한 방어 논리가 연기자들의 실존적 불안을 잠재우기는 힘들다. AI는 너무 짧은 시간에 SF의 영역에서 현실 영역으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리들리 스콧 감독이 ‘블레이드 러너’에서 육안으로 인간과 식별 불가능한 안드로이드를 보여준 것이 벌써 40여년 전이다. ‘AI는 아직 인간의 표현력을 따라갈 수 없다’는 주장의 방점은 ‘없다’가 아닌 ‘아직’에 찍혀 있다. 그리고 이 ‘아직’은 매우 빠르게 해결될 것이다.

AI 배우의 등장은 향후 기술 발전과 윤리의 관계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예고한다. AI 배우가 실제 배우들을 합성한 데이터의 산물이라는 논란이 야기한 디지털 트윈의 정체성,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에 대한 투명성 확보 문제, 인간 배우의 초상권, 저작권, 인간 노동의 가치 등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이슈들이 수두룩하다. AI 활용의 표준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를 위한 테이블이 시급한 이유이다.
사족. ‘To be continued’라는 자막과 함께 급하게 끝난 1편을 이을 2편을 기다린다. 그것은 이 영화가 AI 기술의 테스트베드여서가 아니라 이야기 자체가 무척 흥미로운 판타지이기 때문이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영화 성공의 최종 심급은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고 싶다.
맹수진 영화평론가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치매 머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5/128/20251215517423.JPG
)
![[주춘렬 칼럼] ‘AI 3대·반도체 2대 강국’의 현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0/128/20251020518406.jpg
)
![‘주사 이모’가 사람 잡아요 [서아람의 변호사 외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3/128/20251103514866.jpg
)
![[박소란의시읽는마음] 어제와 비에 대한 인터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5/128/202512155174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