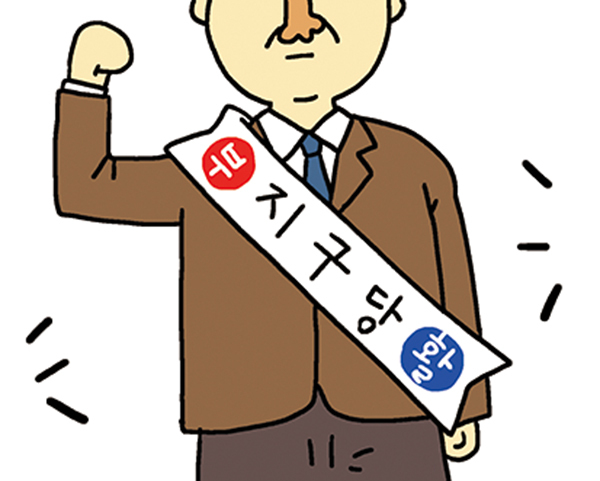
1962년 정당법 제정 때 도입된 지구당은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치된 중앙 정당의 하부조직이다. 본래 목적은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정치 신인 충원, 맞춤형 지역공약 개발 등이다. 하지만 지구당 운영에 따른 막대한 정치자금 등 그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의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 벌어지자 2004년 이른바 ‘오세훈 법’의 국회 통과로 지구당이 폐지됐다.
‘조직=표’라는 인식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지구당 폐지는 정치개혁의 상징적 조치였다. 지구당은 각종 행사, 당원 관리 등에 매달 수천만원이 필요한 고비용 정치구조의 핵심이었다. ‘돈 먹는 하마’라고 불릴 정도였다. 폐지 이후 간간이 지구당 부활 논의가 있었지만 반대 여론에 직면해 수면 아래로 잠복했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정치권에서 다시 지구당 부활 논의가 시작됐다. 총선 참패로 원외 인사가 많은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 당권 주자들이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에서 이기려면 4년간 지역 조직과 당원을 관리해야 하는데 지구당이 폐지된 후 설치된 당원협의회(민주당은 ‘지역위원회’)로는 민주당 현역 의원과 경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외 위원장들의 표심을 겨냥한 행보란 시각도 있다. 이 대표의 경우 지구당이 부활하면 권리당원의 소외감을 달래고 원외까지 장악하게 된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은 “지구당 부활 논의는 정략적이며 반개혁적”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구당이 부활하면 부패의 연결고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지구당이 부활해도 돈 선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 정치가 깨끗해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간 게 불과 3년 전이다. 지난 20년간 지구당이 없었지만 민주주의가 퇴보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국민이 불편했던 것도 아니다. 지구당 부활에 신중해야 한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한·일 여권 없는 왕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8/128/20251218518473.jpg
)
![[기자가만난세상] ‘강제 노역’ 서술 빠진 사도광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8/128/20251218518441.jpg
)
![[세계와우리] 사라진 비핵화, 자강만이 살길이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8/128/20251218518464.jpg
)
![[기후의 미래] 사라져야 새로워진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8/128/2025121851844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