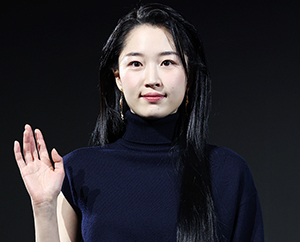어딘가로 떠나고 싶었다. 저수지에 앉아 돌을 던졌다. 돌은 물속 깊은 곳에 가라앉았다. 침묵 같은 곳. 은신 같은 곳. 물속이 아니라면 인간세계에서 불행했을 텐데. 수없이 많은 돌을 물속에 던졌다. 중력의 법칙은 우리를 안도하게 한다. 퐁당퐁당 노래를 부르며 돌을 던지던 때. 맞아보라고 던졌던 돌. 나를 봐달라고 던졌던 돌. 더이상 갈 곳 없는 징검돌 앞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다. 물속이 아니라 공중에 돌을 던진다. 던져야 부끄러워진다. 광장에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 하늘로 힘껏 돌을 던진다. 사위가 환해진다.

돌을 던진 적이 있다. 그때의 나 또한 어떤 울분으로 가득 차 있었을지 모른다. “맞아보라고”, “나를 봐달라고” 소리치듯 막무가내로 돌을 던졌을지도. 그러는 사이 여러 시련과 실패를 통과한 것 같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돌을 보면 던지거나 굴리기보다 그 작은 몸체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된다. 조심스레 쓰다듬다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도 된다. 그런 돌에서 예기치 않은 표정을 읽을 때도 있다.
“던져야 부끄러워진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물속으로, 이제는 공중으로. 계속해서 돌을 쥐고 던지는 것. 그 안간힘. 갖가지 불행에 맞서듯 던지고 또 던지는 삶의 에너지. 부끄러움 또한 그처럼 안간힘을 써낸 자의 몫일 것이다.
책상 위에 놓인 돌들을 바라본다. 어느덧 하나, 둘, 셋… 여섯. 긴 시간 그늘 속에 멈춰 있는 돌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희다. 나는 이 덤덤한 것들에게 자꾸만 말을 걸고 싶어진다.
박소란 시인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연명 의료 중단 인센티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7/128/20251217518575.jpg
)
![[세계타워] 같은 천막인데 결과는 달랐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7/128/20251217518533.jpg
)
![[세계포럼]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라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0/128/20250910520139.jpg
)
![[열린마당] 새해 K바이오 도약을 기대하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7/128/2025121751835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