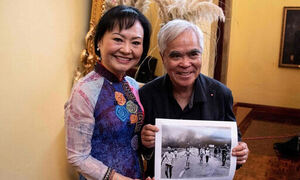사회적·경제적 배경 등 살펴
끼리끼리 결혼 비율 높아져
사회적 불평등 더욱 공고화
한때 여자의 결혼 적령기는 ‘크리스마스 케이크’와 같다는 ‘불편한 비유’가 있었다. 크리스마스이브인 24살까지는 결혼 상대자로서 계속 상한가를 그리다, 크리스마스인 25살을 지나면서부터는 예비 신부 후보로서 가치가 뚝뚝 떨어진다는 이야기였다. 한국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이 1981년 23.2세 1985년 24.1세, 1990년 24.8세를 기록했으니,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 유행했던 낡은 유머였을 법하다.
그러던 것이 요즘은 여자 나이 서른을 기준으로 ‘계란 한 판 나이네. 결혼을 서둘러야겠다’는 경고성 잔소리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는 소식이다. 물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내공(?)을 갖추긴 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다는 것이 당사자들 고백이다.

1986년 미국 잡지 뉴스위크의 표지 기사에는 “백마 탄 왕자님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제목과 함께, 대졸 독신 여성의 수가 대졸 독신 남성의 수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에 35세 독신 여성이 결혼에 ‘성공할’ 확률은 5%에 불과하다는 전망이 실렸다. 뿐만 아니라 40세 독신 여성이 결혼할 파트너를 만날 확률은 ‘테러리스트에게 공격받을 확률보다 더 낮다’고도 했다.
이 기사는 훗날 수잔 팔루디의 역작 ‘백래시’(Backlash) 안에 객관적 데이터도 없이 독신 여성을 향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반동 사례로 언급되었다. 실제로 뉴스위크 기사가 나온 직후 미국 인구통계국 소속의 인구학자가 동일한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35세 독신 여성의 결혼 확률은 41%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뉴스위크 기사만큼 대중의 시선을 끌지 못했음은 물론이다.
이제 세월이 흘러 결혼시장에도 이런저런 유형의 지각변동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평균 초혼 연령이 남녀 불문하고 30대 초중반으로 상승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단 초혼 연령의 상승이 단순히 결혼 시기를 미루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20대 초중반에 결혼하던 때는 대학 캠퍼스를 배경으로 데이트 과정을 거쳐, 때론 부모의 반대를 무릅쓴 채, 사랑하는 사람과 낭만적 결혼에 골인하는 것이 관행이자 로망이었다.
하지만 30대 초반에 비로소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 함은, 특히 여성 입장에서는 안정된 커리어 기반을 다지는 시기에 결혼 전략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비혼(非婚)을 선택하기도 하고, “괜찮은 남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며, “하향 결혼”(marrying down)을 감행하기도 한다는 것이 최근 결혼 추세를 리뷰한 논문의 결과이다.
그런가 하면 사회 전반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결혼 전략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 결혼시장 내 변화를 세심하게 추적해 온 준 카르본과 아노미 칸은 결혼시장이 계급에 따라 점차 세분화되고 있으며, 이로부터 사회 불평등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검증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1960년에는 대졸 여성의 29%가 미혼이었고, 1980년대까지는 고졸자가 대졸자보다 결혼율 및 결혼 안정성이 더 높았지만, 2000년 이후부터는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대졸 여성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알찬 결혼’을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생활 만족도 또한 고소득 남성과 고소득 여성 커플에게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혼율의 변화도 의미심장하여 1980년부터 이혼율이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대졸자 집단에서는 가파르게 감소한 반면 나머지 집단에서는 완만하게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이혼율이 다시 치솟기 시작한 상황에서도 대졸자의 이혼율은 계속 떨어져 2004년 이혼율은 1965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졸자 집단은 결혼을 상대적으로 늦게 하고, 끼리끼리 하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안정적 가족을 꾸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계급 차이에 따라 가족의 모습 또한 바뀌고 있는 미국의 결혼시장 상황은 우리네에게도 일정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계급별 “동질혼”이 강화되면서 결혼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음은 주위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25~35세 결혼관을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금수저들은 예외 없이 제 나이에 결혼한다” “나도 결혼이 로또였으면 좋겠다. 하지만 요즘은 부모 도움이 필수이기에 상견례 후 프러포즈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난다.
다만, 정부가 발표하는 혼인 연령이나 결혼 의향 등의 통계만으로는 결혼시장에서 진행 중인 역동적 변화를 포착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못내 아쉽다. 20대 N포 세대가 결혼까지 포기한다고 염려하지만, 정작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결혼율 차이를 보여주는 데이터는 발표된 적이 없으니 말이다. 결혼율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결국은 출산율 제고와 직결되는 현실이라면, 실속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혼 현황 및 추이를 정확히 진단해야만 소기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함인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골든 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5/21/128/20250521519303.jpg
)
![[세계포럼] 대통령과 ‘인간 방탄복’](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5/21/128/20250521518590.jpg
)
![[세계타워] 무책임한 감세공약이 부적절한 이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5/21/128/20250521518400.jpg
)
![[오철호의플랫폼정부] 데이터가 정책의 합리성을 담보할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5/21/128/2025052151835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