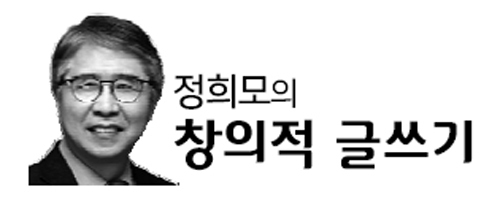
초기 기독교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어떤 주교의 독서 방식에 관한 언급이 있다. 그는 당시 유명한 주교의 곁에서 책을 읽는 모습을 쳐다보다 깜짝 놀랐다. 책을 읽는데 그 주교는 낭독하지 않았던 것이다. “책을 읽는 데 그의 두 눈이 책 위를 훑었지만 목소리와 혀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 주교는 책을 눈으로 읽고 있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크라테스의 저작들은 제자인 플라톤이 대화 내용을 기록해서 남긴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강의 내용을 그의 제자들이 받아 적게 하여 책으로 남겼다.
중세 말까지 텍스트는 문장으로 이루어진 문서가 아니라 말로 이루어진 구술이었다. 작가는 주제와 내용을 구상하여 구술하면 필경사가 그것을 받아 문자로 기록했다. 문자는 소리를 담는 기호와 같았고 시간이 지나 구술자는 소리 높여 그것을 텍스트로 복원했다. 수사학자 퀸틸리아누스는 “문자의 목적은 소리를 보존하고 있다가 그것을 맡아 두었던 물건인 양 읽는 이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소리가 되어 나오는 것만이 정신에 도달한다”고 말했다. 문자는 구술의 내용을 보존하기 위한 임의적인 기호에 불과했다.
잘 알다시피 묵독이 보편화한 것은 근대 이후의 일이다. 문자를 내면으로 읽고 의미를 음미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오래되지 않았다. 인쇄문화로 책이 보편화한 르네상스 이후에 와서야 그것이 가능해졌다. 우리도 조선 말까지 공부는 암송의 방법으로 소리 높여 외우는 것이었다. 묵독이 보편화하면서 얻는 장점도 있다. 묵독하면서 내용을 검토하고 따져보는 분석력과 비판력이 생겼다. 내면적 읽기가 시작되면서 학문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도 급격히 성장했다. 묵독은 개인의 내면화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자신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개인의 권리도 강화되었다. 여러모로 묵독은 현대 문명을 만들어 내는 밑거름의 역할을 하였다.
디지털이 보편화하면서 이제 묵독의 의미나 방법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학생들은 책을 찬찬히 읽지 않는다. 수많은 정보 더미 속에서 눈으로 훑어서 지나가지 이전과 같이 묵독하거나 정독하지 않는다. 활자는 이전처럼 기호에 불과해지고 있다. 소크라테스가 구술의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문자 언어를 극렬히 반대했듯이 우리는 이제 묵독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디지털 언어를 극렬히 반대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정희모 연세대 교수·국문학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돈바스 요새 벨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8/21/128/20250821517015.jpg
)
![[기자가만난세상] ‘진정한 사과’를 부르는 국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6/23/128/20250623517622.jpg
)
![[삶과문화] 천국보다 아름다운 음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6/12/128/20250612519673.jpg
)
![[박일호의미술여행] 교만함의 결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8/21/128/2025082151694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