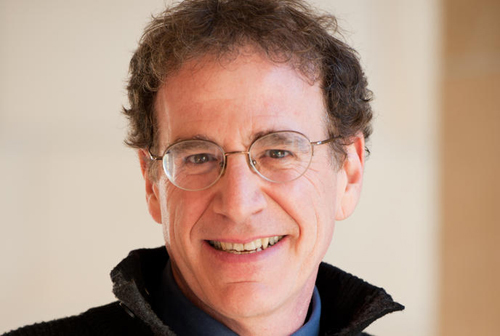
미국 노스웨스턴대학에서 학생들이 검색하는 과정을 살피는 실험을 했다. 그들은 모두 구글에 의존했고, 구글 검색창에 나오는 순서대로 신뢰도를 결정했다. 어느 누구도 웹사이트나 정보 생산자의 정보나 신뢰도에 신경 쓰지 않았다.
여러 나라의 비슷한 실험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그들은 디지털 원주민, 앱 제너레이션, N세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디지털기기에 익숙한 세대였다. 그럼에도 그 안의 정보들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활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저자 샘 와인버그(사진)는 역사가와 팩트체커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았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할 때 어떻게 정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역사가는 텍스트를 읽고 분석하는 데 익숙하므로 디지털 정보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역사가들은 제시된 웹사이트에만 머물며, 그 외 다른 정보를 찾아보려 하지 않았다. 이미 여러 번의 검증을 거친 학술지나 학술서적을 읽는 데 익숙한 역사가들의 전통적 읽기 방식이 문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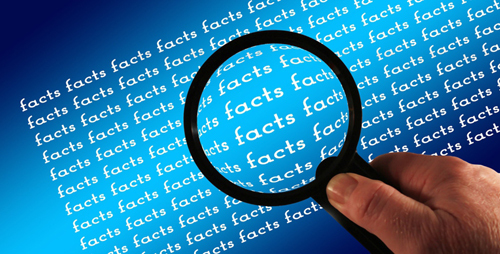
반면 팩트체커들은 실험을 시작한 지 2분여 만에 잘못된 웹사이트 정보를 적발해냈다. 제시된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정보를 비교하며 읽는 ‘수평적 읽기’ 방식으로 짧은 시간 내에 오류를 찾아낸 것이다.
이 실험은 디지털 정보를 읽어내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다면, 거짓이나 왜곡된 정보를 가려낼 수 없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세계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사고방식과 독해방식을 요구한다. 저자는 “디지털시대에 ‘역사적 사고’는 필수적이지만, 역사적 사고가 디지털시대에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미디어 해석이 접목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역사교육의 혁신이 필요한 이유가 이것이다.
학생 대부분은 인스타그램에 셀카를 올리고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왓츠앱과 트위터를 이리저리 돌아다닐 수 있다. 그렇다고 핸드폰 등에서 산출되는 정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학생들은 자판을 두드리고 화면을 클릭하는 것 너머에 디지털 세계의 방대한 지식 저장소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학생들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 결정하는 일은 간단했다. 그들은 구글에 의존했다. 학생들은 구글 검색 목록에 나온 웹사이트 순서를 신뢰도와 동일시했다. 구글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말이다. 포털 상위에 위치할수록 더 신뢰할 만한 정보라고 인식한다. 특정 링크를 왜 클릭했느냐는 질문에 많은 학생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맨 처음 나온 것이라서요.”

역사교육학자인 저자는 디지털시대를 살아갈 ‘역사적 사고’ 능력을 키울 방법을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 이 책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을 모색한다. 광고와 뉴스를 구분할 줄 모르는 디지털 원주민, 가짜 웹사이트에 속아 넘어가는 역사가들, 똑같은 문서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성직자와 과학자들….
저자는 맥락을 이해하고, 편견을 찾아내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역사적 사고’ 능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규제받지 않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거짓과 진실을 가려내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저자가 고안한 ‘역사적 사고’ 프로젝트는 현재 미국 여러 주 교육청에서 채택했고, 전 미국 교육표준에서 활용하고 있다.
정승욱 선임기자 jswoo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2/128/20251222515942.jpg
)
![[박창억칼럼] 역사가 권력에 물들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2/128/20251222515944.jpg
)
![[기자가만난세상] 또다시 금 모으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2/128/20251222515925.jpg
)
![[기고] 자동차도 해킹 표적, 정부 차원 보안 강화 시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2/128/2025122251591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