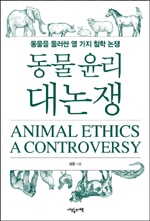
동물 윤리 대논쟁/최훈/사월의 책/2만2000원
“이성이 없는 동물에게도 도덕적 지위와 기본권이 있을까?” “육식에 반대하면 동물이 동물을 먹는 포식에도 반대해야 할까?“
‘동물 윤리 대논쟁’은 동물윤리철학자로 불리는 최훈 강원대 철학과 교수가 동물을 둘러싼 이 같은 논쟁의 철학적 답변을 구하는 책이다. 10년간의 동물 윤리 연구를 종합한 결과물이라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철학과 동물을 주제로 꾸준히 저술해온 저자는 2012년 ‘철학자의 식탁에서 고기가 사라진 이유’로 채식과 동물권에 대한 철학적인 담론의 장을 열었고 2015년 ‘동물을 위한 윤리학’으로 동물 윤리 담론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동물을 향한 대중의 관심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이 늘었다. 애완동물은 단순히 기르는 수준이 아니라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터넷포털이나 언론에서도 경쟁적으로 동물코너를 만들고 있다. 삼겹살이나 치맥이 국민 간식이나 국민회식 메뉴가 될 정도로 고기소비량은 늘었지만 한편에선 열악한 농장 동물의 현실에 대한 고발이 증가하고 있다. 채식주의도 트렌드의 하나가 돼가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에 관한 윤리적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책은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중심으로 동물에 대한 차별이 정당한지를 짚어보고 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그르다.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사람에게는 동의 없이 실험할 수 없다. 인종 차별이나 성차별은 도덕적으로 그르다. 이런 주장들에는 누구나 동의한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라는 단어 대신 ‘동물’을 넣어보면 어떨까.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게 옳지 않다고 대체로 수긍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의견이 분분해진다.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동물 실험은 관행상 허용해도 된다거나 고기 맛이 좋으니 동물을 도살해도 된다는 모순이 생겨난다. 실제 동물을 감금하는 동물원이나 수족관은 이무런 성찰 없이 인간들만의 즐거움을 위해 이들을 학대하다시피 한다. 애완동물도 보기에 따라서는 감금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저자는 “생명이 있다고 모두가 도덕적인 지위를 갖지 않지만, 적어도 고통을 느낄 줄 아는 생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도덕적인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통을 피하고 먹고 자는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른 존재들의 불필요한 간섭을 받지 않을 이익이 있다는 점에서 동물과 인간은 다르지 않다고 역설한다. 그것이 설령 동물의 이익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그것을 존중해줘야 한다. 동물의 이익이라 해서 무시하는 건 흑인의 이익이라 해서, 여성의 이익이라 해서 무시하는 차별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저자는 동물 실험을 반대한다. 동물 실험 옹호는 종 차별주의적 관행이어서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동물원의 동물이나 애완동물도 모두 감금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 역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동물은 자연 상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본래 습성을 존중받으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3조에서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고, 고통과 상해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살게 해줘야 한다고 규정하는 이유다.
책은 동물의 도덕적 지위와 기본권, 육식과 포식, 동물 실험, 동물장기 이식, 동물원과 감금, 애완동물과 공생 등을 둘러싼 논쟁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주장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상세하게 설명한다. 동물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가장 철학적인 답변서라 해도 될 듯하다.
박태해 선임기자 pth1228@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담배 소송](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5/128/20260115518642.jpg
)
![[기자가만난세상] 이 배는 여전히 테세우스 배입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5/128/20260115518568.jpg
)
![[세계와우리] 관세 너머의 리스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5/128/20260115518628.jpg
)
![[기후의 미래] 트럼프를 해석하는 우리의 자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5/128/20260115518573.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