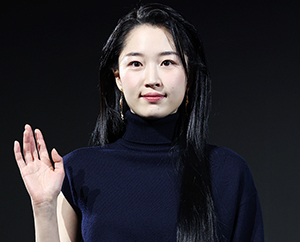이제 4월도 중순을 넘어갔다. 여름이 코앞이다. 이때쯤 즐기기 좋은 술이 바로 ‘칵테일’. 조각한 얼음과 멋진 가니쉬로 뽐낸 칵테일. 산뜻한 과실 향, 청량감 있는 탄산, 그리고 달콤한 맛의 칵테일은 봄여름을 즐기기에 좋은 술이다. 그렇다면 이 칵테일의 어원은 무엇이고 언제부터 마시기 시작했을까?
칵테일의 어원은 다양한 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수탉의 꼬리’다. 멕시코에 정박한 영국 배의 선원이 술집에 들어갔다. 그곳에선 한 소년이 나뭇가지를 써서 믹스 드링크를 만들고 있다. 선원은 그것이 뭐냐고 물었고, 소년은 수탉의 꼬리와 닮은 막대기라고 생각해 ‘코라데가조’(Cora De gallo)라고 대답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테일 오브 카크’(Tail of Cock). 즉 칵테일에 붙은 가니쉬를 설명하는 것이 칵테일의 유래다.

칵테일의 본격적인 시작은 ‘얼음의 발명’ 이후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제빙기’. 기존에는 겨울에 꽁꽁 언 강물에서 얼음을 채취했다. 제빙기를 통해 사시사철 얼음을 만들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여름에도 시원한 칵테일을 쉽게 만들 수 있었다. 또 하나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부터 시작한 ‘탄산수 시장’이다. 인도에 주재하는 영국 군인의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한 퀴닌이라는 약재가 함유된 토닉워터와 군납용 술인 진을 섞어 마시면서 ‘진토닉’이 생겼다. 그리고 미국의 바 문화가 커지면서 1차 세계대전 때 전장에 참여한 미군이 유럽에 보급했으며, 미국의 금주법(1920년~1933년) 때 일자리를 잃은 미국의 바텐더들이 유럽으로 가서 활성화시켰다. 무엇보다 진, 럼, 보드카, 위스키 등의 증류주가 19세기부터 유럽에서 더욱 발달하는데, 이러한 술은 유통기한이 없어 바텐더가 술을 보관하기도 용이했고, 따라서 칵테일도 만들기 용이했다.
흥미로운 것이 지금의 바(Bar) 문화인데, 상당히 많은 바가 지하에 위치한다. JW 메리어트 서정현 바텐더는 원래 바는 모두 1층 또는 2층에 있었는데, 미국의 금주령 시대에 몰래 술을 마시기 위해 지하로 옮겨졌다고 설명했다. 현대의 지하에 위치한 바는 이러한 금주령 시대의 문화를 나타내는 아이콘 중 하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빙기, 또는 탄산수가 유통되기 전의 칵테일 형태는 무엇일까? 칵테일의 역사를 집필한 조셉 카린은 칵테일의 본격 시작은 ‘펀치’(Punch)라고 설명했다. 17세기 영국에서 많이 마신 술 종류다. 5가지 맛이 들어 있다는 의미로 인도에서 유래했다. 한마디로 ‘5가지 과실, 향료를 넣은 음료’인 것이다. 우리말로 굳이 해석하자면 ‘화채’와 같은 성격. 당시 이 펀치를 멋진 볼(bowl)에 즐기기 위해 영국에서는 중국의 유명 도자기를 수입했고, 부를 상징하는 다양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 펀치 문화가 퍼져 결국 칵테일을 발전시켰다는 것이 조셉 카린의 주장이다. 결국 칵테일은 100% 서양의 전유물인 듯하지만, 알고 보면 동양 역사가 녹아 있는 문화상품이기도 한 것이다.
명욱 주류문화칼럼니스트
●명욱 주류문화 칼럼니스트는…
일본 릿쿄대학(立敎大學) 사회학과 졸업. 현 전통주 갤러리 부관장. SBS팟캐스트 ‘말술남녀’, KBS 1라디오 ‘김성완의 시사夜’의 ‘불금의 교양학’에 출연 중. 저서로는 ‘젊은 베르테르의 술품’이 있음.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치매 머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5/128/20251215517423.JPG
)
![[주춘렬 칼럼] ‘AI 3대·반도체 2대 강국’의 현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0/128/20251020518406.jpg
)
![‘주사 이모’가 사람 잡아요 [서아람의 변호사 외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3/128/20251103514866.jpg
)
![[박소란의시읽는마음] 어제와 비에 대한 인터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5/128/202512155174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