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보에 게재했다고 22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의 감청을 무한정 연장하도록 허용한 통비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2010년 12월 이후 거의 8년 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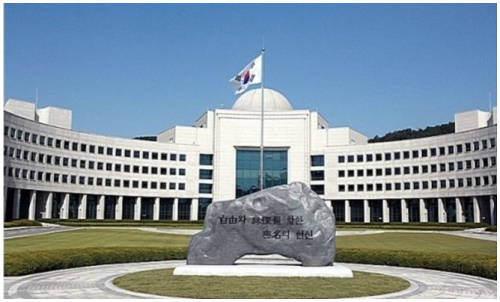
개정안은 우선 감청의 총 연장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도록 제한했다. 다만 내란·외환 등 국가안보 관련 범죄의 경우 예외적으로 3년으로 하도록 해 국가정보원의 북한 간첩 수사 등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
현행 통비법 6조 7항은 “(감청의) 허가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해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돼 있을 뿐 연장 횟수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조항을 근거로 그동안 국정원 등 수사기관들은 한 번 법원의 감청 허가를 받으면 연장 신청을 통해 무한정 수사 대상자의 통신을 감청해왔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헌재는 이같은 감청의 무한정 연장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감청을 허가하는 것은 불감청 수사 원칙에 예외를 두는 것인데, 다시 감청을 연장하는 것은 예외에 특례까지 인정한 것”이라며 “허가받은 기간 안에 범죄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다면 감청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에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하면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계기로 연말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부터 20대 국회를 상대로 본격적인 입법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 요청 시 ‘보충성’ 요건 충족을 원칙으로 삼았다. 보충성 원칙이란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과거 위치정보 추적자료’, ‘통신제한조치 대상 범죄’ 및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는 지금처럼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시에도 보충성 요건 충족을 원칙으로 하되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 및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는 현행대로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2010년 12월 통비법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11년 12월31일까지 새 입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가 입법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해당 조항들은 사실상 폐기된 상태다.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 후 거의 8년이 되도록 법률 개정에 손을 대지 않아 “입법부가 위헌 법령을 방치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전업자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1/128/20260111509892.jpg
)
![[특파원리포트] 21세기 ‘흑선’ 함대에 마주선 한·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1/128/20260111509858.jpg
)
![[박영준 칼럼] 美 국방전략 변화와 한·미 동맹 과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1/128/20260111509810.jpg
)
![[심호섭의전쟁이야기] 과감한 결단이 얻어낸 ‘전장의 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1/128/2026011150981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