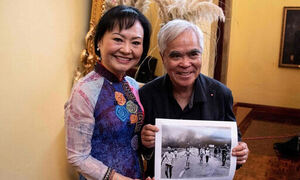|
| 그린란드 북부 빙하에 서식하는 북금곰 가족 |
지난주 CNN은 여름철에도 녹지 않던 그린란드 북부 해안의 해빙이 처음으로 녹은 모습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린란드 해빙은 지구의 마지막 빙하기였던 2만년 전 형성됐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 빙하가 최소 2만년 동안 녹지 않았고, 두께가 최대 20m가 넘어 아무리 온난화가 가속화되더라도 마지막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로 해빙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됐다.
그린란드아이스서비스의 켈 크비스트가르드 수석 고문은 “그린란드 해빙의 붕괴로 32~48㎞에 달하는 북부 해안선이 새로 드러났으며, 이는 지난 30년간 가장 큰 규모의 붕괴”라고 설명했다.
북극 빙하가 이처럼 녹은 여파는 단순히 해안선이 드러나거나 올라간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북극과 남극 등 극지방 성층권에는 영하 50~60도의 차가운 저기압성 편서풍 ‘폴라 보텍스’(Polar Vortex)가 형성되는데, 보통은 1만m 상공에서 강한 제트 기류가 폴라 보텍스를 감싸며 붙잡고 있어 극지방에서만 맴돌게 된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로 해빙이 녹고 극지방 기온이 올라가 제트 기류가 약해지면 폴라 보텍스, 즉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겨울철 극심한 혹한을 만들어 낸다. 이상기온을 유발하는 것이다. 폴라 보텍스의 남하는 2010년부터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여름철 폭염도 이와 맞닿아 있다. 북극 한파의 이상 남하로 서태평양 일대 ‘웜풀’(표층 수온이 29도 이상인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 여파로 밀려난 찬 해수가 동태평양으로 이동하면서 동·서태평양 사이의 수온 격차가 급격히 커져 지구촌 폭염의 주요 원인인 ‘슈퍼 엘니뇨’가 빚어진다.
과학 전문지 ‘공공과학도서관-의학’(PLoS Medicine)에 실린 보고서는 최근 온실 가스 배출과 준비·적응전략, 인구밀도 수준에 따른 서로 다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20개국 412개 지역에서 2030년 이후 폭염 관련 사망자 수를 추정했다. 그 결과 필리핀은 2031∼80년 들어 1971∼2020년 대비 하루 평균 사망자 수를 초과한 ‘초과 사망자’가 12배에 달했다고 한다. 호주와 미국은 같은 기간 각각 5배, 영국은 4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
| 중국의 플라스틱 쓰레기 매립지 |
이처럼 지구 온난화는 더 이상 과학자들만의 우려가 아니며 현실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와 석유제품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저감활동 및 사용금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특히 토양과 해양에 버려진 플라스틱, 비닐 등 석유제품이 미세하게 변하여 땅과 해양을 오염시켜 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기상학회(AMS)와 미국립해양대기국(NOAA)은 지난해 전 세계의 온실 가스 배출량이 최고 수준에 달했는데, 특히 이산화탄소와 메탄, 이산화질소 등 3대 온실 가스의 방출량이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 중 이산화탄소 증가율은 1960년대 초반 이후와 비교하면 4배에 달했다고 한다. 이러한 온실 가스 증가에는 버려진 플라스틱과 비닐이 매우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되었다.
전 세계가 매년 생산하는 플라스틱 양은 3억3000만t이나 된다.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생산량을 다 모으면 83억t에 이르는데, 이는 세계적인 마천루를 자랑하는 미 뉴욕 맨해튼을 3.2㎞ 깊이로 묻어버릴 수 있는 양이다. 심지어 그동안 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은 9%에 그치고 있으며, 79%는 방치돼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 현 추세대로라면 2050년까지 폐기되는 플라스틱 규모는 약 120억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버려지는 플라스틱 중 해마다 약 1200만t은 바다로 흘러가는데,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는 분해되지 않고 바다를 떠다닌다. 햇볕에 의해 쪼개지더라도 미세 플라스틱 덩어리로 남게 된다고 한다. 현재 해양에는 약 5조개의 플라스틱이 돌아다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지구를 약 400바퀴 감을 수 있는 양이다.
 |
| 태평양에 형된 플라스틱 쓰레기섬(태평양 대쓰레기장·GPGP)의 1호로 발행된 앨 고어 미국 전 부통령의 여권 |
심지어 해류가 서로 모이는 태평양 한가운데 이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모여 ‘섬’을 만들었다. 약 1조8000억개의 플라스틱으로 형성된 섬인데, 크기가 남한 면적의 15배이다. 섬의 이름은 ‘태평양 대쓰레기장’(Great Pacific Garbage Patch)을 의미하는 영어 약자 GPGP로 불린다. 환경운동가들이 이 섬을 유엔 국가로 인정해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섬에서는 국기와 화폐, 우표, 여권이 발행됐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이 섬의 1호 국민으로 등록되었다.
파리기후변화협정 이행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석유제품과 플라스틱을 제한하는 정부 정책이 본격 시행돼 제조 및 소비자 업계에서도 대대적인 사용량 줄이기 방안을 찾고 있다.
친환경 원료인 BIO-PP로 제작된 친환경 용기를 쓴 도시락이 출시되었으며, 코코넛 껍질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소재 용기로 만든 도시락도 등장했다. 택배 상자와 포장용 비닐백을 친환경 소재로 교체하는 기업도 있다. 그럼에도 이런 캠페인은 쏟아지는 폐플라스틱에 비해 아직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1인당 연간 420장 정도의 비닐 봉지를 쓰고, 100㎏에 이르는 플라스틱을 소비한다. 2013년까지만 해도 세계 5위 소비국이었는데, 지금은 1위권으로 알려져 있다.
플라스틱 산업의 유럽 연맹체인 플라스틱유럽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플라스틱 제품의 39.9%는 포장재라고 한다. 즉 우리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분야에서 플라스틱이 대량 소비되고 있는 셈이다. 생산업체와 기업들의 노력과 동시에 소비자인 국민 인식도 함께 변화해야 하는 이유다. 다행히 일반인들의 환경 인식은 매우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편이다.
그 시급성에 비해 매우 늦은 시기긴 하지만, 2015년부터 시작된 유엔 SDGs(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와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지구 온난화에 가장 직접적인 대안과 해결책을 촉구하는 전 세계적 약속이다. 유엔 회원국 193개국뿐 아니라 비회원 2개국도 참여한, 그야말로 ‘인류의 지구 구하기 대협정’이다.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아직 이 협정에 대한 이행 속도가 더딘 편이다. 특히 우리 기업들의 참여는 전 세계 최하위권에 속한다. 3년 안에 친환경·SDGs·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이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아마 글로벌 시장 어느 곳에서도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그만큼 글로벌 정부 정책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선택도 함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탓이다.
김정훈 UN지원SDGs한국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UN지원SDGs한국협회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 기구입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골든 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5/21/128/20250521519303.jpg
)
![[세계포럼] 대통령과 ‘인간 방탄복’](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5/21/128/20250521518590.jpg
)
![[세계타워] 무책임한 감세공약이 부적절한 이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5/21/128/20250521518400.jpg
)
![[오철호의플랫폼정부] 데이터가 정책의 합리성을 담보할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5/21/128/2025052151835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