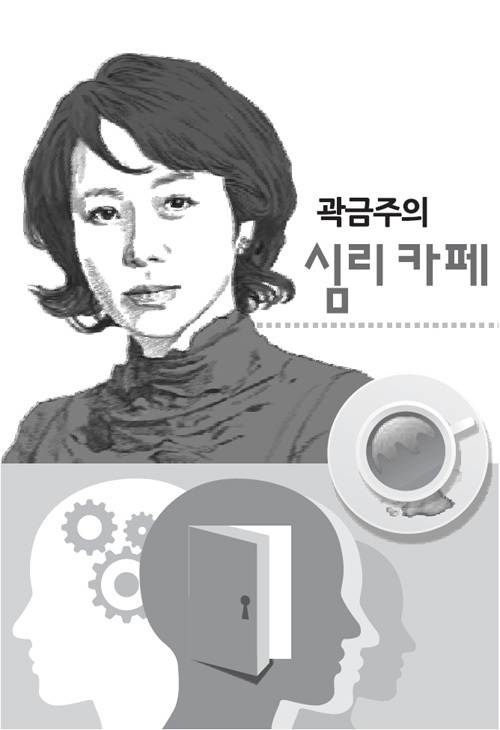
실제로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준다. 자신이 잘 하고 있음에도 보상이 다른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불공평한 상황에서 뇌를 촬영한 결과 분노와 고통을 느끼는 부위가 활성화됐다. 아마도 인간은 불공평을 기피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진화심리학적으로 볼 때 원시사회에서 인간은 제한된 자원을 나눠야 했고, 이때 공평성을 따져야 했을 것이다. 그 당시 음식을 구하기가 어려웠고, 사냥이나 채집을 통해 구한 음식을 따로 보관할 수가 없었기에 남은 음식을 집단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 이 과정에서 음식을 나눠 받은 사람은 이후 자기가 획득한 음식을 다시 나눔으로써 공평한 교류가 이뤄졌다. 이때 공평하게 교류하지 않고 자신의 몫만 챙기는 사람이 분명 있었을 것이고, 이들을 찾아내 따지는 것이 생존에 도움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도 인간은 한정된 자원을 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때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나눌 것인지 아니면 형평성에 맞게 분배할 것인지가 다르다. 얻은 이득을 꼭 같이 모든 구성원이 같게 나누는 것은 공평이다. 여러 요인을 고려해 형평성에 따른 분배는 공평이 아니라 공정이다.
1980년대 이뤄진 공평과 공정에 관한 한 심리학 연구가 있다. 정해진 파트너와 함께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수행 정도에 따라 돈을 보상으로 받을 것이라고 참가자에게 이야기해줬다. 그리고 과제를 마친 후 실험 참가자들은 수행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고, 자신의 파트너에게 받은 돈을 나눠 줘야 했다.
이때 어떤 식으로 분배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공평하게 반으로 나눠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수행에 기여한 정도를 따져가며 의논해서 달리 돈을 나누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서양인과 동양인이 차이가 났다. 동양인은 평등 지향적인 공평 분배를, 서양인은 공정 분배를 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공평에 의한 평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아닌지 싶다.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부분에서 다 공평해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하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은 어떤지를 늘 주시하며 지나친 비교를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불만이 생기고 상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된다. 좀 더 개개인의 노력, 능력, 처한 상황을 고려해주는 넉넉함이 필요하다. 혜택이 큰 만큼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 또한 크게 만드는 장치도 필요하다. 그렇게 좀 더 공정한 사회로 도약하는 새해가 됐으면 한다.
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탈모보다 급한 희귀질환 급여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5/128/20251225508091.jpg
)
![[기자가만난세상] ‘홈 그로운’ 선수 드래프트 허용해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5/128/20251225508065.jpg
)
![[세계와우리] 줄어든 도발 뒤에 숨은 北의 전략](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5/128/20251225508090.jpg
)
![[조경란의얇은소설] 타자를 기억하는 방식](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5/128/2025122550807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