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황룡사지 치두 |
 |
| 여야정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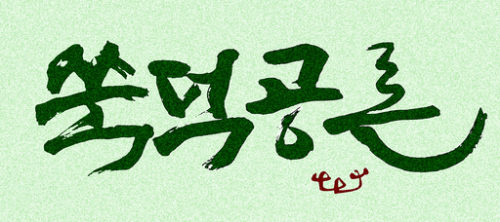
‘무리 당(黨)’은 상(尙)과 흑(黑)이 위아래로 합하여 이루어진 글자인데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선 ‘높을 상(尙)’은 ‘숭상하다, 꾸미다, 더하다’ 등의 뜻이 있다. 위의 두 점은 학자에 따라 이론이 많지만 나는 솔개 머리 곧, 치두(?頭, 망새)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왕궁이나 사찰 등의 용마루 양쪽 끝에 높게 부착하여 위엄을 나타내는 것을 치미(?尾)라고 하는데 어딜 보나 ‘꼬리 미(尾)’ 자는 어울리지 않는 듯하다. 기왓장이 날개라면 치두는 새의 머리일 것이고, 기왓장이 비늘이라면 치두는 물고기 머리일 것이다. 경주 황룡사 치두는 높이 182cm, 너비 105cm로 동양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
| 새끼 |
‘검을 흑(黑)’의 초기 형태를 보면 사람의 얼굴에도 네 개의 점, 몸에도 네 개의 점이 찍혀 있다. 이는 온몸에 문신을 한 사람의 모습으로 ‘묵형(墨刑)을 당한 죄수들이나 문신을 한 부족’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무리’의 뜻이 나온다.
따라서 ‘당(黨)’이란 ‘높은 무리’의 뜻으로 벗처럼 뜻을 같이하는 무리는 ‘붕당(朋黨)’이고, 정치적 목적을 같이하는 무리는 ‘정당(政黨)’이라 할 수 있다.
여당(與黨)이란 정당정치에서 현재 정권을 잡은 정당을 말하는데, ‘여(與)’는 우리말 ‘여럿’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여(與) 자의 가운데 있는 여(?)는 ‘꼬인 새끼줄’ 모양으로 우리말 ‘새끼’(고어 ‘삿기’)는 ‘새끼 삭(索)’과 관련이 있다. 꼰 새끼를 연결하거나 묶으려면 끄나풀을 찾아야 하므로 동사로는 ‘찾을 색(索)’이 된다.
여(與)에서 여(?)를 제하면 ‘이쪽의 두 손과 맞은편의 두 손’만 남는데, 이 글자가 ‘마주들 여(?)’이다. 따라서 ‘여(與)’는 함께 새끼를 꼬는 모습에서 ‘무리, 동아리, 편들다, 주다’ 등의 뜻으로 의미가 확장된다. 여(與)에 손을 하나 더하면 ‘들 거(擧)’, 20명[스무 입(卄)]이 손을 바치면 ‘함께 공(共)’이 된다. 이 외에도 ‘갖출 구(具)’, ‘키 기(箕)’, ‘두루마리 권(卷)’, ‘책 전(典)’, ‘받들 봉(奉)’ 등의 많은 글자에 두 손이 나타나고, 여론조사(輿論調査)라고 할 때의 ‘수레 여(輿)’는 두 사람이 수레를 끌고 가는 모습이다.
여당이란 국회의원 수가 많은 정당을 가리킬 것 같지만, 이번처럼 ‘여소야대(與小野大)’라는 말이 있는 걸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니다. 여당은 정부의 편을 들어 그 정책을 지지하는 정당으로 대통령중심제의 경우 국회의원 수와 상관없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여당이 되는 것이다.
그럼 ‘야(野)’는 어떤 뜻인가. 야(野)의 본자는 ‘야(?)’로 갑골문에서는 숲 속에 남근석이 뻘쭘하게 서 있는 야한 형태였다. ‘야(野)하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유래했는데 요즈음은 영어의 영향으로 ‘sexy하다’는 말이 우세하다. 밤도 ‘야(夜)’하지만 대장간에서 쇠를 녹이는 모습은 더욱 ‘야(冶)’하다. 야한 장면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끌림에서 ‘이끌 야(惹)’가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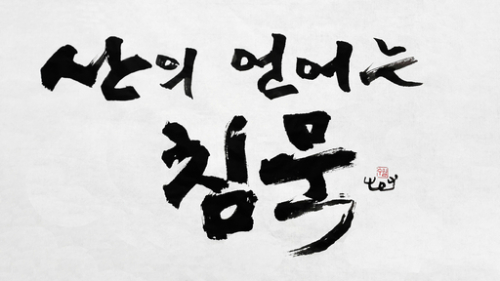
좌우지간 정당정치에서 여당(與黨)은 정권을 지지하는 정당이고, 야당(野黨)은 재야당(在野黨)의 준말로 집안에서 정권을 담당하지 못하고 들에 나앉은 정당이다. 그렇다면 야당끼리 야합(野合)이라도 해야 하나?
절묘한 3당 구조의 탄생! 공약(空約)이 아닌 공약(公約)을 잘 지키려면 공론(空論)이 아닌 공론(公論)을 잘해야 한다. 탁상공론(卓上空論) 대신에 쑥덕공론(公論)을 잘하시란 말씀. 밤낮 먹탱이끼리 이렇게 쑥덕공론만 해 봤자 남는 건 빈손뿐이다. 먼지 털고 산에나 오를까. 주말이라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다. 청명절 봄 산의 언어는 침묵이지만 야(野)하다. 여(與)는 집안에서 쑥덕공론하며 새끼 꼬고 있겠지.
권상호 서예가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전업자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1/128/20260111509892.jpg
)
![[특파원리포트] 21세기 ‘흑선’ 함대에 마주선 한·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1/128/20260111509858.jpg
)
![[박영준 칼럼] 美 국방전략 변화와 한·미 동맹 과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1/128/20260111509810.jpg
)
![[심호섭의전쟁이야기] 과감한 결단이 얻어낸 ‘전장의 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1/128/2026011150981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