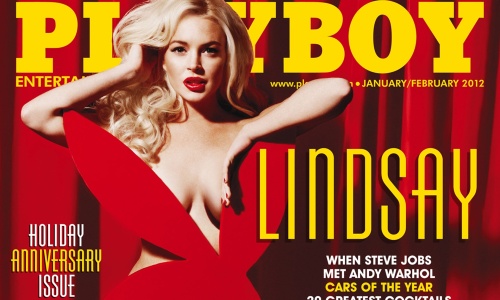

일견 타당한 분석이다. 플레이보이가 지난 62년 간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운 ‘소프트 포르노’는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됐다. 한때 560만부 팔렸던 이 성인잡지를 구매하는 어른은 80만명도 사보지 않는다. 플레이보이 역시 미 뉴욕타임스나 영국 가디언, 한국의 일간지가 10여년 전부터 매달려온 ‘21세기 생존 전략’이라는 화두에 대한 나름의 답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종이매체 종사자로서 씁쓸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인 셈이다. 그래도 찝찝함은 남는다. 디지털 시대 종이매체가 더 이상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난 100여년 간 이들 매체가 쌓은 사회문화적 가치마저 폄훼돼야 하는가라는 이유에서다.
일간지 가디언이 14일(현지시간) ‘노출의 역사: 플레이보이의 검열은 중세로의 회귀다’(www.theguardian.com/media/2015/oct/14/playboy-abolishes-nude-defeat-art-history)는 제하 기획물을 보도했다. 플레이보이의 누드사진 미게재 선언이 미디어산업 맥락에서가 아닌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고찰했다. 조너선 존스 가디언 미술전문기자가 쓴 기사인데, 플레이보이의 폭탄 선언을 둘러싼 세계 주류 언론들의 평가가 너무 상업적 측면에 쏠려 있는 데 대한 안타까움이 짙게 묻어난다. 존스 기자는 “많은 이들이 한때 ‘성(性) 자유화’의 상징이었던 잡지가 인터넷 시대를 따라잡지 못해 소프트포르노 비즈니스 굴레를 벗어던지려 한다며 찬사를 보낼 것”이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간다.

기자로서 다소 상투적인 리드문장을 쓴 셈인데 복선은 깔았다. ‘어떠한 이상적인 페미니스트적 이유는 없이’. 존스 기자에 따르면 플레이보이의 이번 누드사진 포기는 여성의 나체를 죄악시한 중세의 시대정신과 맞닿아 있다. 종교가 모든 정치사회적 규율을 통제했던 중세 시대, 여성의 몸은 예술작품에서도 절대 표현하지 말아야 할 사악함의 총체였다. 대표적인 게 독일 화가 한스 발둥 그린(1484~1545)의 ‘나이듦과 죽음’이다. 발가벗은 맨 왼쪽 여성이 점차 나이가 들어 썩어가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존스 기자는 “아름다운 육체는 찰나이며 몸은 비도덕적”이라는 여체에 대한 당대의 인식이 여실히 드러난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여성을 악마화하는 당시 예술 경향은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변화의 조짐을 보인다. 이탈리아 화가 티치아노 베첼리오(1488∼1576)나 페테르 파울 루벤스(1577∼1640)는 여성 나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특히 신화 속의 비너스가 아닌 베네치아의 귀부인을 모델로 한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는 육체의 아름다움을 한껏 살렸다는 평가다. 루벤스는 신화나 종교적 인물 대신 아내를 모델로 했다. 통통하게 살이 붙은 허벅지와 엉덩이를 여과없이 담았다. 그래도 아쉬움은 남는다고 존스 기자는 촌평했다.

여성에 대한 막연한 종교적 적개심은 상당히 희석됐지만 여성을 욕망의 대상으로 상품화하는 가부장적 시선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여체는 아름다웠지만 그림 속 여성들은 ‘궁정연애’(고도로 형식화된 남녀 관계)처럼 기사들의 경애를 즐기고 갈구하는 수동적 대상으로 그려졌다. 예술작품 속 여성의 나체는 근현대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억압과 통제를 벗어날 수 있었다. 에두아르 마네(1832~1883)와 앙리 마티스(1869~1954), 파블로 피카소(1881∼1973) 등의 작품이 대표적이다. 마네는 ‘올랭피아’라는 작품에서 창녀의 섹슈얼리티를 표현했고, 피카소의 ‘누워있는 여성 누드’는 남성의 시선과 무관한 여성 스스로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여성 누드에 관한 서구 미술사를 개괄한 존스 기자는 기사 말미에 깔아놨던 복선을 본격화한다. 플레이보이 푸념처럼 21세기는 할리우드 여배우 킴 카다시안이 언제 어디서고 셀카를 찍어 자신의 몸을 찬미하는 시대가 됐다. 유명 연예인 뿐만이 아니다. 일반인들 또한 각종 SNS를 통해 셀카를 찍어 상대의 평가를 기다린다. 고대 그리스나 르네상스, 춘화가 일반화된 근대 일본처럼 여성의 나체가 아무런 거리낌이나 부끄러움 없이 자랑하거나 찬사를 받는 시대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앞서 피카소와 마티스가 나체를 주로 그렸던 때는 여성 참정권 요구가 빗발치던 시기와 겹쳤다.

이같은 사회 현상은 근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화한 도시문명의 확장 버전이자 실험적 시도라고 존스 기자는 강조했다. 예술사를 살펴보건대 나체 이미지는 누군가를 억압하는 최선의 방법이 돼왔고 누드화를 두려워하고 억압하는 문화는 종교적으로 완고하거나 여성을 통제 또는 두려워했던 암흑기였다는 것이다. 그는 “플레이보이의 누드사진에 대한 억압은 (상업적 측면이 아니라) 어찌보면 인류 정신과 자유에 대한 패배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나체로 대변되는 여성성이 아무런 사회 제약이나 편견 없이 그 자체로 빛을 발하던 시대로 넘어가던 차에 성인잡지가 건전한 언론의 역할을 들이밀며 누드사진을 없애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2/128/20251222515942.jpg
)
![[박창억칼럼] 역사가 권력에 물들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2/128/20251222515944.jpg
)
![[기자가만난세상] 또다시 금 모으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2/128/20251222515925.jpg
)
![[기고] 자동차도 해킹 표적, 정부 차원 보안 강화 시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2/128/2025122251591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