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미지에서 온 소식’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한다면? 철학자 스피노자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다. 하지만 위대한 철학자가 아닌 범인들은 한가롭게 사과나무를 심고 있을 마음의 여유를 가지기 어렵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소멸하는 마지막 순간,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문경원·전준호는 종말의 순간, 예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떠올렸다. 예술의 역할과 의미를 찾는 프로젝트 이름은 ‘미지에서 온 소식(News from Nowhere)’. 두 사람은 이 프로젝트로 올해 독일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미술전 카셀 도쿠멘타에 백남준(1977)·육근병(1992)에 이어 한국 작가로는 세 번째로 초청을 받았다. 9월에는 2012광주비엔날레 대상인 ‘눈 예술상’을 수상했으며, 이달 5일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선정한 ‘2012 올해의 작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
| ‘미지에서 온 소식’ 프로젝트로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한 문경원(오른쪽)·전준호 작가. |
문경원·전준호는 마흔세 살 동갑내기 친구사이다. 2007년 한 전시장에서 처음 만났다.
“평소 작가들끼리는 서로 작업에 대해서 칭찬해주는 형식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특이하게 이야기가 잘 통해서 솔직한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그 당시 미술계에 굳어진 여러 문제점에 많이 지쳐 있었는데 이런 고민도 통했고요.”(문경원)
아무리 잘 통해도 주관이 뚜렷한 작가들이 함께 활동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지 않을까.
“서로 다른 점을 보완해주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경원씨는 굉장히 진지해요. 공통된 이슈나 주제가 정해지면 아주 면밀히 검토하거든요.”(전준호)
“준호씨는 성격이 급한 대신 추진력이 있어요. 사람이 생각이 있어도 실천을 못하는 지점이 많은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실천적 요소를 만드는 역할을 했어요.”(문경원)
물론 싸울 때도 있다. 하지만 미술이라는 교집합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미적 취향이 똑같아요.”(전준호)
“예술가는 고집이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치를 보기 때문에 작업이 가능했어요.”(문경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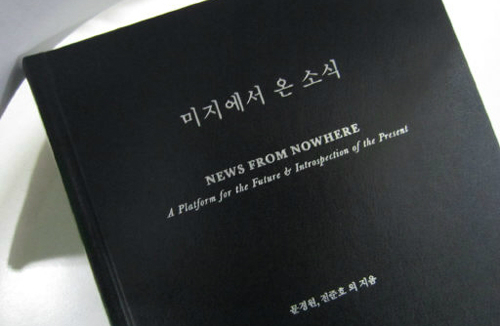 |
| 문경원·전준호 작가가 예술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책 ‘미지에서 온 소식’. 영문으로 먼저 출간돼 카셀 도쿠멘타에서 첫선을 보였으며, 한국어판은 지난달 말 출간됐다. |
‘미지에서 온 소식’은 1890년 시대의 몽상가였던 윌리엄 모리스가 저술한 동명의 책에서 이름을 따왔다. 모리스는 자신이 살던 시대로부터 250년 후 런던의 모습을 꿈꾸고 돌아와 이 책을 썼다. 닷새간 꿈속에서 본 미래의 모습은 빈곤과 불평등이 해소된 전원적인 공동체였다.
문경원·전준호가 설정한 ‘미지’는 사회의 모든 가치와 질서가 사라져버린 종말의 시대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3년 동안 기후·자연환경·사회·경제 등 모든 것이 급변하는 오늘날 예술의 미래가 무엇인지 물었다. 답을 찾기 위해 1960년대 실험음악에서 현재 일본 도호쿠 지역의 재건 사례까지 다양한 경로를 모색했다.
고견을 듣기 위해 각 분야의 석학들도 찾았다. 최재천, 고은, 이창동, 조정환, 이토 도요, 에릭 쿠, 이치야나기 도시 등이 이들과 함께했다. 이창동 영화감독은 작가들이 설정한 미래를 듣고는 “그때에도 꽃이 존재하느냐”고 되물었다. 이 감독은 꽃이 있다면 어떻게 생겼는지, 여전히 아름다운지 궁금해했다. 예술의 의미를 묻자 “종교가 유한함에 대한 대답이라면 예술은 유한함에 대한 질문이다. 저녁놀처럼 그냥 사라지고 마는 어떤 것,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묻는 게 예술”이라고 답했다.
 |
| 종말 직전의 남자 예술가와 종말 후 신인류로 살아남은 여자 예술가의 이야기를 다룬 문경원·전준호 작가의 단편 영화 ‘세상의 저편’. |
문경원·전준호 작가의 작품 핵심은 결과가 아닌 과정에 있다. 이들이 예술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은 ‘미지에서 온 소식’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됐다. 작가들이 석학과의 만남을 통해 수확한 주옥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들은 단편영화 ‘세상의 저편(el Fin del Mundo)’도 만들었다. 영화는 종말 직전의 남자 예술가와 종말 후 신인류로 살아남은 여자 예술가의 이야기다. 남녀 듀얼 채널로 촬영한 것을 여자 싱글 채널 위주로 재편집하여 진화한 인류의 형태를 보여주고자 했다. 영화 촬영을 위해 건축가·디자이너·과학자들과 협업했다. 남녀 주인공은 배우 이정재와 임수정이 맡았다.
이들은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의 ‘정답’이 아닌 ‘희망’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예술가들은 자신이 세상을 위해 뭔가를 한다는 망상가들이라는 자괴감이 있었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토 도요는 지진해일(쓰나미)로 폐허가 된 도시를 방사능 보호장구도 없이 찾아가 재건축을 위한 도시계획을 세워요. 개인적인 영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건축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세상에 낭만적 과대망상주의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전준호)
정아람 기자 arbam@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탈모보다 급한 희귀질환 급여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5/128/20251225508091.jpg
)
![[기자가만난세상] ‘홈 그로운’ 선수 드래프트 허용해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5/128/20251225508065.jpg
)
![[세계와우리] 줄어든 도발 뒤에 숨은 北의 전략](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5/128/20251225508090.jpg
)
![[조경란의얇은소설] 타자를 기억하는 방식](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5/128/2025122550807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