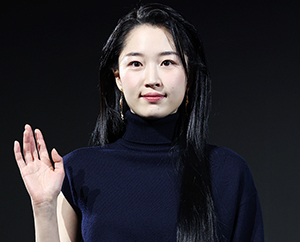“주한미군 장병들은 근무를 함에 있어서 전투를 모든 사고의 중심에 두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항상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이를 지켜보면서 많이 배웠지만 앞으로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주한미군 장병들은 근무를 함에 있어서 전투를 모든 사고의 중심에 두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항상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이를 지켜보면서 많이 배웠지만 앞으로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안광찬(사진)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장은 군에 몸담고 있던 시절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차장 및 부참모장 등을 역임하며 주한미군과 5년 이상의 오랜 기간 업무를 같이 해온 경험을 토대로 이같이 말했다.
안 전 실장은 “한국군이 세계 최강, 최첨단인 미군으로부터 군의 현대화·선진화에 큰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한국군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행정이 틀을 갖추기 전에는 정부가 본보기로 삼을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행정조직이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철저한 업무중심, 공과 사의 구분 등 서구적 사고방식과 전투 승리라는 목표에 집중하는 모습은 인상이 깊었다고 그는 전했다.
안 전 실장은 “한·미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는 주한미군사령관부터 한 명의 전사(戰士)로서 근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이들은 직업 군인으로서 ‘자나 깨나 북한이 전쟁도발 시 어떻게 한반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적을 격퇴할 것인가’만 생각하고 있다는 철저함이 느껴졌다”고 회고했다.
주한미군 주둔 60년의 기간 동안 빛이 있다면 그림자도 있는 법. 한국군이 따라야 할 모델이었지만 한국군이 지나치게 주한미군에 의존하는 타성이 생겼다는 자성이 이어졌다.
안 전 실장은 “60년간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미군이 알아서 우리 안보를 지켜준다’는 안일한 생각도 갖게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며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짜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제한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국 근무를 경험한 미군들은 대부분 ‘친한파’가 된다고 안 전 실장은 전했다. 예를 들어 로버트 리스카시 전 사령관(1990∼1993년 재임)이나 존 틸러리 전 사령관(1996∼1999년 재임)은 한국을 떠난 뒤에도 미국에서 한국과 한·미동맹을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 중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안 전 실장은 “주한미군들은 한국의 눈부신 발전상에 감탄과 보람을 느끼고 떠날 때는 대부분은 좋은 감정을 가진다”면서 “하지만 우리 일각의 반미 감정은 이들이 동맹의 연합방위에 참여했다는 자부심에 상처가 된다”고 안타까워했다.
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치매 머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5/128/20251215517423.JPG
)
![[주춘렬 칼럼] ‘AI 3대·반도체 2대 강국’의 현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0/128/20251020518406.jpg
)
![‘주사 이모’가 사람 잡아요 [서아람의 변호사 외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3/128/20251103514866.jpg
)
![[박소란의시읽는마음] 어제와 비에 대한 인터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5/128/202512155174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