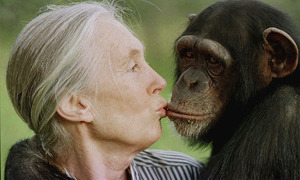북한이 다양한 종류의 신무기를 선보이며 대남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10일 열릴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신무기가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5일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가 개최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진화하는 극초음속미사일
사진에는 화성-11마라고 적힌 글라이더형 극초음속 활공체(HGV) 탄두가 장착된 미사일 2기가 발사차량(TEL)에 탑재된 것이 드러났다. 화성-11형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의 북한 제식 명칭이다.
KN-23은 종말단계에서 요격을 회피하는 풀업 기동을 할 수 있다. 풀업 기동을 위해 비행거리도 기존 단거리 탄도미사일보다 늘어나서 최대 800㎞를 넘나든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 영토에서 우크라이나 내륙 표적을 향해 발사됐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성능개량에 힘입어 정밀도가 크게 향상됐다.
실전에서의 검증을 마친 상황에서 HGV를 탑재한 것은 지상 방공망의 요격 시도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킨잘 극초음속미사일은 우크라이나군 패트리엇(PAC-3)의 요격 시도에 직면하고 있다. 비행 종말 단계에서 요격회피 기능이 있는데도 격추율이 37%에 달했다.
이들 미사일은 종말단계에서 요격회피기동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속도가 감소한다. 킨잘의 경우엔 속도가 마하 3을 약간 웃돌 수준이다. PAC-3가 요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러시아군은 이스칸데르와 킨잘의 유도 소프트웨어를 개량, 종말단계에서 지그재그 또는 급강하 비행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행 경로와 요격회피기동을 바꿨다. 이에 따라 PAC-3의 요격 성공률은 크게 감소했다.
북한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토대로 기존에 수 차례 시험발사했던 HGV 탄두를 KN-23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한·미 연합군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돌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화성-11마를 한국군이 막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지상 레이더 기지나 지대공미사일 포대에선 표적과 요격탄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사전에 정밀하게 예측한 뒤, 요격을 시도한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활공 및 변형 기동을 통해서 이같은 절차를 무력화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서 전반적인 교전절차를 빠르게 하면서 항적정보를 일선 포대에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면 요격률이 높아진다.
현재 개발중인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Ⅲ가 전력화되면 기존 PAC-3 등을 통해 요격이 가능하다.
다만 한국군 KAMD 작전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초소형위성체계 등의 감시정찰 자산 확보를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발이 완료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도 미사일방어망을 두텁게 하는 효과가 있다.
L-SAM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L-SAMⅡ 중에서 풀업기동을 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활공단계 요격유도탄 개발은 기술적 난도가 높다. 핵심기술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사일·드론·재래식 무기도 선보여
러시아산 3M-54E 순항미사일과 유사한 초음속 순항미사일도 전시회에 등장했다.
3M-54E는 종말 단계 속도가 마하 2.9에 달하는 무기다. 북한이 기존에 개발했던 대함미사일보다 성능이 향상된 것이다. 실제 전력화 과정을 거쳐 최현급 구축함 등에서 운영하면 한국 해군에 일정한 위협이 될 전망이다.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했던 ‘북한판 스트라이커’ 차륜형장갑차도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였다.
차체 뒤쪽에 대구경 박격포를 탑재한 자주박격포가 그것이다. 미국산 스트라이커 장갑차도 120㎜ 박격포를 탑재한 M1129가 있는데, 북한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자주박격포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장갑차 차체에 주포와 포탑을 얹은 것도 등장했다. 120㎜ 주포 탑재 이탈리아산 센타우로 장갑차와 유사한 형태의 모형이 지난해 공개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포탑 크기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다양한 종류의 무인기도 등장했다. 한국군의 소총사격드론과 유사한 형태의 드론은 RPG-7 로켓 및 폭탄과 함께 놓여있었다. 폭탄을 사용해서 지상 폭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분·소·중대급 지상부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쿼드콥터형 드론과 자폭드론도 대거 등장했다. 지상작전에서 드론 사용을 확대하려는 북한군의 의도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러시아산 지대공미사일체계 소스나(Sosna)와 비슷한 무기도 등장했다.
2018년 처음 공개된 소스나는 MT-LB 궤도형 장갑차 차체에 요격미사일 12발을 설치한 형태다. 사거리 10㎞, 요격고도 5㎞로 순항미사일, 항공기 등을 요격한다.

소스나는 러시아 해군의 근접방어체계(CIWS)인 팔라시를 지상형으로 만든 것이다.
팔라시는 기관포 2문과 대공미사일 8기를 탑재한 채, 아군 군함에 접근하는 미사일 또는 항공기를 최대 15㎞ 거리에서 요격한다. 소스나는 기관포를 제거하고 미사일을 늘린 형태다.
북한은 최현급 구축함에 러시아산 최신 CIWS인 판치르-ME를 탑재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러시아의 무기개발 사례를 본 떠서 판치르-ME를 지상형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지대공미사일 체계를 새롭게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전술유도미사일 발사용으로 추정되는 2연장 발사차량, 소형 로켓 또는 자폭드론 6발을 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발사대를 탑재한 소형전술차량도 모습을 드러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주한 美 7공군 사령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2/128/20251002516817.jpg
)
![[기자가만난세상] 슬기로운 명절 에티켓](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2/128/20251002516599.jpg
)
![[세계와우리] 경주 에이펙과 실용외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2/128/20251002516808.jpg
)
![[조경란의얇은소설] 달을 보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2/128/202510025165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