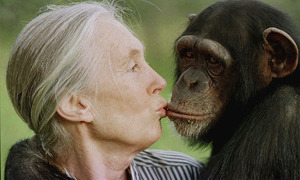신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 같다니
가족과 고향 떠나온 사람들에게
조금 더 그립고 쓸쓸한 보름달
얀 마텔 ‘머리 위의 달’(‘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기억해’에 수록, 윤진·홍한별 옮김, 민음사)
어떤 소설을 읽다가 이건 작가 자신이 겪은 진짜 경험에서 출발했고 소설의 화자도 그 작가로 짐작되는 순간이 있다. 보여주려는 인물과 이야기를 쓴 이유가 명확해 보일 때. 단편 ‘머리 위의 달’을 읽으면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다. 작가 얀 마텔이 이러한 유사 경험을 한 듯했고 소말리아계 캐나다인인 남자로 대변되는 한 인물이 왜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를 독자에게 보여주고 싶어 한 거라고. 오독일 수 있어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단편이었다면 그런 짐작은 하지 않았을 것 같다.

이 단편의 화자는 일인칭 ‘나’인데 직업은 작가이며 캐나다인이다. 얀 마텔처럼. 뒷마당에 있는 작업실에서 새 작품을 집필 중이다. 스키 활강을 좋아해 본 적이 없는데 아내는 해마다 겨울이면 친구들과 같이 가는 스키 여행을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때는 작업을 중단하고 아내를 따라나선다. 이번에는 로키산맥으로 스키를 타러 갔다. 사흘째, 나는 자유 시간을 얻어 카페로 피신했다. 카페는 리조트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휴식 공간이었고 나는 모처럼 생긴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하고 싶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 “밤새 똥통에 갇혀 있었던 남자 이야기 들었어?”
옆 테이블의 젊은이들은 이틀 전에 일어난 ‘괴상한 사고’ 이야기를 한참 했다. 즉 어떤 남자가 변기 구멍에 빠져서 밤새 정화조 안에 있었는데 아침에 발견돼 스키 순찰대가 끌어올려서 썰매에 태워 산 아래로 내려갔다는. 젊은이들은 폭소를 터트리며 그 남자에 대한 우스갯소리를 주고받았다. 사고가 난 화장실은 카페 맞은편, 평평한 활강로 건너에 있었고 나는 믿기지 않아 하며 화장실로 가본다. 정말 성인 남자가 빠질 수 있는 구멍인지 확인하러. 큰 구멍은 아니었지만 역시 사람이 실수로 빠질 만해 보이지는 않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화장실을 조사한 데는 이유가 있다. 이 년 전에는 아내와 스키를 타러 다른 도시의 리조트에 갔었는데 거기서 정확하게 지금과 똑같은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 지역 신문에 실린 짧은 기사도 보고. 그때도 남자는 다음 날 아침에 구조되어 기자에게 “화장실에서 본 빛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나는 또 이런 정보도 기억하고 있었다. 남자의 이름이 압디카림 게디 하시라는 것을. 작가인 나는 소말리아에 잠시 체류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는 내전 중이 아니었어도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
다음날 나는 주변의 도움으로 근처 리조트에 머무는 남자를 만난다. 그는 작고 왜소한 체격에 호감형 얼굴을 가진 삼십 대 중반으로 보였고 목소리는 진지했으며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서글픈 위엄이 느껴졌다”. 난민이었던 그가 종교 단체의 지원으로 캐나다에 정착하게 된 데까지 무려 팔 년이 걸렸다. 나는 그에게 구조를 기다리면서 정화조 안에서 밤새 무엇을 했는지 물었다. “벽에 기대서 머리 위 작고 동그란 구멍을 올려다봤어요. 밤이 아주 느리게 지나가더군요.” 헤어질 때 나는 그에게 예의상 가족과 같이 왔느냐고 물었다. 가족. 그 질문이 남자의 가장 큰 슬픔을 열어 보이게 했다.
남자는 말했다. 머리 위 변기 구멍으로 빛이 들어오는 걸 보니 어릴 때 고향 바다에 떠오르던 보름달이 생각났고, 자신을 품에 안고 있던 할머니가 “달이라는 구멍으로 신이 들어온다고” 했다고. 자신은 “신이 세상으로 몰래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싶었으며 할머니랑 보낸 그 시간이 마지막으로 행복하다고 느낀 때였다고. 가족은 단 한 번의 폭발로 모두 잃어 이제 자신의 가족은 달뿐이라고. “그것도 가끔, 빛이 적당할 때.”
얀 마텔은 이 단편에 짧은 ‘작가의 말’을 남겼다. 소설을 쓸 때 “고향이 너무 그립다는 건 어떤 느낌”일지, “난민이 되어 더 살기 좋은 곳에 와서, 이곳의 삶에 감사하면서도 자기가 태어난 곳이 여전히 너무나 그립다면” 어떨지 생각했다고 말이다.
추석에는 먼저 가족 생각이, 그리고 보름달이 떠오른다. 고향을 떠나왔거나 돌아갈 수 없는 많은 이들, 나의 부모가 달을 보며 뭔가를 기원하고 찾고 있는 듯한 뒷모습도.
조경란 소설가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주한 美 7공군 사령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2/128/20251002516817.jpg
)
![[기자가만난세상] 슬기로운 명절 에티켓](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2/128/20251002516599.jpg
)
![[세계와우리] 경주 에이펙과 실용외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2/128/20251002516808.jpg
)
![[조경란의얇은소설] 달을 보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2/128/202510025165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