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계 인사들 중심 건립 촉구 모임 발족
근대미술관의 존재는 선택이 아닌 필수
분단돼 있는 민족공동체 위해서도 꼭 필요
서울 송현동 부지 최적… 예술벨트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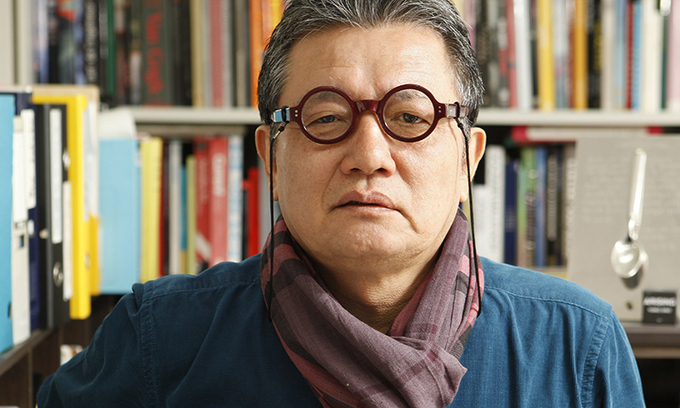
미술계 인사들이 ‘이건희 컬렉션’의 근대 명작 기증작들을 포함하는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을 촉구하며 27일 ‘국립근대미술관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발족했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 한국출판문화회관에서 발표한 선언문에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시기가 근대”라며 “국립근대미술관의 존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때마침 근대의 위대한 유산 1000여점이 포함된 이건희 소장품의 국가 기증 사건이 발생했다”며 “역사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준모(사진)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은 이 모임의 대표적 인사다. 그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만들어진 원동력이었던 미술계 모임 ‘기무사에 미술관을 원하는 사람들’의 상임간사를 맡기도 하는 등 미술계 숙원이 추진되는 곳에 항상 등장하는 민간전문가다. 그는 삼성가가 이건희 컬렉션 시가감정을 맡겼던 곳 중 한 곳인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도 이끌고 있다. 기부를 지켜보며 “이제 근대미술관을 지어야 할 순서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는 “근대미술관은 분단돼 있는 민족공동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남북 공통의 미술사가 쓰이는 장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국립근대미술관이 왜 필요한가.
“세계 어딜 가나 나라가 만들어지면 제일 먼저 만드는 게 근대미술관이다. 봉건의 사슬을 끊고 국민국가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공동체로서 자국 정체성과 고유성을 표상하는 미술·박물관을 가장 먼저 연다. 근대미술관 없는 현대미술관이라는 지금 현실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강제침탈의 트라우마를 상쇄하고도 남을 우리 근대사의 성과가 있다. (근대미술 전시를 주로 하는)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은 소장기능 없이 사실 (근대미술관) 흉내만 내고 있는 격이다. 재미있는 건, 덕수궁관의 관람객을 평방미터당 방문객으로 따져보면 600명이 넘는다. 서울관은 180명 수준이다. 우리나라 근대기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뜻 아니겠나.”
- 남북 분단 현실에서도 갖는 의미도 강조된다.
“1948년 남북한이 각각 정부를 세우고 1950년 전쟁을 했지만 근대기의 많은 부분은 그 이전이다. 공유하는 역사를 토대로 서로 같고 다름을 이해하고 따져나가면 공감대를 찾을 수 있다. 또 미술이 재미있는 것이, 가령 영호남의 지역감정이 그렇게 강하다 해도 경주 불국사에 가서 ‘이거 경상도꺼네’, 익산 미륵사지석탑을 보며 ‘전라도가 만든 거네’ 하지 않는다. 문화는 바로 그 공감대가 있다. 분단 이전의 미술을 통해 서로 교감하고 연구하다 보면 분단 70년을 메울 수 있는 계기가 된다.”
- 실제로 할 수 있는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
“공동전시나 교류전은 물론 연구할 게 많다. 왜 북한에 있던 이중섭이나 도상봉은 왜 남으로 넘어왔는지, 월남작가, 월북작가가 어떤 그림을 그렸고, 각 체제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연구할 수 있다. 변화 속에서도 또 변하지 않은 미학은 뭔지 찾아내면 아마도 그게 민족성일 것이다. 그들의 프로파간다 미술은 또 어떤 목적과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는지도. 서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거다. 또 중요한 건 일제강점기 항일미술, 독립운동가들의 붓글씨나 그림들도 대단하다. 그 시기 예술지상주의나 순수예술주의 이런 그림들도 대단하다.”

- 부지는 왜 서울 종로구 송현동을 주장하나.
“근대미술관이 현대미술관과 하나의 벨트로 있을 수 있는 자리다.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서울에 미술관을 할 만한 땅이 어디 있는지 이미 검토했다.”
- 일부 비수도권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이 반발하는데.
“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이해하나 그렇다고 원칙을 저버리나. 기존의 지역 미술관 중에 (지자체장이나 정치인들의 지원을 못받아) 건물에 물도 새고 작품 구입비도 없는 곳이 많다. 작품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레지스트라, 미술품의 의사라고 하는 컨서베이터가 없는 곳도 태반이다. 그런 것부터 고쳐나갈 생각을 해야 한다. 향후 미술품물 기부제도가 도입됐을 때 기증을 받기 위해서라도.”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한·일 여권 없는 왕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8/128/20251218518473.jpg
)
![[기자가만난세상] ‘강제 노역’ 서술 빠진 사도광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8/128/20251218518441.jpg
)
![[세계와우리] 사라진 비핵화, 자강만이 살길이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8/128/20251218518464.jpg
)
![[기후의 미래] 사라져야 새로워진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8/128/2025121851844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