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극히 남루한 현실 속에서도
사람 사이의 아름다움 포착해
희망은 바로 여기 있음을 보여줘
지금은 위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다. 위로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현 세계의 고통은 위로담론이 감당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섰다. 지금은 사람과 세계를 더 정확히 보아야 하는 시기이다. 무능과 편견으로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비로소 발견해야 하는 결정적 순간이 지금이다.
‘미나리’와 ‘노매드랜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두 영화는 미화 없이, 사람이, 사람의 ‘사이’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보여준다. 지극히 남루한 현실 속에서 아름다움을 포착한 시선이 반갑고 고맙다. 두 영화는 희망이란 것이 미나리가 자라는 땅, 혹은 노매드랜드, 바로 여기 있다는 통찰을 보여준다. 희망은 여기에 있다. 그걸 우리가 못 볼 뿐이다. 2021년, 우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화를 선물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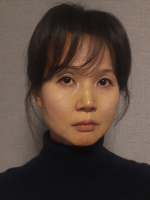
가족마다, 관계마다, 집단마다 문제와 갈등과 상처가 있다. 우리는 그 문제, 갈등, 상처만 본다. 절망에 젖어 산다. 희망은 여기 있는데 그걸 포착하지 못한다. 시선 자체가 절망적인 까닭이다. 우리에게 놓인 문제, 갈등, 상처를 비집고 보자. 그 틈을 보자. 그 사이에 ‘무엇’인가 있다.
일자리를 잃고 남편을 잃고 집을 잃었다. 나이는 예순을 넘겼다. 가진 것은 낡은 차 한 대뿐이다. 여자는 이 삶을 짊어지고 노매드랜드를 건넌다. 그녀는 모든 것을 훌훌 털고 유유자적 걸어가는 견자가 아니다. 밥벌이를 찾아 끊임없이 이동해야 하는 긱이코노미 시대의 프레카리아트(precariat), 하우스리스(houseless)다. 그러나 그녀는 그 길 위에서, 또 사람 사이에서 아름다움과 만난다. 영화 ‘노매드랜드’ 이야기다.
미국 이민자 한국인 부부. 역시 가진 것이 없다. 영어도 서툴다. 대출을 받아 농장으로 일어서 보려 하지만 생각지도 않은 변수가, 감당 못 할 일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온다. 빚은 쌓여 가고, 어머니에게는 뇌졸중이 오고, 아이는 아프다. 여기서 살 수도, 여기를 떠날 수도 없다. 그런데 네 가족이 누워 있는 거실의 풍경이 따뜻하다. 그 풍경을 노모가 바라보고 있다. 영화 ‘미나리’다.
두 영화는 인간은 아름다운 종이라는 진실을 보여준다. 지금 이 순간에도 희망이 이 사이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생각하기에 따라 삶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삶을 더 객관적으로 직시해야 희망이 보인다는 이야기이다.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을 둘러싼 관계와 삶을 보면 은연중에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게 된다. 이기적 태도는 ‘이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피해의식을 불러온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네 탓이야’라는 원망은 보상심리의 덫을 다시 만든다. 보상심리는 사랑의 가능성을 깎아내린다. 주디스 버틀러의 말대로 ‘나’는 ‘나’가 아니다. ‘나’는 ‘나와 너의 관계이다’(I am my relation to you). ‘나’는 ‘나와 너’ 사이에만 존재할 수 있다.
10년 전쯤, 윤여정 배우처럼 늙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다. 내가 틀렸다. 윤여정 배우는 아직 ‘늙었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평생 늙지 않는 사람이 있다. 늙지 않기 위해 진심으로 안티에이징을 해야 한다. 이 안티에이징 또한 ‘사이’에서 일어나는 작용일 것이다. 그녀는 오스카 수상 소감에서 두 아들을 언급했다. “두 아들에게도 감사한다. 두 아들이 나에게 일하러 나가라고 종용했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 모든 건 아이들의 잔소리 덕분이고, 엄마가 열심히 일했더니 이런 상을 받게 됐다.” 분명 녹록지 않았을 그녀의 인생, 그녀와 두 아들 사이의 아름다움이 감지되었다.
내가 틀린 것은 또 있다. 나는 누구처럼 잘 늙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대로 늙어 가고 있었다. 너무 좋은 영화를 보고도 예전만큼 감상을 쏟아내지 못한다. 그걸 ‘미나리’와 ‘노매드랜드’가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거기에 더해, 윤여정 배우가 언어를 쏟아내는 것을 보고 나의 둔감함을 재차 인정하게 되었다. 나 자신을 탓하고 싶지는 않다. 예민하지 못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걸 다 알지 못하면서 자책하는 것은 더 어리석은 짓이다.
이상한 증상은 더 있었다. 이 영화들을 보면서 슬금슬금 눈물이 치솟았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했다. 끝내 울지도 못하고, 끝내 그치지도 못하는, 이 어정쩡함도 과거와 달라진 점이다. 터지지도 온전히 가라앉지도 못하는 울음, 나는 며칠 동안을 그렇게 보내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 증상 또한 어떤 시선을 만들어준다. 이 증상, 이 시선으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조금씩 감격하면서 살고 있다.
‘미나리’에서 딸이 엄마에게 그런다. “우리 엄마 돈 많이 썼네.” 딸이 ‘우리 엄마’라고 할 때, 그 말은 이상하게 삼인칭처럼 들린다. 딸이 엄마를 챙기는 것만큼, 나이든 엄마를 애처롭게 바라보는 것만큼, 엄마에 대한 거리가 만들어진 것일까. 그 거리가 엄마를 더 보살피게 하는 것일까. 나는 이 모녀 사이에서도 아름다움을 보았다.
한귀은 경상대 교수 국어교육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노태우와 노재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1/128/20250911520680.jpg
)
![[기자가만난세상] 팬과 싸우는 스포츠 선수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6/128/20250106517368.jpg
)
![[삶과문화] 골목 가게의 생존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7/128/20250807518461.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