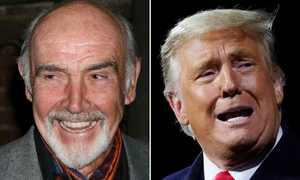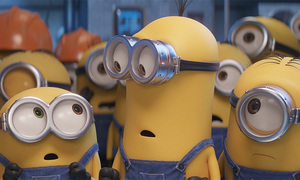서구 사회는 한때 콜레라를 비롯한 질병이 유독성 기체로 유발된다고 굳게 믿었다. 영국 의사 존 시몬 경이 19세기 전반기에 내놓은 미아즈마(Miasma·유독성 기체) 가설이 그럴싸했던 까닭이다. 저고도에 짙게 형성된 안개 형상의 미아즈마에 노출되면 속절없이 병에 걸린다는 것 아닌가.
서구 사회는 한때 콜레라를 비롯한 질병이 유독성 기체로 유발된다고 굳게 믿었다. 영국 의사 존 시몬 경이 19세기 전반기에 내놓은 미아즈마(Miasma·유독성 기체) 가설이 그럴싸했던 까닭이다. 저고도에 짙게 형성된 안개 형상의 미아즈마에 노출되면 속절없이 병에 걸린다는 것 아닌가.
미아즈마 가설에 따라 1849년 런던의 콜레라 감염률이 예측됐다. 실제 감염률에 근접했다. 놀라운 결과였다. 미아즈마 퇴치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졌다. 빈민굴도 청소됐다. 아쉽게도 대기 정화 캠페인이 길게 이어지지는 못했다. 세균 감염설이 설득력 있게 대두돼 미아즈마 가설을 추방했기 때문이다.
대기는 지구촌을 지켜온 생명의 보루다. 그런데도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대기를 비롯한 자연환경을 무분별하게 파괴해 왔다. 원수나 진 것처럼 말이다. 대기 오염은 인과응보다. 미아즈마 가설이 한때나마 득세한 것은 인류가 스스로 하는 짓을 알고는 있다는 증표일 것이다.
대기갈색구름(Atmospheric Brown Cloud·ABC)이 생명을 노린다는 경보음이 울렸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최근 ‘ABC: 아시아 지역 분석’을 발표해 중국과 인도에서만 매년 34만명이 ABC로 목숨을 잃는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한 것이다. 서울도 13개 위험지역의 하나로 지목됐다.
화석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오염물질 등으로 이뤄진 3㎞ 두께의 ABC는 기후 변화를 야기한다. 만년설을 녹이고 강물과 지하수도 더럽힌다. 인간의 폐도 괴롭힌다.
지구에 근접하는 혜성의 꼬리에서 맹독성 시안가스가 발견된 것은 20세기 초의 일이다. 당시 “1910년 혜성이 태양계 내부로 진입한다”는 천문학계 발표가 나왔고 지구촌은 공포에 휩싸였다. 이 바람에 사기 행각이 범람했다. 수많은 사기꾼이 시안가스 중독을 방지한다는 엉터리 알약을 팔아 거금을 챙겼다.
이제 20세기 초의 엉터리 알약이 재등장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UNEP의 경고는 그만큼 으스스하다. 19세기의 미아즈마 가설을 새삼 되돌아보게 된다. 그 가설이 일찍 힘을 잃지 않았다면 오늘날 ABC가 설치는 일은 있을 수 없었거나, 최소한 그 시기가 늦춰지기라도 했을 것 아닌가.
이승현 논설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서러운 이주노동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29/128/20250729518975.jpg
)
![[데스크의 눈] ‘갓비디아’가 된 엔비디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29/128/20250729518953.jpg
)
![[오늘의 시선] 위험한 실험 ‘집중투표 의무화’ 멈춰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29/128/20250729518938.jpg
)
![[안보윤의어느날] 생각과 다른 매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29/128/2025072951888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