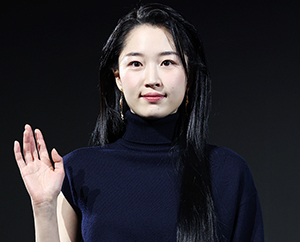|
| ◇태안 마도 해역에서 발굴된 죽간. |
마도1호선에서 발굴된 고려시대 목간 17점과 죽간 50점을 분석해온 최연식 목포대 교수와 임경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는 한국목간학회 주최로 28일 서울대에서 열리는 제4회 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의 목간 연구와 신출토 문자자료’에서 ‘태안 마도 수중 출토 목간 및 죽간의 현황과 내용’을 발표한다.
발표문에 따르면 12세기 중반∼13세기 초반 개경을 향하다가 좌초된 것으로 알려진 마도1호선은 1207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남 해남(당시 죽산현)과 나주(회진현), 장흥(수령현)에서 거둬들인 백미와 벼, 조, 메밀, 콩, 메주 등 곡식류와 젓갈류, 도자기 등을 싣고 개경을 향하다가 태안 마도 해역에서 좌초된 것으로 분석됐다. 목간과 죽간에 적힌 정묘(丁卯)년과 무진(戊辰)년은 수신자로 명기된 ‘대장군 김순영’이 김준거의 난(1119년) 때의 공으로 장군에서 대장군으로 승진했다는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등의 기록으로 미뤄볼 때 1207년과 1208년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함께 출토된 목재와 대나무편, 볍씨 등에 대한 연대측정 실험 결과도 이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
| ◇목간 또는 죽간은 함께 출토된 유물의 정확한 제작 연대는 물론 문헌 자료 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역사의 비밀을 밝히는 ‘타임캡슐’로 통한다. 사진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태안 마도 앞바다에서 마도1호선을 발견해 유물을 인양하는 장면. |
발송지가 한 곳의 조창이 아닌 세 곳을 포함하고 있고 수신자가 경창(京倉)이 아닌 각 개인으로 돼 있다는 점은 마도1호선이 국가 세금을 운반하는 조운선은 아니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즉 이 선박이 무신정권 실력자들이 지방 영지에서 거둬들인 소작료를 운반한 개인 선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발표자들은 마도1호선이 사적인 성격만을 갖는다면 굳이 향리층이 관여할 이유는 없고 목간에 적힌 전출(田出)이 고려∼조선 초기 조세와 소작료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개경의 유력자들이 국가의 승인·지원을 받아 직접 조세를 거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임경희 연구사는 “발송지와 발송자, 수신자 그리고 화물의 성격으로 볼 때 마도1호선 화물은 전시과(국가가 세수용 농토를 배분·관리하던 토지제도) 조세품과 실력자들의 사적인 공납품이 혼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마도1호선이 조운선인지 (조운 성격을 띤) 사선인지는 당시 조세제도 현황과 맞물려 정교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28일 열리는 국제학술회의에서는 태안 마도 목간·죽간 연구 현황은 물론 ‘창녕 화왕산성 출토 목간’(김재홍·국립중앙박물관)과 ‘나주 목암리 출토 목간’(김성범·나주문화재연구소), ‘단양적성비문’(장경준·고려대) 연구발표가 이어진다. 또한 사카에하라 도와오(榮原永遠男) 일본 오사카시립대 교수의 ‘일본 고대목간의 연구동향과 과제’와 겅위안리(耿元麗) 중국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연구원의 ‘돈황 죽간 자료를 통한 당대 균전제 다시보기’ 발표도 예정돼 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치매 머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5/128/20251215517423.JPG
)
![[주춘렬 칼럼] ‘AI 3대·반도체 2대 강국’의 현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0/128/20251020518406.jpg
)
![‘주사 이모’가 사람 잡아요 [서아람의 변호사 외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3/128/20251103514866.jpg
)
![[박소란의시읽는마음] 어제와 비에 대한 인터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5/128/202512155174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