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7년생으로 명문 경기중, 경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56학번)에 입학한 청년이 있었다. 이쯤 되면 시쳇말로 거의 ‘공부의 신(神)’이 아닌가. 입학과 동시에 법률 서적과 씨름을 했다면 20대 초반의 나이에 고시(高試)에 합격하는 ‘소년등과’(少年登科)도 충분히 가능했을 법하다. 하지만 그는 대학 3학년이던 1958년 11월 돌연 군에 입대했고 최전방인 경기 연천에서 18개월간 복무한 뒤 1960년 5월 제대했다. 오늘날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꼽히는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장의 젊은 시절 이야기다.

많은 이들이 ‘왜 서울대 법대생이 고시를 쳐 판검사나 고위 관료가 되지 않았느냐’고 궁금해한다. 김동호는 2022년 어느 일간지에 연재한 회고록에서 “나는 재학 중 고등고시 사법과나 행정과 시험을 볼 가정 형편도 아니었고, 합격할 자신도 없어 재학 중 입대하기로 했다”고 담담하게 기술했다. 복학 후 1961년 학업을 마친 24세의 김동호는 무엇보다 취직이 급했다. 당시 그가 간절히 문을 두드린 곳은 신생 정부 부처인 공보부, 지금의 문화체육관광부였다. 말단 공무원으로서 영화, 방송, 언론, 홍보 등을 다루는 문화 행정에 발을 담근 것이 김동호와 영화의 첫 인연이라고 하겠다. 김동호 스스로 “공보부에 들어간 건 오늘의 내가 있게 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회상했을 정도다.
비록 고시 출신은 아니었으나 문화 행정 업무를 밑바닥에서부터 익힌 김동호에겐 금세 ‘문화통(通) 관료’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1970년대 문체부의 전신인 문화공보부에서 문화·보도·공보·국제교류 4개국(局)의 국장을 섭렵하고 1980년대엔 1급으로 승진해 무려 8년간 기획관리실장을 지냈다. 이후 관료 신분에서 벗어나 영화진흥공사 사장(1988∼1992)과 예술의전당 사장(1992)을 맡았다가 노태우정부 임기 중 마지막 문화부 차관에 발탁됐다. 1993년 김영삼정부 들어 공직에서 물러난 뒤 BIFF 창설에 깊이 관여하고 1996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15년간 그 집행위원장을 맡아 아시아 최고 수준의 영화 축제로 키워낸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제는 은퇴한 김동호가 BIFF 출범 30주년을 맞아 신인 영화감독으로 데뷔했다고 해서 화제다. 지난 17일 개막한 BIFF를 통해 ‘미스터 김, 영화관에 가다’라는 제목의 장편영화를 선보인 것이다. 이 작품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세계 영화 생태계를 어떻게 되살릴 것인지 그 해답을 찾는 여정을 담고 있다. 김동호가 직접 캠코더를 들고 국내는 물론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각국의 극장을 순례하며 영화와 영화관의 미래를 묻는다. 제목의 ‘미스터 김’이란 표현은 세계 유수의 배우와 영화감독들이 김동호를 ‘미스터 김’이라고 부르며 함께 어울린 밤샘 술자리, 그리고 거기에서 쌓은 진한 우정을 추억하기 위함이다. 올해 미수(米壽·88세)를 맞은 영화인의 끊임없는 도전에 박수를 보낸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설탕세 논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9/25/128/20250925519232.jpg
)
![[기자가만난세상] 개통 앞둔 제3연륙교 수난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9/25/128/20250925519183.jpg
)
![[세계와우리] 북·중·러 3자 연대와 실용외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9/25/128/20250925519193.jpg
)
![[삶과문화] 게임은 이제 예술이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9/25/128/20250925519122.jp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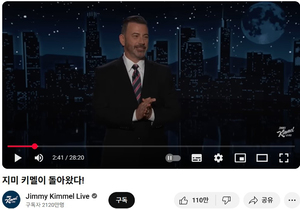






![[포토] 고윤정 '반가운 손인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8/300/2025091851917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