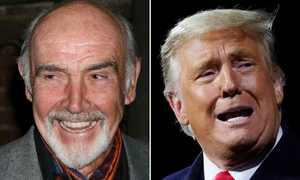1961년 5·16 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첫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 25일 취임한 안규백 장관의 행보에 군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인적 쇄신도 이뤄질 전망이다.

안 장관은 취임사에서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언급했다. 이를 위해선 국방부와 각 군 수뇌부에 대한 인사가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달에는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예정되어 있어서 공식적인 장군 인사는 UFG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계엄에 깊이 관여한 국군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의 개편도 안 장관이 직면한 과제다.
방첩사는 보안 대책 수립·방첩 및 정보 수집·안보 수사를 맡아 왔다. 방첩 기능을 제외한 다른 업무는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사도 노상원 전 사령관의 개입 등 비상계엄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사령부 조직 내 하극상 논란과 기밀유출에 이어 계엄에 깊이 관여한 것까지 드러나면서 대대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계엄에 동원된 방첩사·정보사의 조직과 기능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연의 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방비 인상 압박,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등도 안 장관이 풀어야 할 문제다.
한·미동맹은 북한 도발 및 위협 억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상호방위조약 문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한국을 돕는 개념이라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었다.
하지만 중국 견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방위조약을 쌍방향으로 해석, 한·미동맹을 대만 해협 등의 문제에 활용할 조짐을 보인다. 미국은 앞서 필리핀과의 상호방위조약 대상이 인도태평양 전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주한미군을 대만해협 등에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는 관세 협상에서 안보 이슈가 논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차후에 논의가 이뤄지면 한국 측의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코리아 글로우 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31/128/20250731520509.jpg
)
![[기자가만난세상] 초고령사회 ‘국가 주도 돌봄’ 시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31/128/20250731520454.jpg
)
![[세계와우리] 안보의 본질은 자강(自强)](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31/128/20250731520499.jpg
)
![[기후의 미래] 플라스틱 협약과 만장일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31/128/2025073152046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