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동물을 입고, 먹고, 구경하고, 껴안는다. 반드시 동물을 좋아하거나 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간의 삶은 동물들에게 깊이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동물’은 ‘비인간동물’의 ‘삶’과 ‘권리’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을까? 아마도 우리는 어제 맛있게 먹은 고기가 어떻게 태어나서, 길러지고, 어떻게 죽어서 오게 된 것인지 알기를 꺼릴 것이다.
최근 ‘동물권’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동물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동물해방’의 저자 피터 싱어가 말했듯,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동물을 사랑해야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다른 집단 (그것도 사회적 힘이 더 약한 집단)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제안이고, 다른 생명체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다. 인간이 천부인권을 가지듯이 동물도 태어나면서부터 ‘생존할 권리’, ‘학대나 착취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유네스코는 1978년 ‘세계 동물 권리 선언’을 통해 위 권리들은 물론, ‘본래의 습성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 ‘인간의 적절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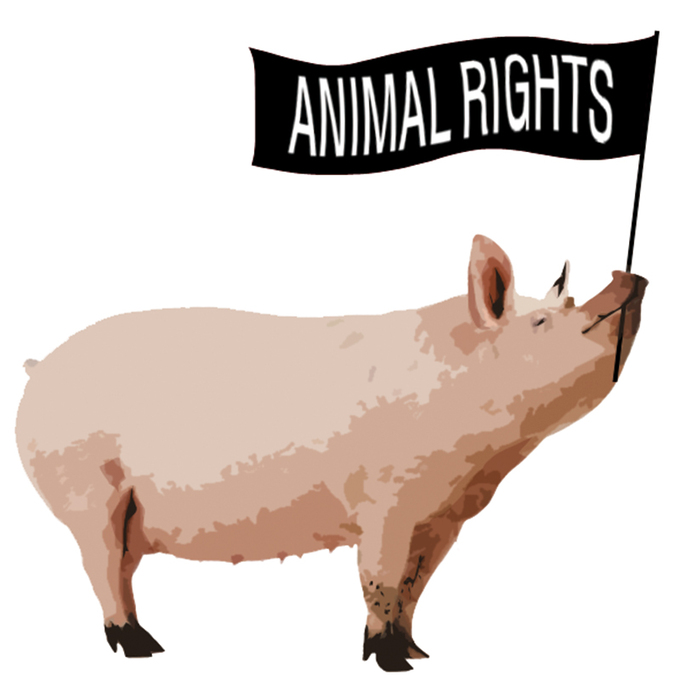
인간이 오랜 기간 동물을 이용해왔다는 사실만으로 인간에게 동물을 마음껏 착취, 학대할 권리가 있는 것일까? 인간에게 필요하다고 해서 동물이 무조건 고통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동물의 희생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이 ‘덜 고통받을 수는 없는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이들에게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동물학자이자 인류학자인 제인 구달의 말처럼, 우리는 이들에 대해 더 잘 알아야 신경을 쓰게 되고, 신경을 써야 도울 수 있으며, 도와야 우리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고개 숙인 백종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6/128/20250506511791.jpg
)
![[데스크의 눈] 문화재 보존의 이유 일깨운 ‘사유의 방’](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3/18/128/20250318518938.jpg
)
![[오늘의시선] 대선공약에 일그러진 노동개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6/128/20250506511655.jpg
)
![[안보윤의어느날] 여백을 읽는 시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6/128/20250506511723.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