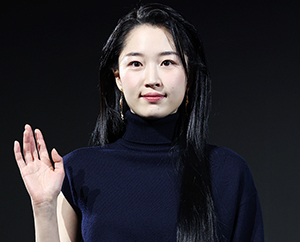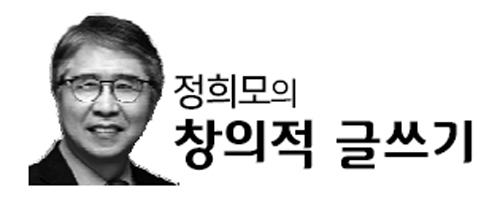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보면 ‘뉴스피크어’라는 새로운 언어가 나온다. 뉴스피크어는 전체주의 사회에서 단어의 의미를 제한해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고자 한 언어이다. 예를 들어 ‘동등한’이란 단어는 일반적 의미로는 사용 가능하지만 ‘정치적으로 동등한’, ‘권력적으로 동등한’과 같은 이차적 의미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정치적으로 평등한’과 같은 단어도 마찬가지이다. ‘전쟁성’을 ‘평화성’으로 부르고 선전선동성을 ‘진실성’이라고 부르는 것도 언어통제의 한 방법이다.
‘1984’에 나오는 언어통제 정책은 기본적으로 사고가 언어에 종속돼 있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하다. 언어가 없다면 거기에 따른 개념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으니 죄를 지을 수 없다. 통상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는 이런 관점을 언어결정론이라고 부른다. 사피어와 워프란 학자가 최초에 주장했다고 하여 ‘사피어와 워프의 가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피어와 워프는 인간은 언어가 그어 놓은 선에 따라 세계를 해석한다고 주장했다. 무지개의 색깔을 어떤 언어는 다섯 가지로, 다른 언어는 세 가지로, 혹은 일곱 가지로 규정해서 판단한다. 인간은 언어가 자연을 쪼개고, 개념을 조직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대로 살아간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내 생각과 관념을 움직이는 진짜 주인은 언어가 된다.
심리학자인 스티븐 핑커는 이런 언어결정론을 허위에 가깝다고 강렬히 비판했다. 실어증 환자는 언어 없이도 다양한 사고가 가능하다면서, 사람의 생각은 언어로부터 독립돼 있다고 주장한다. 수화를 모르는 청각장애인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추상적 사고는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인간에게는 ‘사고의 언어’, 즉 우리 내면에 보편적 언어체계로 ‘정신어’가 있어 언어 없이도 개념을 만들어 낸다고 보았다.
그런데 글을 쓰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든다. 언어에 기대지 않고 나의 경험과 판단, 논리와 추리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또 언어에 따라 우리 사유가 변화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문장을 쓰면서 생각이 생기고 바뀌기도 하는 것을 경험한다. 사피어와 워프처럼 극단적인 언어결정론을 주장할 마음은 없지만 생각이 언어 속에서 조형된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다. 그러다보니 비트겐슈타인이 “세계의 사물을 우리가 명명하는 순간, 세계가 비로소 우리의 의식 속에 들어온다”고 한 말이 떠오른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한국 부자의 기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4/128/20251214508711.jpg
)
![[특파원리포트] 中 공룡 유통사들 유럽 공습](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4/128/20251214508707.jpg
)
![[김정식칼럼] 토지거래허가제의 득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4/128/20251214508692.jpg
)
![[심호섭의전쟁이야기] 북베트남은 어떻게 승리했을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4/128/2025121450869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