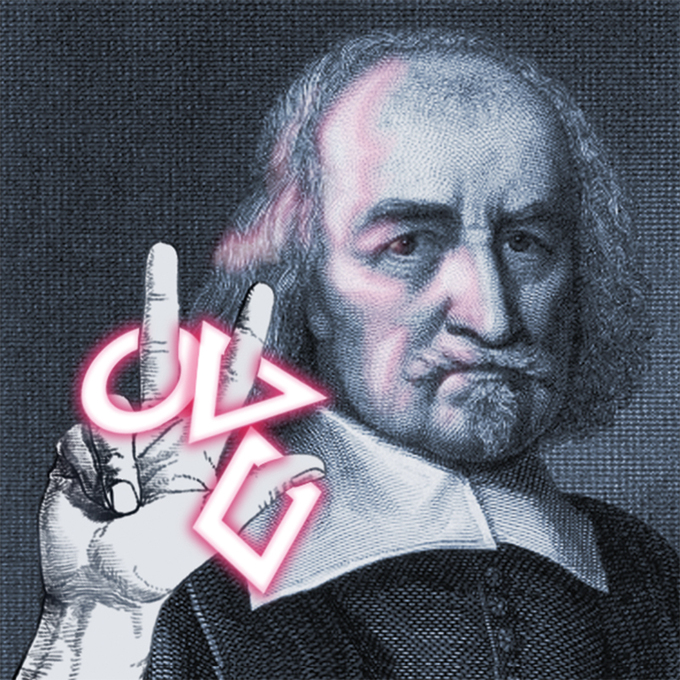
철학자들은 국가가 없는 상태를 ‘자연상태’라고 부른다. 이것은 실제 역사에서 국가가 생기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으로 상상하는 상태이다. 국가가 없는 자연상태는 평화로웠을까, 비참했을까?
17세기의 영국 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후자라고 보았다.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참가자들끼리 취침시간에 서로를 죽여 약자를 걸러내는 장면처럼 끊임없이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죽인다. 홉스는 이 상태에 대해 유명한 말을 많이 남겼는데,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인간은 인간에 대해 악명 높은 늑대”라고 말했다. 또 그곳에서의 삶은 “고독하고 가난하고 험악하고 잔인하고 짧다”라고도 말했다.
사람들은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합리적이기도 하다. 그런 자연상태에서는 더는 살 수가 없다. 힘 있는 사람은 살기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보다 더 힘센 사람이 언제 나올지 모르고 약한 사람이라도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 늘 불안하다. ‘오징어 게임’에서 힘이 가장 센 조폭도 같은 편에게 배신당할까 봐 불안해한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지속할 수 없으니 일종의 계약을 한다. 나도 너의 물건을 뺏거나 너를 죽이거나 않을 테니, 너도 내 물건을 뺏지 말고 나를 죽이지 말라고 말이다. 이것이 ‘사회계약’이다.
그러나 계약은 안 지키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 홉스는 “칼이 없이 말뿐인” 계약이 그렇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 계약을 지키는지 감시하는 강한 권력을 도입해야 하는데 그것이 ‘주권자’, 곧 국가이다. 홉스가 비참한 자연상태를 가정하는 것은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강력한 국가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당시 영국의 왕권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국가권력은 신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인간의 필요 때문에 도입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심지어 국가가 우리의 목숨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면 그 국가를 바꿀 수 있다고, 곧 반역까지 허용했다고 볼 수도 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미·러 ‘뉴스타트’ 종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4/128/20260204518482.jpg
)
![[세계포럼] 참전용사 없는 6·25전쟁 기념식](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4/128/20260204518473.jpg
)
![[세계타워] 이민 ‘백년지대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4/128/20260204518438.jpg
)
![[열린마당] 쿠팡 때리기만이 능사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4/128/2026020451837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