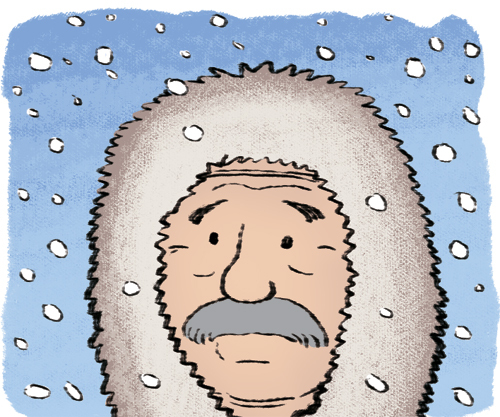
인간의 언어와 사고체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언어가 다른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고할까, 아니면 구체적 언어와는 관계없이 인류 공통의 사고체계를 갖고 있을까.
20세기 초 활동했던 미국 언어학자 에드워드 사피어와 벤저민 워프는 “인간은 언어를 매개로 살고 있으며, 언어가 드러내고 분절(分節)해 놓은 세계를 보고 듣고 경험한다”고 주장했다. 언어가 다르면 사람들의 사고체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를 ‘사피어-워프 가설’이라 한다. 그들은 에스키모 언어에는 눈을 표현하는 단어가 많아 에스키모 사람들은 눈을 관찰하고 인지하는 능력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주장했다.

사피어와 워프는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프란츠 보아스의 1911년 저서 ‘아메리카 인디언 언어 핸드북’에서 그 근거를 찾았다. 보아스는 에스키모 말에는 눈을 표현하는 네 개의 단어, 즉 ‘아푸트’(땅에 쌓인 눈), ‘카나’(떨어지는 눈), ‘피크시르포크’(바람에 날리는 눈), ‘퀴무크수크’(바람에 날려 쌓인 눈더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에스키모 사람들은 다른 집단 사람들보다 눈에 접촉할 기회가 많으므로, 그 언어에 눈을 묘사하는 단어가 더 많다는 것이다. 이를 ‘언어 상대주의’라 한다.
워프는 보아스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수치를 부풀려 네 개 이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글은 언어학 교과서와 대중서 및 신문·잡지에 널리 인용됐다. 그 과정에서 과장이 덧붙여졌고, ‘에스키모 사회에서 눈을 표현하는 단어는 수백 개다’라는 근거 없는 주장이 통용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미국 클리블랜드주립대 로라 마틴 교수는 1986년 ‘에스키모의 눈 단어: 인류학적 사례의 생성과 쇠퇴에 관한 사례 연구’라는 논문에서 이러한 주장이 허구임을 밝혔다. ‘수식어’와 ‘명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모두를 ‘수식어와 결합한 복합명사’로 오인해 생긴 오류라는 것이다.
영국 에든버러대의 제프리 풀럼 교수는 1989년 ‘에스키모 어휘라는 거대한 사기’라는 논문에서 그 경위를 설명했다. 사피어와 워프는 문화에 따른 언어 차이를 ‘에스키모 눈 단어’로 제시했는데, 부정확한 자료 분석 결과를 인용하는 바람에 ‘에스키모 눈 단어 날조 사건’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소재 텍사스대의 앤서니 우드버리 교수는 1991년 ‘에스키모의 눈 단어 개수’라는 논문에서 ‘에스키모 언어 사전’에 나오는 눈 단어가 열다섯 개라고 제시했다. 에스키모 언어에서 눈을 표현하는 단어 수가, 영어와 한국어 등 다른 문화권보다 특별히 많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언어가 사람들의 사고를 결정하거나 강한 영향을 미친다면,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은 상대방의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야 한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인지심리학자 스티븐 핑커는 사람들은 한국어나 영어와 같은 ‘자연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언어’로 생각한다고 주장한다. 인류는 수많은 언어 집단으로 나뉘어 있지만, 차이점보다는 일치점이 더 많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인간이면 누구나 가진 공통의 사고체계가 ‘인류공동체’를 지탱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송영길의 귀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2/128/20260222511174.jpg
)
![[특파원리포트] 중국이 부러워졌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2/128/20260222511171.jpg
)
![[박영준 칼럼] 한·일 공동이익 키울 ‘협력의 길’ 열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2/128/20260222511161.jpg
)
![[김정기의호모커뮤니쿠스] 정당한 ‘자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2/128/20260222511164.jpg
)







![[포토] 카리나 '눈부신 등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9/300/20260219508200.jpg
)
![[포토] 혜리 '완벽한 비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9/300/20260219508397.jpg
)